- 병·의원
- 대학병원
"진료실 밖에도 길…더 많이 나와야 한다"
발행날짜: 2011-11-07 06:10:38
-
가
-
건보공단 윤영덕 정책연구원

그의 전직은 '의사'다. 최근 그는 의사 대신 '연구원'이 된지 딱 2년이 됐다. 건강보험공단 윤영덕 정책연구원의 이야기다.
"지금 해야만 하는 일 선택했다"
윤 연구원이 공단에서 일하게 된 것은 2009년 11월 1일부터다. 2009년 2월 전문의를 딴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6개월 일한 후 아예 의사의 길 대신 연구원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중앙대 의대를 거쳐, 서울보훈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땄다. 이후 연구원으로 살며 진료차트 대신 정책 연구보고서를 쉴 새없이 넘겼다.
맡은 일은 주로 국가 검진과 공단의 건강증진 사업이다. 최근엔 의료이용 행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사 대신 연구원이 됐다고 하면 사람들은 임상이 안맞거나 의사 체질이 아닐 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환자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의사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을 했죠.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면 진료 현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대답은 간단했다. 임상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연구원은 지금이 아니면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박봉인데다가 어렵게 딴 의사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일에 사람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았다.
"제 아내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아내가 제 일을 그리 달가워하는 편은 아닙니다. 일은 많고 수입이 넉넉한 편도 아니거든요. 일의 특성상 야근도 많구요. 하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분이죠."
"정책을 관찰하고 진찰하는 의사될 것"
그가 연구원을 선택한 데는 보다 중요한 지향점이 있다. 정책연구원은 바로 정책을 관찰하고 진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의 궁극적인 꿈은 정책을 진찰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최근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의사로 있을 땐 차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개개인의 환자에게 맞는 최고의 치료법이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
국민과 의료계를 절충해야만 하는 부분에서도 고민이 많다. 국민의 보장성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경쟁체제는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이다.
"먼 미래에 제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의료계의 상황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비급여에 목매지 않고 환자만 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변해 있다면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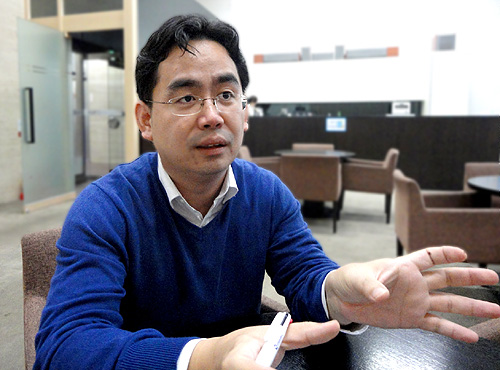
윤 연구원은 여전히 의료계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차의료연구회의 간사를 지난 2년간 맡아오며 의료전달체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매달 세미나를 열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진료실 밖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1만 2천명의 직원 중 단 3명의 의사가 일하고 있는 공단에도 많은 의사들이 들어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자단체에 수백명의 의사가 일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공단도 의사들을 채용하려고 하지만 지원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죠.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진료실만이 아닙니다. 길은 진료실 바깥에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