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병원이라는 전장에서 마주치는 편견들
박성우
발행날짜: 2015-12-29 05:05:31
-
가
-
인턴 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박성우의 '인턴노트'[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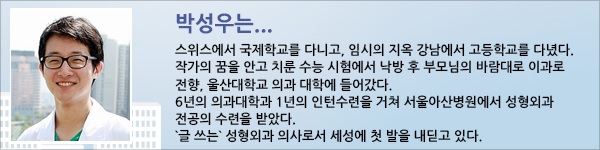
"선생님, 오늘 저희 병동 환자 한 분 트랜스퍼(transfer) 있어요."
'트랜스퍼'는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가 옮겨 가는 것으로 '전원'이라고도 한다. 보통 어느 정도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갈 때, 혹은 질병 말기에 이른 환자가 연고지 병원으로 옮겨갈 때 트랜스퍼를 가게 된다.
한 달동안 한 번도 트랜스퍼가 없었던 우리 병동에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어느 분이 가나 궁금했다. 보통 트랜스퍼라 하면 환자의 활력 징후를 조심히 봐야 하고, 앰부주머니로 공기주입을 할 때도 있어 심각한 상황을 떠올리고는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환자는 이틀에 한 번씩 드레싱을 해드렸던 40대의 건강한 아저씨였다.
아는 의사 지인이 조금 다르게 시술을 해준다고 하여 서울 시내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는 트랜스퍼였다. 두 개의 흉관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거동이 원활하여 이송용 침대에 모실 것도 없고 같이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였다. 단 의사가 동행하는 이유는, 혹시나 가슴관에 걸어놓은 음압 펌프가 빠지는 등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하고, 음압 펌프를 다시 병원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것이었다.
보통 트랜스퍼라 하면 구급차 뒤에서 중환자 곁을 지킨 채 저 멀리 부산, 목포, 대구와 같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와 달리 나의 첫 트랜스퍼는 거동이 원활한 환자와 함께 잠실에서 강남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었다.
암센터 단기 병동에서 폐암 환자들에게 검사 및 진단을 마치고 치료 계획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다. 다행히 조기에 진단되어 수술이 가능한 경우 조금씩 안심시켜드리며 설명을 하지만 여전히 '암'이라는 단어에는 환자와 의사의 편견이 존재했다.
나의 경우 직접 환자를 불러서 폐암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보호자와 먼저 면담을 했다. 보호자와 함께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알릴지 결정했다. 대개는 검사가 모두 끝나고 환자 본인에게 알리곤 한다.
하지만 반대로 병실안에서 환자에게 직접 "환자분, 조직 검사 결과 암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주치의도 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환자와 상담할 때는 최대한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병실에서 환자와 면담할 때는 옆에 있던 환자들도 어느새 옹기종기 모여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가 있다.
하루는 환자에게 앞으로의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일어서던 차 마주보던 자리의 할아버지 환자가 언성을 높였다.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다 무조건 모든 서류 다 떼어달라고 해." 그러고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최근 암 환자에게 '중증 질환 대상자'라 하여 진료비를 대폭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자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받을 것을 못 받는다며 모르는 소리 한다고 손가락질을 했다. 할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혹은 주치의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자신과 관계없는 내게 손가락질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에 따르면 본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과거에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환자에게 내일 뵙겠다고 말하고는 눈인사를 하고 자리를 나왔다.
종합병원에는 워낙 중환자들이 많으니 의사들은 웬만한 질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환자 본인에게는 인생에 있어 큰 사건이지만 의사가 보기에 다른 환자에 비해 경한 질환이라 여기게 되고 그때 환자는 의사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더군다나 암센터 병동처럼 입원해 있는 모든 환자들이 암일 경우에는 '암'이라는 것에 나 역시 무뎌진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나 또한 국가처럼 무언가 숨기는 의사라고 치부해버려 불만을 쏟아낸 것 같다.
아침 6시에 병동에 도착하면 6시 30분까지 동맥혈 채혈을 모두 마치고, 검사실로 혈액 샘플들을 내려 적어 교수님들이 7시 회진을 돌 때 결과를 볼 수 있게 준비한다. 그리고 6시 30분부터 7시까지 내가 담당하는 환자들을 미리 회진 돌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는다. 또 어제 저녁에 나온 검사 결과들에 대해 다시 찾아보고 회진 준비를 한다.
아침 7시가 되면 교수님과 함께 회진을 돈다. 병동 스테이션에서 교수님, 임상강사, 내과 주치의, 인턴 그리고 의대 실습 학생과 테이블 미팅을 한다.
환자 차트를 보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환자의 이벤트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환자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를 하면 직접 환자를 보러 우르르 병실마다 찾아간다. 8시가 되면 의국 컨퍼런스가 있어서 의국 회의실에 가서 신환 발표회나 논문 저널 발표를 듣는다.
9시가 되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오늘 퇴원하는 내 환자에게 설명하고 퇴원 처방을 낸다. 혹여 그날 담당 환자가 기관지내시경 검사가 있으면 검사실에 내려가기 전에 차트에 주의해서 시행해야 하는 추가 검사 사항에 대해 출력해서 넣어놓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병동에 올라가면 채혈 검사와 균 검사, 드레싱까지 잔뜩 일이 밀려 있다. 그렇게 밀린 병동 일을 하다 보면 1층 외래 채혈실에서 콜이 온다.
외래 환자들은 입원 환자가 아니라 방문 환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짬을 내 빨리 채혈을 하는데 못 갈 경우 다른 인턴에게 부탁해야 한다. 1층 채혈실과 12층 병동을 오가며 일하다 보면 흉부외과 수술장에서 전화가 온다.
조직검사용 검체가 나왔으니 받아가라는 전화다. 그러면 재빠르게 물품을 준비해서 3층 수술장에 가서 검체를 받아야 한다. 유독 일이 몰리는 날에는 아침 6시부터 1시까지 도통 앉아서 쉴 시간이 없다. 한마디로 정신이 없다.

심폐소생술 환자 처치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옆 병동에서 발이 묶였다. 다행히 환자는 소생해서 추가적인 처치를 위해 중환자실로 내려가고 옆 병동의 담당 인턴이 따라 내려갔다. 나는 다시 내 병동으로 와서 그 시간 동안에 더 밀린 일들을 처리했다. 그러던 도중, 옆 병동 간호사가 전화하더니 자기 병동의 인턴 선생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내려가 있으니 밀려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중 보호자가 가야 해서 급하게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오후에 해도 상관없는 일들이었다. 더군다나 담당도 아닌 다른 병동 인턴인 나에게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독촉을 여러 차례 한 것이다. 우리 병동의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전화한 간호사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순간 어이가 없었다. 그 병동 간호사들은 병동 일밖에 안 하는 인턴이 자기 일 아니니 하기 싫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고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담당 병동으로 돌아와서 급한 불을 껐다.
오후가 지나서야 겨우 여유를 갖고 옆 병동 수간호사님을 만나러 갔다. 아무리 자기 병동 인턴이 없어서 일이 밀린다 해도, 옆 병동 역시 일이 밀려있을 텐데, 급하지 않은 일을 부탁하고는 대꾸 없이 끊어버리는 것은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행히 수간호사님이 이해해주셨다. 전화한 간호사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나중에 인계할 때 주의를 주라고 말씀드렸다.
인턴들이 여기저기 불려가서 몸이 자유롭지 않을 때가 많다. 물론 급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쉬다가 콜을 쌓아두고 갈 때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말 바빠서 못 가는 상황에서는 인턴, 그리고 간호사들 사이에 신뢰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응급상황 때문에 일이 밀리게 될 때면 더욱 그러하다. 간호사들은 인턴이 병동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던데, 그 또한 쉽게 치부해버리는 편견이 아닐까.
주치의를 하는 동안 폐암 검사 도중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하여 말 그대로 '암 말기'인 환자들을 보았다. 수술적 치료도 의미 없고 환자의 남은 수명 역시 짧다. 그럴 때 딜레마에 빠진다. 학문적, 통계적으로 알려진 폐암 말기의 기대 수명을 환자 본인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냐는 보호자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고 보호자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이어 향후 치료에 관해 설명하던 중 어지러워서 더는 못 듣겠다고, 환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하고는 자리를 일어섰다. 보호자를 붙들고 그래도 환자가 본인의 병을 알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남편이었던 보호자는 아내에게는 본인이 직접 전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환자를 만나러 병실로 찾아갔다. 보호자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환자는 꽤나 담담하게 본인이 폐암 환자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암 선고'라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보호자나 의사 역시 환자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내가 만났던 환자들은 자신이 폐암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치료에 관해 귀를 기울였다. 이 환자도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폐암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
미안한 마음이 일렁이던 주치의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 사건이 혼재했던 마지막 주에 이르니 병원이란 전장에서 마주치는 편견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14편에서 계속>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호흡기 내과 초짜 인턴의 특별한 경험 '주치의' 2015-12-11 05: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