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지방병원 응급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박성우
발행날짜: 2016-01-30 05:05:45
-
가
-
인턴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박성우의 '인턴노트'[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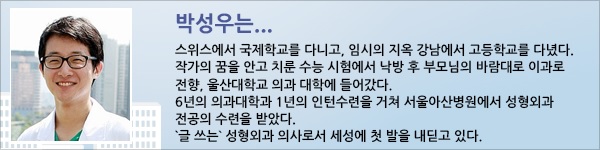
서울 본원에서 늘 희귀 질병과 각종 암 질환을 봐서 그런지 보령 병원은 지역 종합병원이었음에도 생각보다 경한 질환군이 많았다. 더군다나 응급실(ER)에서 당직을 서는 날에는 ‘굳이 응급실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본원 응급실은 각 지역의 2차병원에서 치료나 처치가 어려운 환자들이 ‘서울 큰 병원 가야 살 수 있다’는 믿음에 이끌려 내원한 환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위급하고 중한 질환 때문에 응급실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물론 보령 병원 응급실에도 위급한 환자들이 내원할 때는 있었다. 하지만 50명 혹은 100명 중 한 명 꼴이었다.
감기약을 먹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 보채는 아기, 변비 때문에 배가 아파서 온 할아버지, 자다가 숨이 차서 왔지만 아무 이상 없는 아저씨, 술 취해 넘어져서 왔는데 술이 깰 때까지 잠만 자는 아저씨, 술자리에서 속이 뒤집혀서 오는 청년. 이들은 응급실에서 당직을 설 때마다 오는 단골 손님들이었다.
“어디가 불편해서 응급실로 오셨나요?”라고 문진의 운을 띄우자마자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아파서 진통제 좀 맞고 갈게요”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응급실이 응급한 환자를 보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응급실을 동네 의원처럼 생각하고 드나든다는 간호사의 말처럼 진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내가 쉽게 생각하고 놓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겼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는 이 병은 절대 죽는 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힘들다고 지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꼭 작은 아드님이 계시는 서울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셔야 돼요. 85세이시면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도 있어요. 작은 아드님이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기다리신대요. 꼭 치료받으셔야 돼요.”
복통과 변비 때문에 왔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내원했다. 일반적인 변비나 장염으로 보기에는 비특이적 측면이 있어서 복부 CT 검사를 해보았다.
전반적인 복막염과 소장 부종, 복수까지 동반되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고령에 기억도 가물가물 하신지 문진도 시원치 않았고 원인도 뚜렷하지 않았다. 외과 과장님과 상의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그리 말씀드렸다.
첫째 아들도 아파서 집에 누워있다던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살만큼 살았다고 그냥 할아버지 집에 가서 편히 죽는 것이 낫겠다며 서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럴 때 추후 가족 친지들로부터 항의가 심하게 들어올 경우 빈번히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들었다.
동네 이장님을 통해 어렵게 할머니의 작은 아들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상황을 알리고 타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이송차량까지 준비된 상황에서 할머니는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첫 응급실 당직을 앞두고 베테랑 수간호사님이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응급 질환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를 다루는 기술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를 거부하고 포기하려는 환자나 보호자를 다독이는 것이 의사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지쳐 앉아있던 할머니 앞에 반쯤 무릎을 꿇고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던 것은 안타까운 마음과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젼이 되고 싶은 희망과 스스로 재미를 느끼던 봉합 술기였기에 창상 환자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리창이나 바닥에 쓸리고 베인 상처들을 깨끗이 소독하고 잘 봉합해 놓으면 뿌듯하다.
치료 과정도 무척 재미있다. 상처는 늘 깨끗하게 직선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상처가 여러 갈래 찢기거나 사선으로 진찰될 때 상처에 맞게 어떻게 봉합할까 생각하며 처치실에서 조용히 진료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갔다 한밤중에 유리창에 팔을 여러 곳 베여 온 환자가 있었다. 몰래 카메라를 하기로 서로 꾸미고 화내는 연기를 하던 중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다가 깨지는 바람에 창상을 입은 것이다.
선배나 당하던 후배들 모두 놀라 단번에 달려왔다. 예쁘게 봉합하는 동안 MT를 온 이 친구들이 부럽기도 해서 적당히 살살 연기하지 왜 이리 오바했냐는 핀잔을 주기도 했다. 깨끗이 봉합한 상처를 남학생에게도 보여주고 흉터는 남을 것이라 말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상대할 때 제일 까다로운 사람은 소아환자들이다. 소아들은 증상이 저명하지도 않을 뿐 쉽게 좋아졌다가도 쉽게 나빠진다. 대부분 일시적인 장염이나 후두염일 때가 많지만 응급실까지 와도 아기의 열이 떨어지지 않고 보채거나 열성 경련까지 하는 날에는 진땀을 뺄 수밖에 없다.
응급실은 인턴에게 매력적이지만 두려운 곳이다. 입원 환자들을 대할 때처럼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볼 수 없다. 주어진 정보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재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는 학생 때 배우던 대로 일했는데 오히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응급실은 어디까지나 응급실이었다. 위급하고 중한 환자들을 경한 환자들 사이에서 먼저 재빠르게 감별해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보다는 중증도로 분류하고 처치한 다음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훌륭한 응급실 의사는 ‘교통정리’를 잘하는 의사다. 응급실에서 가능한 검사와 의료진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간혹 종합검진 수준의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환자가 요구할 때는 난감하다. 그런 때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잘 설득하는 것이 지역 병원의 응급실을 지키는 인턴의 능력이다.
<22편에서 계속>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충청남도 보령, 바쁜 도시를 벗어나기 2016-01-29 05:05:23
- 또 다시 한달이 지나고…소화기내과, 안녕 2016-01-26 05:04:45
- 치료 대신 요양병원, 그 마지막 순간의 위로 2016-01-20 05: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