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황반변성 보험 치료하려면 한 눈만 나빠져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6-12-21 05:00:58
-
가
-
Anti-VEGF 보험적용 14번 제한에 양안 환자들 '눈물'
"어르신,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건강보험으로 겨우 황반변성 치료를 받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그동안 '아일리아'라는 주사를 맞아왔다.
"어르신 병에 놓는 주사는 나라에서 14번 밖에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아요. 어르신은 양쪽 눈에 황반변성이 있다보니 사실상 맞을 수 있는 기간이 한쪽 눈에만 병이 있는 환자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쪽 눈 나쁜 사람이 14번 맞을 수 있으면 양쪽 눈 나쁜 사람은 갑절로 맞게 해줘야죠."
그렇다고 80만원이 넘는 약을 비급여로 권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계속 투여하면 아직 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삭감이라는 벽은 너무 높았다.
'오프라벨로 처방해야하나' 김 교수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정한 걸요. 다른 약을 찾아볼께요."
가뜩이나 흐릿한 눈에 눈물을 머금고 나가는 노인을 바라보니 괜히 자신이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얼토당토 않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대학병원 교수의 자문을 통해 재구성한 스토리다. 지금도 황반변성 환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황반변성 치료제 보험인정 횟수…단안·양안 관계없이 14번 불합리"
황반변성 환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구간의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60대 28.2%, 50대 14.6% 순으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1월 1일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 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투여 횟수와 관련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료진 및 환자들의 불만이 높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나 '루센티스' (라니비주맙) 등 Anti-VEGF 제제는 환자당 총 14번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아일리아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1회 주사하고 이후 2개월마다 1회씩 주사한다. 만일 단안 황반변성 환자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맞기 시작했다면 2017년 8월까지 아일리아를 투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안 황반변성 환자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도 같은 해 10월이면 14회를 다 채우게 된다. 1회 치료에 주사를 두 번 맞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은 일이 진료실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의료진의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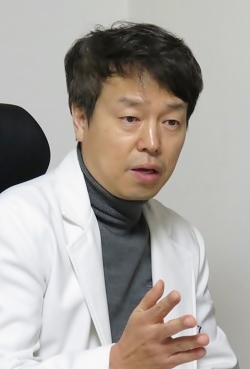
김철구 교수는 "아직까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은 이상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인정돼 있는 치료가 바로 anti-VEGF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서 기준한 약 횟수를 다 쓰면 그 이후에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황반변성 치료제 보험인정 투여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황반변성 치료제는 고가 약인데 매달 80만원 이상을 내고 비급여로 맞을 수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될까"라며 "보험인정 14번은 부족한 횟수다. 확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학교 안과 이성진 교수 역시 "양안 황반변성 환자는 한번 치료에 주사를 두 번 맞다보니 단안 황반변성 환자에 비해 치료 기간이 거의 절반 정도"라며 "급여 인정 투여횟수가 다 된 환자에게 말할 때 힘들다.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로 권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치료효과 기준 애매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황반변성 치료제 급여기준에 따르면, 초기 3회 투여 후 치료효과가 없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일리아와 루센티스 간 교체투여 후에도 3회 투여 후 효과가 없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해부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약을 계속 쓰는데 심사에서 '시력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치료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면 꼼짝없이 삭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김안과병원 김철구 교수는 "급여기준에서 말하는 치료효과라는 것이 사실 참 애매하다"며 "수치상으로 시력이 얼마나 좋아졌냐, 안구광학단층검사(OCT)를 했는데 증상이 얼마나 줄었느냐 등 정해진 것이 없다. 나쁜 의미로 볼 때 삭감할 때 잣대가 없다는 것"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급여기준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횟수가 누적되고 환자가 늘어나다보니 삭감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의료진은 급여기준을 보면 시력이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력적인 부분 역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김철구 교수는 "예를 들어 시력 기준을 광각인지, 안전수동, 안전수지 등으로 나누는데 안보이는 분들에게 손가락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안전수동)과 갯수 세는 것(안전수지)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혼자 길을 다닐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렇게 따지면 안전수동에서 안전수지로 좋아졌다고 할 때 의사 또는 환자 입장에선 시력적으로 좋아진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좋아졌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크게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이슈도 되지 않았는데 만일 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면 어떤 경우에 써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고 환자에게 설명하기도 좋다"며 "지금처럼 환자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사는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하면 일선 현장에서는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자를 위한 의사 목소리 믿어달라"
결론적으로 황반변성 환자들을 위해 치료제 투여횟수의 급여 인정 확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치료받고 싶어하는데도 의사로서 안 된다고 말 할 때 마음이 저리다. 내가 환자를 위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편집자주|'급․기․야'는 '급여기준 이젠 이야기 할 때'의 줄임말로, 건강보험 재정절감 때문에 제한적인 의약품 및 치료행위 등의 급여기준을 개선해, 환자의 의료서비스 혜택 확대를 추구하는 메디칼타임즈의 연재 컨텐츠입니다.
관련기사
- 보험약가 높은 황반변성 치료제, 삭감액도 '최고' 2016-09-23 05:00:56
-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울고' 아일리아 '웃고' 2016-09-13 12: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