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약사가 자살예방 상담한다고?" 의료계 비판 일파만파
박양명
발행날짜: 2018-07-02 14:57:00
-
가
-
"자살예방 근거 전혀 없다…공개된 장소서 상담, 비윤리적 행위"
약사들의 자살예방사업 반대 목소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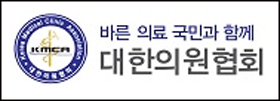
대한의원협회는 "약사의 자살예방 중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정부의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작업이 투명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약사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활용한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약사회를 선정하고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약국 250여곳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
약사가 약학정보원이 만든 '자살위험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자살 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자살 위험을 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협력 약국에 상담료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보다는 자살 충동을 자극하는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복약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정부와 약사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된다면 법적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약사회에 커다란 선물보따리를 풀어준 복지부의 결정 과정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시행으로 오히려 환자에게 자살생각을 부추기거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관련 진료과 단체를 비롯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학회와 의사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약국 자살예방시범사업은 무모한 사업"이라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병의원을 방문하고 처방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자살위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상담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즉, 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은 "자살상담 같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상담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격리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살 같은 은밀한 개인적 내용을 상담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징계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세 번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대국민 홍보포스터까지 제작했다.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는 자살사고, 어설픈 비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전면에 실은 포스터를 공개한 것.
의협은 자살예방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물 정보를 조회하고 공개적 장소인 약국에서 자살 위험에 대해 상담하는 행위는 환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살 관련 상담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영역으로 다른 진료과 의사도 협진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의학을 배운적도 없고 의료인도 아닌 약사가 자살에 대해 상담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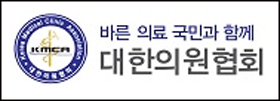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활용한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약사회를 선정하고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약국 250여곳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
약사가 약학정보원이 만든 '자살위험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자살 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자살 위험을 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협력 약국에 상담료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보다는 자살 충동을 자극하는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복약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정부와 약사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된다면 법적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약사회에 커다란 선물보따리를 풀어준 복지부의 결정 과정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시행으로 오히려 환자에게 자살생각을 부추기거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관련 진료과 단체를 비롯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학회와 의사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약국 자살예방시범사업은 무모한 사업"이라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병의원을 방문하고 처방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자살위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상담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즉, 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은 "자살상담 같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상담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격리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살 같은 은밀한 개인적 내용을 상담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징계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는 자살사고, 어설픈 비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전면에 실은 포스터를 공개한 것.
의협은 자살예방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물 정보를 조회하고 공개적 장소인 약국에서 자살 위험에 대해 상담하는 행위는 환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살 관련 상담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영역으로 다른 진료과 의사도 협진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의학을 배운적도 없고 의료인도 아닌 약사가 자살에 대해 상담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