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우리의 직업은 평범한 톱니바퀴
김재의
발행날짜: 2020-03-05 05:45:50
-
가
-
의대협 김재의 부회장(경희의대 의학과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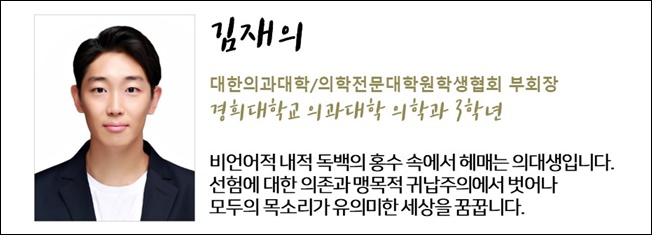
|경희의대 의학과 3학년 김재의| 우리는 태어날 적부터 사회라는 거대조직의 일원이 된다. 사회를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작은 규모의 사회이고, 이러한 모양새는 하나의 사회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개인 단위로 세분화될 때까지 이어진다. 그렇기에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 혹은 거대한 기계에 비유되곤 한다.
그 기계의 일부를 이루는 우리는 어디 즈음에 위치하고 있나요? 왜 우리는 우리가 현재 위치하는 데에 자리하게 됐나요? 그 자리가 우리를 누군지 규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그 자리를 규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누구에게 던져야 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의사는 아주 독특한 입지에 자리한다.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에 타의적이고, 인구집단의 보편적 건강을 위해 운영되기에 전체주의적이다. 또한 진료의 가성비를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제도이기에 진료의 질보다는 경제적인 운영에 더 치중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제도가 운영됨에 있어, 수가 책정이 이루어진 항목들은 평균적으로 원가보전조차 보장이 되지 않다. 국가 당국의 손을 떠났지만 채워지지 않은 금전적 공백은 의사들의 피땀으로 채워지고,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이 이루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타의적, 전체주의적, 경제적 최적화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의 유지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시적 관점의 문제만이 비단 우리를 기계화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대내적으로 우리 스스로마저 매너리즘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의사가 되기 전, 의대생일 때부터 우리들은 가공이 되기 시작한다.
의대생들은 입학 직후부터 여러 전제들, 관습들, 성문화돼 있지는 않으나 암암리에 존재하는 규범들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교육받는다. 그리고 임상 실습 과정에 들어서면서,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운영되는 듯 하는 하나의 사회인 병원을 체험하며 결국 스스로의 존재를 정리하게 된다. 우리는 행정적 기계 속으로 산입이 된다. 결국 우리는 기관이 운영됨에 있어 다스려지는 사물로 약호화 및 규격화 된다.
안타깝다. 이 글에 전부 담을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시적·미시적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이렇게 됐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굴레들이 실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조차 우리의 잘못만은 아님을 알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돌파구가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 생명을 다루는 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미래에 할 우리는 이런 사유조차 할 시간이 부족하기에, 우리 앞에 제시된 정도(正道)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결국 탈선 정도로 취급이 되곤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는 점도 알기에, 우리는 더욱 각성해야만 한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대내적·대외적 개선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기계는 그 내부가 워낙 정교하고 복잡하기에, 톱니바퀴와 같은 부품 하나가 고장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톱니바퀴가 불량일 수 있으니, 우선 흔히들 톱니바퀴를 먼저 교체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체를 몇 번이나 해도 계속 그 톱니바퀴가 고장난다면, 다른 부품이나 구동 방식이 불량이라 톱니바퀴가 고장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작금의 우리는 이 이야기 속 톱니바퀴다. 세상은 더 이상 거대한 기계 속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만 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합리성은 객체가 대놓고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심화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타성에 젖은 현상(現狀)에서 능동적으로 벗어나야만 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우리 모두 빨간 약을 택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