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나홀로 레지던트 3년째…사람 살리는 보람 짜릿"
|메디칼타임즈의 약속③|"의료계 소외된 곳을 찾아갑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1-04 06:58:44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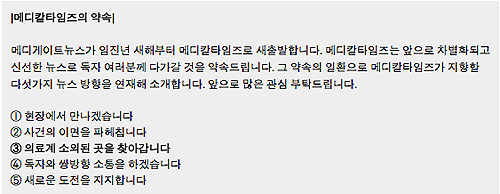
본과 3학년 당시 이 씨는 심근염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 원인도 알 수 없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했다. 관상동맥촬영술 등의 검사를 받으면서 이 씨는 사람을 살리는 보람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그렇게 이 씨는 2009년 동아대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1년차가 됐다. 하지만 동경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기자가 그의 하루 일과를 동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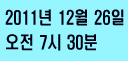
동아대병원 8층 흉부외과 의국은 이정훈 씨가 전세낸 것과 다름 없다.

레지던트 4년차를 맞은 올해, 1년차 레지던트가 들어온다.
흉부외과장인 최필조 교수는 "신입 레지던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국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축제 분위기였다"고 당시 흥분됐던 상황을 떠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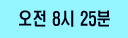

이 씨의 일주일 스케쥴은 5일 당직, 휴일 이틀이다. 쉬는 날에는 전임의와 젊은 교수님이 하루씩 선다.
이 씨는 "1~2년차 때는 가장 큰 소원이 오프가 많아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직업 자체가 교수가 된다고 두 다리를 뻗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쉬고 싶다는 미련은 줄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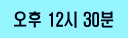

아침에 한 간호사가 "이 선생님이랑 대화를 1분 이상 할 수가 없다. 응급실, 병동, 중환자실 등에서 전화가 하루 종일 오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이 씨도 전공의가 혼자이다 보니 일이 한번에 몰릴 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중환자가 있으면 환자 상태를 체크하며 매달리는 것도 벅찬데 다른 환자에게 쇼크가 오면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중환자가 2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응급실로 중환자가 실려오는 날이면 손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 없다. 사정을 모르는 보호자가 항의라도 할 때면 속상하기까지 하다.
이정훈 씨는 "3년차가 지나면서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해 요령이 생기고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게 늘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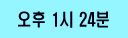
잠깐 주어진 면회시간 동안 이 씨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혹시나 있을 가족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란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오후 2시가 돼서야 수술실에 마련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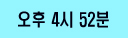
이 씨는 "중환자는 생존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걸 딛고 살아나면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는 타과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다. 안느껴 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련 후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흉부외과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과 좋으니까 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흉부외과는 학문의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재미있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후배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씨는 올해가 지나면 우선 군복무를 해야 한다. 제대후에는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겪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병원은 임상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타과와 연계한 컨퍼런스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면이 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부당청구 누명, 후배들까지 당하게 둘 순 없었다" 2012-01-03 06:2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