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원격진료 가상 미래…의사, 처방전자판기 신세되다
대형 원격전문의원에 눌려 개원가 붕괴 "디스토피아에 가깝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11-27 06:50:38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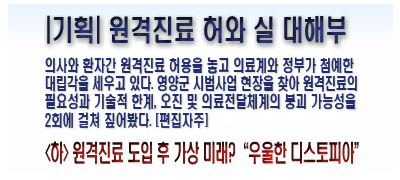
"복제가 원본의 아우라를 파괴한다"고 주장한 미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차라리 디스토피아의 음울한 미래를 역설적으로 이름 붙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나 조지 오웰의 <1984>가 더 어울리는 풍경이다.
기계적 복제가 원본(대면진료)의 개념을 대체한 2023년. 원격진료를 허용한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원본의 가치는 묻지 않으니까.
출근하자 마자 커피 한잔을 들이키며 대충 의사 가운을 걸쳤다. 어차피 카메라는 상의만 비추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하의는 어찌됐든 상관없다.
모니터에 불을 켰다. 한 두 명씩 뒤이어 들어온 동료들도 모니터에 전원을 넣는다.
열댓명이 모인 오피스텔이지만 그래도 이름은 어엿한 '원격진료 전문 의원'이다.
각자 컴퓨터 앞에서 헤드셋을 머리에 쓴 채 화면에 열중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의사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마치 텔레마케터와 같다고나 할까.
몇년 전 개원을 했다가 대형 원격진료 전문 기관의 공세에 밀려 의원을 접은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입맛이 쓰다.

아뿔싸! 상황이 바뀐 건 불과 1년. 원격진료 전문 의원이 지역 환자를 싹쓸이 하자 인근 병의원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갔다. 뒤늦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격진료 장비를 도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만만찮은 장비 비용을 지불했지만 원격진료 신청은 고작 하루 한 두 건.
그나마 요청이 들어오면 대면진료를 중단하고 얼른 단말기 앞에 앉는 일도 고역이었다. 매달 청구되는 장비 리스비용과 원격진료 통신 서비스 요금도 골치를 아프게 하기는 마찬가지.
개원을 접고 이곳에 봉직의로 눌러앉은 건 천만다행이라고나 할까. 동료 의사들도 대부분 비슷한 경우다.
잡생각이 꼬리를 무는 사이 모니터에 환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차트 번호 425번. 아! 그 당뇨병 환자. 여러번 봤지만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번호로 기억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잠시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사이 뚜뚜뚜. 기계음이 울린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전송돼 들어왔다. 데이터를 확인한다.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어차피 클릭 몇 번이면 세련되고 멋진 주의 안내문이 환자의 단말기 화면으로 전송된다. 복제란 정말 의사의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멋진 발상 아닌가!
한명의 환자를 보는 사이 벌써 대기 순서는 13명을 가리킨다. 제주도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환자들이 원격진료 요청을 보낸다.
이번엔 273번 환자. 70대의 고령으로 매번 생체 측정 기기 조작이 서툴러 많은 진료 시간을 잡아먹는 달갑지 않은 환자다.
이번에도 혈압계 오작동으로 5분여가 지체됐다. 다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 환자의 요청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조금만 늦게 환자를 봤다가는 원장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원장의 모니터에는 의사들이 하루 몇 명을 진료했는지, 한 명당 몇분을 소비했는지 자료가 남는다.
실적이 좋지 못한 동료들은 한달 주기로 퇴사한다. 하지만 빠르게 환자를 보고 처방전을 입력하는 스킬만 있다면 걱정없다. 원격진료는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제도니까.
점심 시간까지 100명 가까운 환자를 봤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입력하려면 진료 시간은 30초에서 1분이 적당하다. 어차피 청진도 타진도 없으므로.
개원했을 당시 저수가에 3분 진료를 보던 때가 오히려 낭만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10여년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었지"라고 자조하는 동료 의사들도 더러 있다.
어느 덧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의사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근황을 묻는다. 한 동료는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혀를 찼다.

다른 동료는 얼마 전 뉴스에서 들은 "통신사가 환자 정보를 보험사에 팔고 뒷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원격진료 전용 약품 택배 시장이 매년 10%씩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부가 원격진료 단말기 보급 민자 유치를 위해 당분간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게다가 정신질환자에 이어 원격진료 대상 환자도 대폭 늘린다니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런 멋진 제도에 반대하는 환자들은 바보다. 편의를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갈 수 있는 1차 기관이 없어서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한다나 어쩐다나.
점심 시간 종료 알람이 울린다. 퇴근 전까지는 200명의 진료 실적을 채워야 한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말이다.
얼핏 의대 시절도 생각난다. 당시엔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는 의사의 모습을 상상한 것도 같다.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한 대면진료가 진짜 의료라고 믿고 있었던 때도 있었다. 의료와 진료의 개념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방식이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벌써 업무 마감 시간이다. 오늘 본 환자는 총 183명. 이달 인센티브는 물건너 간 것 같다. 화상 모니터의 전원을 끈다. 내일은 기필코 200명의 환자를 봐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며.
공장과도 같은 의원 문을 닫고 나와 건물 앞 자판기에 섰다. 동전을 투입하고 커피를 꺼내려는 순간 떠오른 의문 하나.
"과연 IT기술의 발전이 장미빛 유토피아를 보장해 주는 걸까?"
의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처방전 자판기로 사는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냐는 물음.
의료는 무조건 싸고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냐는 근본적 질문 앞에 시선은 찬 아스팔트 바닥 위로 고정되고 있었다.

관련기사
- "병원 가려면 꼬박 하루 허비했는데 그나마 다행" 2013-11-26 06:3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