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의대 교수만 꿈꾼 20년…하루 아침 백수 신세"
대학병원 경영난에 전임의 대거 퇴출 "높은 스펙 오히려 역차별"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1-16 06:40:56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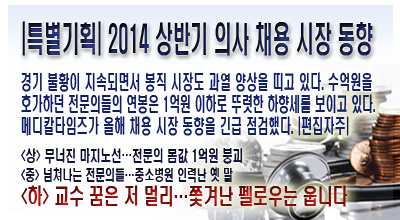
국내 굴지 대형병원의 임상 조교수로 재직중인 42세의 A씨. 그는 최근 의사 헤드헌팅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며 생애 처음으로 봉직 시장을 노크했다.
허리띠 졸라매는 대학병원…전임의들 추풍 낙엽
의과대학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 인재로 손꼽히던 A씨.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마침 정년 앞둔 교수님도 몇 분 계셔서. 1년만 더 버티자 1년만 더 버티자 하다보니 여기까지 온거죠."
전공의 과정을 합쳐 그가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15년. 의대 시절까지 하면 20년이 훌쩍 넘는다. 전임의만 3년을 꼬박 채우고 나니 임상 조교수 제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또 4년을 버텼다.
하지만 지난해 말 병원에서는 재계약이 힘들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15년간의 병원 생활이 하루 아침에 끝을 고한 것이다.
"말이 좋아 조교수지 사실 2년 단위 계약직이에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거죠. 차라리 펠로우만 마치고 병원을 나갔어야 했어요. 도대체 뭘 바라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비단 A씨 뿐만이 아니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환자 감소로 대학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전임의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교수는 구조조정이 힘들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전공의들은 필수적이니 중간자인 전임의들과 임상 조교수들을 정리하는 대학병원이 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또 다른 대형병원의 전임의 4년차인 B씨도 최근 교수 발령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 통보다.
B씨는 "4년이나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러한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면서 "사실상 직업과 꿈 두가지를 잃는 셈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임금 동결이다 인센티브 감축이다 논란이 많지만 우리처럼 한 칼에 나가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경영난의 최대 피해자"라고 털어놨다.
무너진 꿈, 좁아진 취업 시장 "갈 곳이 없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일부 대학병원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채용업체 관계자는 "과거 유명 대학병원 출신 전임의들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봉직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이 늘면서 이들의 대우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전임의를 마친 C씨는 같은 지역 종합병원에 Net로 월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했다. 같은 나이의 내과 전문의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금액이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도 유방외과 전문의를 월 1천만원 봉급에 구하고 있다. 세부 전문과목을 명시한 것 치고는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월급이다.
과거에는 전임의 출신이 신규 전문의에 비해 고난도 수술을 접해본 만큼 일선 종합병원에 특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또한 대부분 자리가 채워지면서 큰 매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전임의나 임상 조교수 출신 등은 너무 높은 스펙으로 인해 오히려 취업에 역차별을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앞서 임상 조교수 4년을 마친 A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A씨는 "사실 임상 조교수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애매한 위치"라며 "아예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수 출신은 메리트가 있지만 사실상 중간자인 전임의, 임상 조교수 등은 오히려 애매한 포지션이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된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다. 대형병원들이 전국의 환자들을 흡수하면서 이들이 설 자리가 좁아들고 있는 것이다.
채용업체 관계자는 "일부 대학병원에 준하는 종합병원이 아니면 고난도 수술 수요가 거의 없다"면서 "그나마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에서는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문의 억대 연봉 옛말 "취업만 해도 좋겠다" 2014-01-14 06:5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