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전, 외과가 좋은데 엄마는 피부과를 하래요. 어쩌죠?"
헬리콥터맘이 키운 의사들…전공선택서 부모 입김에 갈팡질팡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26 05:48:25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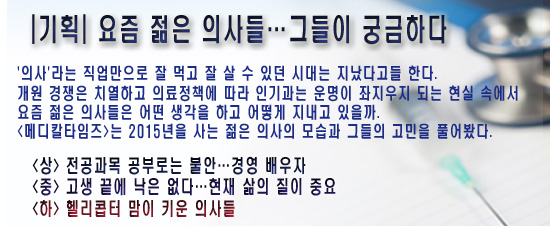
# B대학병원 교수는 한 레지던트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딸이 간호사와 마찰로 힘들어 하는데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였다. 전후 사정을 몰랐던 교수는 난감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일단 사과를 했다.
최근 소위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의대 교과과정은 물론 전공선택에까지 깊게 관여하고 있다.
'내가 키운 의사'라는 자부심과 자식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년 전 전국의대생·전공의학부모협의회라는 명칭 아래 전국 의과대 및 전공의 학부모들은 "더 이상 병원에서 내 아들, 딸이 혹사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내 자식이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로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바꿔보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부모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서른살이 다 된 성인이 스스로 책임져야할 부분까지 나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C의과대학 본과 4년 이모군(23)은 전공 선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실습을 하면서 외과의 매력에 빠졌는데 부모가 피부과를 원하기 때문이다.
수차례 설득해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설득하려 들었다. 이군은 스스로도 적성이나 관심은 외과에 있지만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갈팡질팡 흔들렸다.

김 센터장은 "부모가 원하는 전공과 달라 고민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다"고 했다. 그는 고심 끝에 학부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다. 전공선택 등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D대학병원 모 전공의는 "동료 중 상당수가 전공선택을 두고 부모와 갈등을 겪는 사례를 종종 본다"며 "대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경우인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부모의 욕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의대 시절 성적에 불만을 느낀 학부모가 교수를 직접 찾아와 항의했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다"며 "중고등학교부터 시작된 치맛바람이 의과대학에까지 이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에 씁쓸했다"고 토로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고대병원 성형외과)은 "이를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보다 수능점수에 맞춰 의과대학을 선택하는 것 또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라며 "당장 지금의 문화를 바꾸기는 힘들지만, 보다 독립심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 시스템을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전공의 시절만 참으면 된다고? 고생 끝에 낙 없더라" 2015-03-25 06:00:08
- '정재영' '피안성' 무의미…"뭘해도 팍팍한 의료현실" 2015-03-24 05:4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