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13시간 팔다리 묶인 조현병 환자 사망, 병원 책임은
서울고법, 1억여원 배상 판결…병원 "치료 적절했다" 상고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2-01 05:00:22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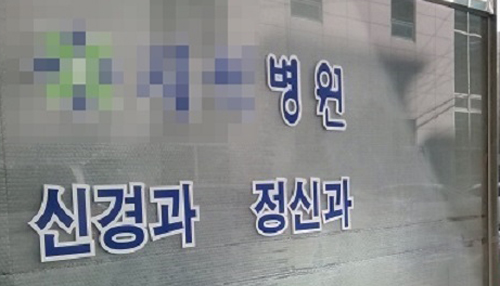
열 번째 강박 치료를 받던 날 이 환자는 돌연 사망했다. 부검 결과는 폐동맥혈전색전증.
유족 측은 강박 치료를 과하게 해 몸 안에 혈전이 생긴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했고 강박 치료를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4580만원. 병원 측은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환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는 30대 초반, 평소에 앓던 조현병이 재발해 법무부 산하 B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한 날부터 약 열흘 동안 9번에 걸쳐서 강박 치료를 받아야 했다.
뛰다가 바닥에 몸을 던지고, 출입문을 어깨와 손바닥으로 치는가 하면, 침대 위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씨는 병원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른 환자와 직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의료진은 강박 치료를 했다. 양쪽 팔과 한쪽 다리만 고정하는 3포인트, 양쪽 팔과 다리를 모두 고정하는 4포인트 치료를 했다.
A씨는 그렇게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3시간 30분 동안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묶여 있어야 했다. 밤새도록 강박 치료 상태에서 잠을 잔 것. 열흘 사이 A씨의 몸무게는 약 4kg 빠졌다.
입원 열흘째 되던 날, 병실에서 쿵 소리가 나길래 달려가보니 A씨가 혈압기 앞쪽에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외상은 없었다. 1분간 대답이 없고 숨을 '푸'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자신을 부른 소리에 '네'라고 답했다. 의료진은 A씨를 부축해 안정실로 옮겨 눕히고 안정간호를 위해 또다시 3포인트 강박을 실시했다.
강박 2분 후, A씨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며 숨을 몰아쉬었고, 간호사의 손짓에 눈을 깜빡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의식이 없었다. 의료진은 A씨의 격리 강박을 종료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가 쓰러진 순간부터 상급병원 이송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부검 결과는 폐동맥혈전색전증이었다. 양쪽 폐동맥과 소동맥 안에서 다량의 혈전색전이 관찰됐고, A씨 오른쪽 종아리 부위 심부정맥에서도 혈전이 관찰됐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강박 치료 실시 과정에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했다고 호소했다.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과 병원 자체 규정은 모두 강박 시행 시 최소 2시간 간격으로 환자 팔다리를 움직여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병원 의무기록상 의료진이 A씨의 관절범위 운동 상태를 점검한 것은 총 7회뿐이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은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A씨 양 다리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게 하거나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가능한 일정한 간격으로 다리를 움직여주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설명의 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B병원 측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였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박 치료 실시 전 즉시 강박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 서스티나vs메인테나, 월1회 조현병 주사제 대격돌 2016-08-31 13:51:47
- "부당한 민간정신병원 지정 신청 요구, 제보 받습니다" 2017-01-24 12:0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