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무한경쟁 사막에서 '워라밸' 쫓는 제약 유목민들
|창간 15주년 기획| 극단적인 '욜로 현상' 지나 일과 삶의 균형에 무게
일부 직군 기피현상…때아닌 이직률 급증에 인력 수급 '진땀'

원종혁 기자
기사입력: 2018-07-05 06:00:59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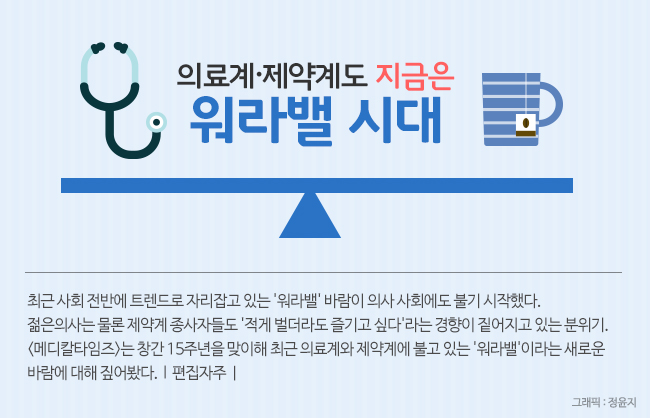
#김 모씨(가명·33세)는 최근 더 나은 '워라밸'을 쫓아 두 번째 이직을 결정했다.
6년여가 넘는 제약 에이젼시(홍보대행) 경력을 뒤로하고 옮긴 곳은 다국적 제약사.
알음알음 알고 지내오던 주변 선후배들의 조언에 몇날 며칠을 심사숙고하다 '워라밸 유목민'이 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는 "전 직장에서 피로감이 굉장했어요. 계속되는 비딩(biding) 경쟁과 끝없는 업무는 강철 체력을 가진 사람도, 부처같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도 결국 지치게 만들어요"라고 푸념했다.
매일 쳇바퀴 굴러가듯 이어지는 야근과 업무 사이클에 넌덜머리가 날 즈음, 인하우스(다국적제약사 이직)에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졌다고도 했다.
회사의 네임밸류보다는 업무간 효율성과, 제 때 낼 수 있는 연차 휴가에 더 끌렸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 생판 다른 분야에 도전할 자신은 없었지만, 야근 없는 삶을 누려보고 싶다는 것 뿐"이었다.

이들은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며 최신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통한 20, 30대였다. 한 자리에 정착하기를 거부하며, 편의성과 신속성을 우선시 한다는게 특징이었다.
그러다 최근, 비슷한 성향을 품은 신조어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최신 정보 습득에 익숙한 이들 젊은 직장인 사이에는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열풍을 거쳐,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 브랜드와 커리어를 따지던 디지털 유목민들이 '워라밸 유목민'으로서 정체성을 잡아가는 또 다른 현상이 그려지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부터 욜로까지, 2018 이직 키워드 '워라밸'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업종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확연하다.
특히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표방한 다국적 제약기업 종사자들 사이에는 '질 좋은 근무시간'을 바라는 유목행렬이 더 길어졌다.
가족적이고 조직 문화가 강한 국내사보다는,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외국계 제약사를 선택한 이들의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 다국적 제약사 인사 담당자는 "외자사는 신규 채용이 드문데다 내부적으로도 의사, 약사, 간호사, 수의사 등 라이선스를 가진 출신 비율이 높아요. 최근 경력 이직이 빈번한 제약 관련 에이전시에도 해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력직을 선호하고 고스펙을 가진 이들이 많은 탓에, 워라밸을 고려한 이직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수직구조 회식문화 강요 'N0'…"네임밸류 따진다고요?"
"우스갯 소리로 이런 얘기 자주 나눠요, 막상 일해보면 네임밸 따위 워라밸 발 끝도 못 따라온다고요."
외국계 화학제조회사에서 5년이라는 짧지 않은 경력을 뒤로하고, 제약 마케팅업으로 이직한 30대 후반의 박 모씨(남·기혼)는 이직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했다.
그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직군간 연봉 문제라기 보다는, 외국계 제조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수직구조가 분명하고 회식문화 군기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이직 후 세일즈 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팀단위로 움직이는 회식이 없는 편이라고 봐야죠"라면서 "주어진 시간에 내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성과주의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지금의 워라밸은 만족합니다"라고 했다.
홍보 대행업종에서 제약사(인하우스)로 넘어온 김 모씨(여·미혼)는, 늘상 촉박한 업무 압박과 야근에 시달리며 오랜시간 이직을 염두해왔다고 했다.
그는 "클라이언트의 시간을 기반으로 내 스케쥴이 결정된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라면서 "에이전시 담당자들은 보통 3~5개의 고객사를 담당하고 타임라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인이나 팀의 타임라인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어렵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직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지만, 사실 업무 타임라인의 문제나 워라밸 등 시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해요"라며 "일단 워라밸의 중요성에 대해 내부 임직원의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 공감하는 분위기도 강하죠"라고 말했다.
이직 빈도가 빨라진 홍보 대행 업종에도 한 마디 덧붙였다.
"에이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직률(turnover rate)가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라며 "일단 경력을 쌓고 외자사로 이직하고 싶어하는 비율도 높고, 과다한 업무와 최저 수준의 워라밸에 지쳐 떨어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직은 해결되지 않는 숙제 같아요."
10여년간 제약 마케팅 담당자로 여러번 적을 옮긴 경험이 있는 40대 이 모씨(여·미혼)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이직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헬스케어 분야 바이오 제약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목받는 인지도에 비해선 고용인원은 적어요. 도미노 현상처럼 경력직의 이직은 순간 순간 빠르게 이뤄지는 반면 신규 채용수가 많지 않은 구조죠"라고 귀띔했다.
동종 업계로 이직 후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할 몫은 늘상 따른다고 했다.
"정작 이직 뒤에 기대와 다른 사내 분위기와 성과중심주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탓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반대로 근속이 오래된 회사에서도 임직원들의 보수적인 성향이나 상하조직문화가 강조될 때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일 인간관계 부침…스트레스 못 견뎌"
약사 면허를 가지고 모 다국적 제약사에서 다년간 프로덕트 매니져로 근무해온 30대 후반의 오 모씨(남·기혼)는 최근 업계를 나와 창업을 결정했다.
그는 "A사에서 이보다 더 혁신적일 수 없다던 신약도 6개월 있으면 B사에서 비슷한 신약이 출시됐어요. 메시지도 비슷하고 임상 결과도 새로울게 없는데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거기서 거기라는데 업무적인 권태기도 있었고요"라고 회상했다.
그는 "아직 개업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익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본다면 약국 경영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유동적으로 분배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스트레스는 사람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정작 업무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전에 근무하던 제약사의 워라벨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라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가 첫 발을 뗐다.
한 외자사 마케팅 담당자는 "워라밸을 시간적인 문제에 국한시킬 수 만은 없다"며 "외국계 기업에서는 실수가 도태로 이어지는 만큼 개인에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외부에서 비춰지는 이미지와 달리 매순간 이직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영업왕·강소제약사의 비결…"노오력 대신 휴식을 허하라" 2018-07-04 06:00:59
- 막오른 주52시간 시대, 의료계 리더들의 소확행은? 2018-07-03 06:00:59
- 개원의도 워라밸 원하지만…현실은 하루 10시간 진료 2018-07-02 05:41:59
- 워라밸 좋아봤자 성희롱 다반사…"현실적 대안 부재" 2018-03-13 06:00:58
- "연봉 낮아도 삶의 질" 이직 시장 키워드는 워라밸 2018-03-08 06:00:40
- 국회, 초저출산 대응 일과 생활 혁신 포럼 발족 2018-03-05 11:09:18
- 외자사만 연말 휴가? 국내 제약사도 워라밸 확대 2017-12-18 05: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