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의대생, 전공책을 접고 신문사에 다녀오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교육국 송승엽 부국장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23 06:00:50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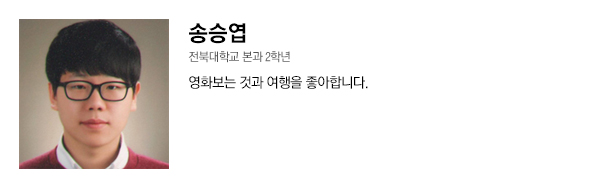
기나긴 20주의 1학기가 끝이 났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울리는 알람과 사투를 벌일 필요도 없고 눈이 감기는 1교시 수업을 커피로 버틸 필요도 없어졌다.
며칠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잠을 자고 싶어서 매일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마저 깨있는 시간 동안에도 핸드폰만 뒤적거릴 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방학이 무료함만을 남긴 채 하루하루 흘러가던 중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던 작년 겨울방학이 떠올랐다.
학교 선배가 신문사에서 2주간 인턴 할 기회가 있다며 소개해줄 때, 고민 뒤에 "네" 라고 대답했다. 단순히 방학 동안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고는 출근 첫날부터 후회를 했다. 등교를 하듯이 아침 8시에는 집을 나와 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기자가 꿈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사서 고생하는지 매일 후회하며 버스에 올라타 꾸벅꾸벅 졸았다.
첫날 인턴프로그램 담당 기자님께서 인턴들에게 기사를 하나씩 쓰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에 대해 쓸까 고민하다가 당시 나름 핫이슈였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다루기로 했다. 기사를 쓰려니 아는 것이 없어 며칠을 검색하고 공부하는 데에만 몰두한 기억이 난다. 기사를 쓰는 틈틈이 기자님들과 외근을 나가 병원홍보실에 가보기도 하고, 협회에 가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작년 겨울방학의 그 2주는 나에게 많은걸 보고 느끼게 해주었던 기간이었다. 물론 고작 한편 쓴 기사는 지금 봐도 못 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머릿속에 해부학과 생리학뿐이던 나에게 기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현 의료사회를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
내 주위 의대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재능과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들 폐쇄적인 의과대학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재능을 숨기며 그저 모두가 걷는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한다. 마치 그 길을 벗어나면 틀리고 안 되는 것 마냥. 나도 작년까지는 그런 틀에 박힌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딱히 다른 쪽에 재능을 가지지 않아서 만은 아니었다. 주위사람이 모두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병원에서 일하는데 혼자 다른 방향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턴체험 2주를 하고 생각이 바뀌었다.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의학을 배운 사람은 많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힘쓰는 것도 좋을 것 같으며, 법을 공부해 의료전문 변호사, 검사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다른 의학도들도 잠시 교과서를 덮고 주위세상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공부와 실습으로 바쁜 본과생에게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외활동을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쉽지 않다.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이 타과와는 크게 다른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대협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의대협이 됐으면 한다. 현재는 인턴십이 언론계, 법무계 그리고 의사협회 총 세 곳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점점 다양한 분야와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의대생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기사
- |수첩| '내 잘못'은 없는 간호계 직역 갈등 2019-07-18 06:00:50
- |칼럼|최저임금 인상과 문재인 케어 2019-07-17 06:00:50
- |수첩|의협 단식투쟁 이후 플랜이 필요하다 2019-07-15 06:00:50
- |칼럼|중환자실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로 살아가기 2019-07-15 06:00:50
- |수첩|의료계, 하인리히 법칙을 찾아서 2019-07-11 06: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