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신세한톡|문제에 무감각한 수직적 조직문화
배지혜 Medical Mavericks 홍보이사(충북의대 예과 2학년)

배지혜
기사입력: 2019-10-23 10:41:21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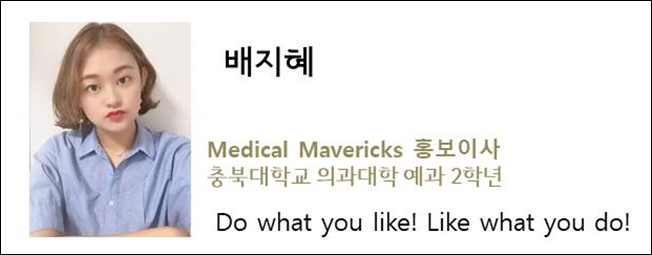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의사 하냐…"
지난해 지하철에 앉아 집에 가던 도중 문득 옆의 대화가 들렸다. 작년 7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응급실 폭행 문제가 다시 한 번 이슈화됐다. 당시 예과 1학년이었던 나는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네'라는 생각만 하고 넘겨버렸다.
사실 병원 내 폭행은 이미 이전부터 비일비재했던 이슈이다. 이는 비단 환자와 의사 사이만의 일이 아니다.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있는 일이며, 심지어 수술실 내에서의 폭언 및 폭행 녹화 영상이 올라온 적도 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폭행이 훨씬 다양한 형태로 의료계 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너무나 관대한 처벌, 제도적 문제,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전공의 특별법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으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 등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무뎌진다.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조직 내에서의 문제는 계속 가려진다.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겸직 교직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 현황(2017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폭행 등으로 징계 받은 교수와 전공의 313명 중 81.1%가 단지 경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기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에 달한다.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도 합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뉴욕대 심리학자 존 조스트 교수에 따르면 어떤 큰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때, 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거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등등 그걸 처음부터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추상적이고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많은 능력과 노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문제를 가급적 작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심리학 칼럼니스트 박진영 씨의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내의 고질적인 문제가 떠올랐다. 병원, 그리고 의과대학 내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잘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데 굳이 나서지 말자고, 그리고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고 문제를 쉬쉬한다.
특히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일어난 일은 더더욱 그렇다. 구조적인 문제를 숨길수록, 그 심각성은 과소평가 되고 비슷한 문제가 꾸준히 일어나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감정이 무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바보같이 잊어버린 경험들이 떠올랐다.
심지어 가끔은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마저도 헷갈리고 내 주관마저 흔들릴 때도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자 눈치 보느라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목소리가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마음먹었고, 동시에 좀 더 내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살려고 노력 중이다.
물론 이런 수직적이고 좁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무감각은 너무 무섭지 않은가?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그리고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더 큰 인식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의견 또한 누군가에게 피력이 되는 사회, 그리고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를 꿈꾸며.

오피니언 기사
- 병원·학회 성공적인 PR 어떻게 할까?(3편) 2019-10-21 08:21:33
- 보건의료 달인도 두손 두발 든 간호인력난 2019-10-21 05:45:50
-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뿐…식약처에 필요한 건? 2019-10-17 05:45:00
- |신세한톡|쓸데 없는 '딴짓'을 위하여 2019-10-14 10:54:46
- 병원·학회 성공적인 PR 어떻게 할까?(2편) 2019-10-14 08:3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