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사무장병원 덫에 걸려 다 잃은 의사
발행날짜: 2011-07-18 06:39:19
-
가
-
우리 동네 의사③오성일 서울실버요양병원장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다시 잘 끼우려고 해도 자꾸만 어긋났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의사로 꼽히는 오성일 원장(49·인천 소재 서울실버요양병원장)의 한숨은 생각보다 깊었다.
불행의 시작은 지난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6년 11월, 오성일 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산과 진료를 접고 요양병원장으로 새 출발했다.
당시 대한임상암예방학회 기획이사, 대한노인의학회 기획이사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오 원장은 새로운 개념의 요양병원을 꿈꿨다.
그러나 그가 택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
'나만 잘 처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시작은 오 원장의 일상생활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의 짙은 그림자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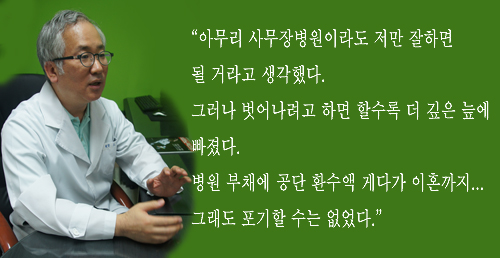
그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대가로 6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졌다.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액만도 약 28억원. 여기에 25억원 상당의 병원 부채에다 체불된 직원 임금, 각종 업체 미지급금까지 그를 짓눌렀다.
사무장병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도 봤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앞으로 긴 소송에 대비하려면 병원을 계속해야겠다 싶어 또 다른 요양병원을 내고 재기를 꿈꿨지만 이번에는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그 사이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있었다.
"난 정말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부인도 이별을 고했다. 아들의 양육권 또한 당연히 넘어갔다.
"엄청난 부채와 잇단 소송 여기에 이혼까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연거푸 벌어졌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월급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차압됐고, 병원 옆 건물 오피스텔을 전세로 겨우 얻었다.
또한 그는 거듭된 시련을 견디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잠조차 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기도 덕분일까.
얼마 전 미국 교포를 위한 요양병원 설립 제안을 받았다. 평소 백세인클럽 부총재로 활발히 활동한 덕분이었다.
"아직 검토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재기를 꿈꾸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두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소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는 세 번째 기적을 꿈꾸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의사로 꼽히는 오성일 원장(49·인천 소재 서울실버요양병원장)의 한숨은 생각보다 깊었다.
불행의 시작은 지난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6년 11월, 오성일 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산과 진료를 접고 요양병원장으로 새 출발했다.
당시 대한임상암예방학회 기획이사, 대한노인의학회 기획이사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오 원장은 새로운 개념의 요양병원을 꿈꿨다.
그러나 그가 택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
'나만 잘 처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시작은 오 원장의 일상생활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의 짙은 그림자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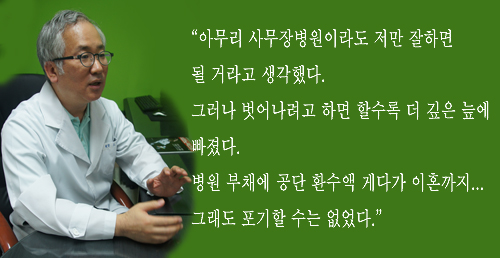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액만도 약 28억원. 여기에 25억원 상당의 병원 부채에다 체불된 직원 임금, 각종 업체 미지급금까지 그를 짓눌렀다.
사무장병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도 봤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앞으로 긴 소송에 대비하려면 병원을 계속해야겠다 싶어 또 다른 요양병원을 내고 재기를 꿈꿨지만 이번에는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그 사이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있었다.
"난 정말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부인도 이별을 고했다. 아들의 양육권 또한 당연히 넘어갔다.
"엄청난 부채와 잇단 소송 여기에 이혼까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연거푸 벌어졌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월급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차압됐고, 병원 옆 건물 오피스텔을 전세로 겨우 얻었다.
또한 그는 거듭된 시련을 견디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잠조차 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 교포를 위한 요양병원 설립 제안을 받았다. 평소 백세인클럽 부총재로 활발히 활동한 덕분이었다.
"아직 검토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재기를 꿈꾸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두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소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는 세 번째 기적을 꿈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