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4년을 준비한 간호사의 삶…3년간의 태움에 잿더미"
발행날짜: 2016-01-13 05:05:59
-
가
-
특별기획-태움끊어지지 않는 악습…"중이 떠날 수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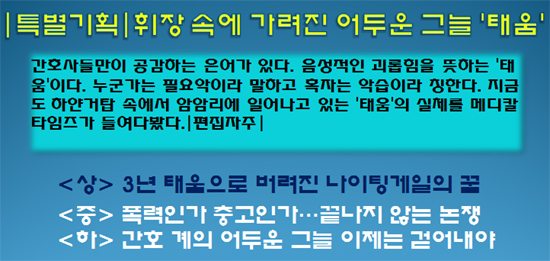
태우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단어일지도 모르겠다.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는, 하지만 간호사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태움'. 하얀거탑에 가려져 알음알음 풍문으로만 전해내려 오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간호계의 은어다.
혹자는 한번 걸리면 활활 타오를 때 까지 타다가 울며 병원을 나서기에 태움이라고 하고 누구는 비꼬다라는 뜻의 영단어 'Burn'이 태움으로 의역된 것이라는 얘기도 전한다.
그 뜻이 무엇이건간에 분명한 것은 간호대학을 나와 종합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간호사 어느 누구도 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간호사 문화에 깊숙히 박혀 있지만 누구도 빼내지 못하고 있는 태움. 그렇기에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어디 나왔어? 첫 마디에 불붙은 태움…비극의 전주곡
서울의 한 간호학과를 졸업한 A씨. 간호사 면허를 받아들고 내딛은 그의 첫 발은 더할 나위가 없었다.

간호사 커뮤니티에서 그 병원에 태움이 심하다는 소문이 종종 돌았지만 그는 자신이 있었다. 자신이 묵묵히 역할을 해나가다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프리셉터를 만나면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5년차 프리셉터의 첫 마디는 반말 섞인 "신규, 어디 나왔다고?"였다.
그 다음날부터 그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그 말을 들어야 했다. 그 프리셉터는 마주칠때 마다 "어디 나왔다고?"를 물었고 심지어 동기들에게도 "쟤 어디 나왔다고 했지?"라고 묻곤 했다.
그래도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워낙 자교 출신 비율이 높은 병원이었던 만큼 이 정도 설움은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만 해도 '태움'이라는 자각도 없었다.
"당연히 텃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번씩 묻는 질문에 웃으며 답했겠죠. 그게 시작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다. 자교 출신이 아닌 만큼 빨리 자리를 잡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욕이 넘쳤지만 프리셉터는 물론 선배 간호사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렇기에 그는 더욱 조바심이 났고 결국 한마디를 건넸다.
"선생님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B대 출신들 못지 않게 잘 해내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실수였다. 그 말이 그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지 당시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 다음날부터 그는 자신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선배에게 항의한 개념없는 신규 간호사가 돼 있었다.
3년을 타면서 버틴 간호사의 삶 신규 앞에 무너지다
얼굴도 모르는 간호사들까지 "쟤가 걔야?"라며 수근대기 시작했고 동기들 또한 슬슬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이트(야간) 근무였을 때였어요. 스테이션에 앉아 차팅을 하고 있는데 올드(10년차 이상의 경력 간호사) 한분이 오시더니 '어머. 요즘 신규는 앉아서 일하나봐. 당찬 신규 들어왔다더니 그 분이신가보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생각이 든 시점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근무표 또한 말도 안 되게 꼬여갔다. 5일 연속 나이트를 뛰는 것은 약과였다. 나이트 근무를 끝낸 후 오후 2시까지 잡혀 있다가 다시 나이트 근무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정해진 오프(휴일)도 못챙기는 날이 많아졌다. 아무도 자신의 업무를 백업해주지 않았고 업무 조정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태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는 소리없이 점점 타들어 가고 있었다.
"하루는 나이트를 끝내고 오프(휴일)라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린넨 갯수가 안맞는다고 찾아내라는 거에요. 결국 병원으로 돌아가 찾으러 다녔는데 데이조(오전근무)의 문제였던 거에요. 근데 그걸 저한테 물품 관리 소홀로 징계를 주더군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태움에 정면으로 맞섰다. 적어도 그들이 바라는대로 해주지는 않겠다는 오기였다. 그렇게 그는 3년의 지옥같은 시간을 버텨갔다.
회식을 하면서 그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것도, 명절 선물이 중간에서 없어진 것도, 챠트를 책상 위에 던지고 가는 것도 그는 참아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의지를 무너트린 것은 후배 간호사들 앞에서 쏟아진 모욕이었다. 시도 때도 없는 태우기는 그의 몸과 마음을 한없이 부수고 있었다.
"신규 간호사가 저한테 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옆의 선생님이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렇게 하면 잘릴걸?'하면서 비꼬는거에요. 더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그는 꿈의 직장에 들어간지 3년만에 병원을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3년간의 악몽은 병원문을 나서는 그날까지 이어졌다.
"사직서를 냈는데 이미 그달 듀티(근무표)가 나왔으니 그건 채우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례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러는지… 정말 타고 타다 잿더미가 된 심정 아무도 모르겠죠."
관련기사
- 병원 여성 근로자 열명 중 두명 '유·사산 경험' 2014-10-10 11:47:16
- "간호사 태움은 피해망상"vs"가해자의 억지 논리일 뿐" 2016-01-14 05:05:59
- 전공의에 가려졌던 간호사 태움 "경종은 이미 울렸다" 2016-01-15 05: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