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응급실에서 느낀 '내가 생각하는 의사란'
박성우
발행날짜: 2016-06-10 05:00:00
-
가
-
인턴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박성우의 '인턴노트'[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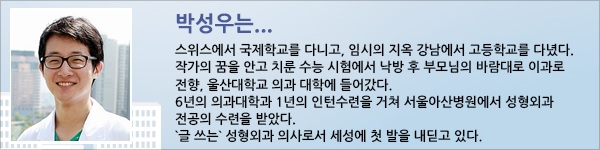
강릉 병원 일정은 응급실이었다. 보령 응급실과 강릉 응급실은 차이가 있다. 홀로 지켜야 했던 보령과 달리 강릉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교수님도 함께였다. 그만큼 규모도 크고 환자도 많았다.
응급실은 규모가 클수록 수월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응급실만큼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다른 과와의 접촉이 많은 과도 없다. 이곳에 오는 환자들은 응급실 수준에서 처치가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입원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해당과에 연락해서 환자를 인계해야 한다.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있어 검사했더니 충수돌기염, 소위 맹장염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응급실에서 수술하지 못한다. 외과 선생님에게 연락해 환자가 수술받을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한다.
간혹 응급실에서 수술이 가능한 줄 알고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지만 생명이 위급하여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혹은 다른 병원에서 연락 없이 트랜스퍼 오는 모든 경우 응급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들에게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외상의 경우 중증도와 처치의 필요성에 따라 정형외과, 성형외과 그리고 안과 선생님에게 인수인계한다.
한 명의 환자를 인수인계하거나 보고할 때 '노티한다'고 한다. 영어 '노티파이(notify)' 즉 '알린다'는 의미다. 응급실에서는 어떤 상태의 환자가 내원하였으니 해당 과에서 이어 받아 진료해야 할 때 보고의 개념처럼 쓰인다. 의료진은 앞 두 글자를 따서 '노티'라고 부른다.
"인턴 샘, 이 환자 랩 결과 다 나왔으니까 풀무에 노티하세요."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인턴 선생님, 이 환자 혈액 검사 결과 모두 나왔으니 호흡기내과 선생님에게 환자 인계하세요." 선생님을 '샘'이라고 줄여 말하는 것이 병원에 정착되었다. 서울과 강릉, 보령에서도 '샘'이라고 했다.
'랩'은 '진단검사의학(laboratory test)' 결과로 앞의 'lab'을 따서 부르는데 쉽게 말해 '혈액 검사 결과'이다. '풀무'는 '호흡기내과(Pulmonoloy)'의 앞 두 글자를 따서 부르는 것이다. 자매품으로 내분비내과를 줄여서 '엔도', 혈액내과를 줄여서 '헤마' 종양내과를 줄여서 '옹코'라고도 부른다.
고매하게 응급실 부장이라고 불렸던 보령의 응급실과 달리 강릉 응급실은 전담 인턴만 6명이었다. 환자도 많아 빠른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우수한 응급실 인턴의 자질이었다. 그렇지만 '노티' 과정은 응급실 인턴에게 고역일 수밖에 없다.
느긋하게 앉아 진료실 안에서 환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시장바닥 같은 응급실에서 한 번에 3~4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환자들의 병력이 헷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히 물어볼 시간도 적다. 느긋하게 진료실에서 환자보듯 일했다가는 영영 의사를 보지 못하고 기다리는 환자의 수만 늘어갈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아내고 차트를 정리하고 기본적인 처치 후 '노티'를 한다 해도 부족한 정보는 늘 있다. 쉽게 누락하는 항목으로 가족력이나 음주, 흡연력 등이 있다. 문진상 필요한 정보의 중요도는 환자와 의사간 간극에 있다. 환자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누락하는 정보들이 진단에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
응급실에서 오래 대기해본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는 알 것이다. 의사들은 여러 명 진료를 하는데도 정작 본인만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어느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불분명해 우리 표현으로는 '환자가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여러 증상이나 질환이 겹쳐 있는 경우 정작 입원을 해야 하는데 어느 과로 입원할지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다.
각 과의 주치의들 입장에서는 응급실 환자가 추가로 입원하게 되면 그만큼 할 일이 늘어나게 되니 뚜렷하지 않은 경우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경우에는 노티를 해도 이런 저런 트집을 잡고 결국 자신의 과에서 볼 환자가 아니라며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물어볼 것이 없으면 "환자 집이 어딘지 물어봐요." "환자가 여기에 꼭 입원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요." "보호자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알아와요" 하고는 어떻게든 환자를 보지 않으려고 튕길 때도 있다.
응급실 인턴으로 난처하기 짝이 없는 이 상황은 배구에서 공을 서로에게 토스하듯이 환자를 다른 과에 떠넘기는 것과 같다. '응급실은 각 과로 토스만 잘해도 훌륭한 응급실이다'라는 응급의학과 교수님의 말씀이 와 닿는다.
주치의들이 서로 토스하는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나 전공의 선생님이 나서면 교통정리가 쉽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응급실 인턴이 중간 상황에 고착되면 단지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끝까지 발뺌하는 경우를 겪었다.
의대 시절 지도 교수님은 훌륭한 의사는 본받아야 하지만 안 좋은 점은 비판적으로 잘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절대로 저런 의사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경우를 겪는다.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인턴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푸념이 등장한다. 이것도 어쩌면 수련의 일부라는 생각조차 들었다.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하고 해당과 당직 의사에게 노티했음에도 2시간이 지나도 환자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환자와 보호자는 기다리다 지쳐 결국 초진을 보았던 인턴에게 불만을 토로하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그럴 때면 다시 당직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오시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
"금방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어디 인턴이 감히 재촉하냐"는 일갈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리는 선생님들도 있다. 그런 경우를 당하면 다시는 재촉 전화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환자 입장에 서면 내가 한 번 더 싫은 소리 듣는 것이 낫겠다며 노티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인턴의 애환이 아닐까.
"그렇게 환자 보기 싫으면 환자 안 보는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같은데 가지. 왜 환자 보는 내과에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응급실 짝턴은 전화너머 한 소리를 듣고는 의기소침해했다.
종종 의사인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다. 의사 중에서도 환자 보기 좋아하는 의사와 환자 보기 싫어하는 의사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늘 환자를 접하는 외과와 내과가 있고 직접 환자를 대하지 않는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와 같은 다양한 분과에 다양한 의사들이 있지 않을까.
의사로서의 책임감은 잃지 말아야 한다. 요즘같이 의사 소견이 존중 받지 못하고 의료 소송이 빈번한 세상에 있더라도 기본적인 책임감은 어느 의사에게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여느 선배 의사 말처럼 환자나 보호자에게 잘못 걸려 의료소송을 겪고 나면 자연스레 몸을 사리게 될지도 모른다. 아직은 새파랗게 젊은 의사여서일까. 선배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존경스럽기만 하다.
무엇이든 기꺼이 한다는 태도는 어렵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밤을 새가며 확인의 확인을 거듭하고 수술하는 외과의의 모습. 환자가 걱정되어 퇴근하지 않고 환자 옆을 지키는 내과의의 모습. 피곤함 속에서도 책임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앞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며 '나중에 크면 이런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선배 의사가 되면 인턴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서 잘 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39]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지방파견 근무, 강릉…사소한 행복 2016-06-03 05:00:45
- 극과 극을 달리는 성형외과 2016-05-27 11:5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