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지방 파견의 끝…'머리만 큰 말턴'
박성우
발행날짜: 2016-07-05 05:00:23
-
가
-
인턴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박성우의 '인턴노트'[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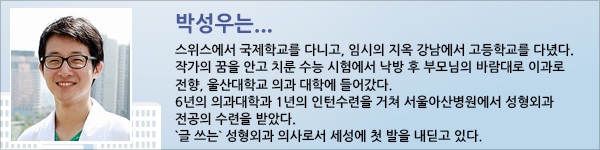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때는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의학은 증례가 필수적인 경험의 학문이다. 다양한 증례를 수없이 마주치며 치료 방법을 강구하고 적용하다 보면 의학의 발전과도 연결된다.
전쟁은 증례의 홍수와도 같다. 창상, 총상, 감염, 화상 등 다양한 증례들이 있다. 그리고 무겁고 어두운 과거이지만 반인류적인 인체 실험들이 현대 의학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응급실 역시 다양한 증례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응급실만큼 새내기 의사가 의료 전반에 대해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곳도 없다. 응급실 환자는 선별되어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과의 환자를 볼 수 있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환자를 어떻게 살려내는가.
책으로만 익히던 처치 과정을 보고 수행하다 보면 또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한다. 그 과정을 즐겁게 여긴다면 응급실은 '재미있는 인턴 일정'이 된다. 그러나 아픔과 기다림에 힘겨워 온 환자들의 숱한 불평을 상대해야 한다.
"응급실에 온 환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응급한 환자라고 생각해. 의사들이 분류하는 중증도와 환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는 달라."
교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옆에 사고 난 환자가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응급실까지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간단한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은 걸린다는 사실을 모른다. 위급한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필요한 처치를 우선시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대기시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어렵다.
응급실에 왔는데 몇 시간이고 계속 기다려야 할 때 환자와 보호자 모두 답답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실에 오면 병실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마주친다.
의사는 / 약사보다 약을 잘 알고 써야 하며 / 간호사보다 환자 파악을 잘해
야 하고 / 임상병리사보다 피를 잘 뽑아야 하고 / 수술 전문 간호사보다 수술
을 잘해야 하고 / 병원 경비보다 잠을 적게 자고 / 청소부보다 더러운 걸 많
이 보고 만지며 / 비서보다 잡일을 잘하고 /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보다
시급이 적으면서 / 가끔은 환자보다 내가 더 아프기도 한데 / 그러면서도 친
절하게 웃어야 한다. – 어느 인턴의 시
하지만 응급실 일이 힘들고 버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열이 펄펄 나고 아픈데도 "아빠 말 잘 들으니까 주사 맞고 빨리 나을게요"라면서 의젓하게 자기 팔을 내준 5살 아이도 있었다. 오히려 내가 '한 번에 딱 잘 뽑혀라' 하는 생각으로 겁먹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이의 팔에 바늘을 찔러야 했다. 주사 맞을 때는 아프다고 울면서도 다 맞고 나니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괜스레 웃음이 나기도 한다.
가끔은 난처한 경우도 있다.
"선생님요. 우리 할매가 저번 달에 다리가 안 좋아서 동사무소에 가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싸게 안 됩니까?"
"할아버지, 병원비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원무과에 가셔서 더 자세히 물어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병원비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니깐 할인이 먼저 되냐 이 말이오. 우리 할매 MRI 검사해야 한다면서."
"네, 할아버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지원금은 먼저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병원비 내시고 나중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할배요. 선생님 바쁘다잖소. 가만히 좀 있으소."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들은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침대에 누워계시곤 했다. 검사를 위해 금식 중일 때면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고는 "나 목마른데 물 좀 마시면 안 되겠소" 하고 애처롭게 쳐다보신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직 검사가 다 안 끝나서 안 돼요"라고 하면 "에이, 매정하게시리 아
픈 사람 병원에 왔는데 물도 못 마시게 해" 하고는 토라지신다.
"인턴 선생, 내가 나름 4년 동안 응급실에서 구르면서 느낀 건데, 환자 CPR할 때 의사가 '꼭 살려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환자들이 살아나고 의사가 먼저 포기하면 환자들이 못 버티더라고. 그래서 CPR할 때는 꼭 살려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프로 축구 선수 신영록이 그라운드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왔을 때 직접 심폐 소생술을 해서 살려냈다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난 9개월 동안 내가, 그리고 동기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환자들은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길 가던 임신부를 피하다가 차가 전복되면서 머리가 다 으스러져 내원했던 29세의 젊은 장정, 급성 담낭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돼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던 45세의 아저씨까지.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하는 동안 가려진 커튼 밖으로는 가족의 애탄 기다림이 느껴진다. 울음을 참고는 의료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다.
"○○야,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힘내자." "자. 환자 살아날 수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CPR하세요."
흔히 응급실을 생사가 갈리는 공간이라고 한다.
'삐이이' 하는 소리와 함께 일자로 움직임 없던 심전도를 보이던 아저씨는 선생님 말대로 10분 동안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니 다시 '삑 삑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돌아왔다. 의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순간이다. 짧은 시간 삶의 모든 것이 응축되는 응급실이다.
밖에 나가면 기껏해야 20대 중반의 우리들이기에 견디기 힘든 순간도 많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맞이하는 강릉은 아름다웠다. 야간 근무를 끝내고 선생님들과 함께 먹는 '모닝 삼겹'은 모두가 반했던 메뉴다. 반짝이는 동해 바다를 마주하고 물회와 어죽으로 허기를 달랠 때면 그 맛 또한 일품이었다.
다시금 한 달이 바뀌고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일 년의 인턴 일정 중 지방 파견 근무는 이렇게 끝났다. 어느덧 우리는 '말턴'이라 불리고 있었다. 이미 술기는 술기대로 익었고 일도 익숙해져 '머리만 큰' 말턴 말이다.
[42]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하루 환자 수 216명, 추석을 하얗게 지새웠어 2016-06-28 05:00:50
- 노 임팩트 닥터(No Impact Doctor) 2016-06-14 05: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