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손으로 직접 만져본 암의 촉감
박성우
발행날짜: 2016-07-18 05:00:45
-
가
-
인턴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박성우의 '인턴노트'[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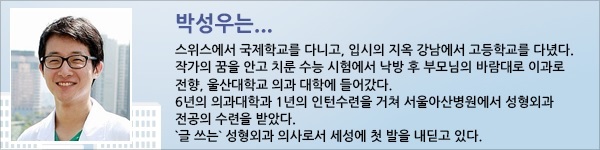
의대 시절, 외과 교수님은 서젼의 기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며 CT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에게 "자네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치료를 하고 싶은가"라고 질문했다.
몇몇 학생들의 대답을 듣던 교수님은 "모름지기 서젼이라면 이 CT를 보고 저기 보이는 암 덩어리를 깨끗하게 떼어내고 싶다는 욕구가 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답 중에는 수술로 절제하겠다고 대답한 학생도 있었고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를 하겠다는 내과적 대답을 했던 학생도 있었다. 미래 의사의 성향을 볼 수 있는 직관적인 질문이었다.
10월 일정은 인턴들 사이에서 섹시하다는 평이 자자한 '일반 외과'였다.
본원은 큰 규모 때문에 일반 외과라 해도 여러 분과로 나뉜다. 같은 일반 외과 인턴임에도 도는 분과의 특성이 판이하고 전담하는 일도 다르다.
일반외과 인턴은 총 18명. 그중에는 일반 병동 일을 하는 병동 인턴도 있고 중환자실 인턴도 있다. 수술을 전담하는 수술장 인턴도 있다. 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간담도췌외과, 간이식외과, 신장이식외과, 혈관외과, 내분비외과, 유방외과, 소아외과 등 수많은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외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수술은 암 수술이다.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이 수많은 암 환자들이 외과 의사의 손을 거쳐 생명을 이어갔다.
10월 첫 2주는 대장항문외과 인턴이었고 나머지 2주는 외과 병동 인턴이었다. 대장항문외과는 대장암, 직장암 수술이 매일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외에도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가족성샘종폴립증 등 희귀 환자들의 수술도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수술의 근본적인 접근은 병든 부위의 장을 잘라내고 남겨진 부분을 잇거나 몸 밖으로 장루를 만드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의사들은 그렇게 피를 보고 시체를 보면서도 어떻게 무덤덤하냐고,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접하면 접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적응할 수 있다. 의사 역시 그런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적응해가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암에 대한 무덤덤함도 마찬가지다. 여러 매체에서 암에 대한 경고와 함께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진단'보다 '선고'라는 단어를 택한다.
암 선고는 환자 본인에게나 보호자들에게나 큰 충격과 절망을 안긴다. 때로 인생에 대한 성찰과 삶의 의지를 일구어 낼 때도 많다.
대장항문외과에 입원해 있는 100여 명의 환자 중 90여 명이 대장암, 직장암 환자였다. 외과 교수님의 진료실에는 하루에도 50여 명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암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
수술실 역시 하루에도 대장암 수술이 10여 건씩 진행되고 있었다. 외과 인턴으로 마주치는 환자들, 스크럽 들어가는 수술들은 모두 암과 관련되었다.
종합병원 외과 선생님들에게 암은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사건이며 오롯이 짊어지는 짐 그 자체가 '암'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환자분 수술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입니다."
"환자분 오늘 어디 수술 받으러 오셨나요?"
"대장 수술 받으러 왔습니다."
"네. 환자분 등록번호 ××××× ×××입니까?"
"네, 맞습니다."
수술 시작 전 수술 부위를 묻는 질문에 환자들은 대개 "배 수술 받으러 왔습니다." 또는 "대장 수술이요"라고 답했다. 언뜻 보면 당연한 대답일지 모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환자들이 '암'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말하기 싫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종의 금기어였다.
이는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들에게 이전에 수술받은 이력이 있는지 질문하면 간 수술이라든지 복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면 암 수술인 경우가 많았다.
의사에게 암이란 하나의 질환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꺼내기 싫은 아픈 상처 혹은 큰 짐이었다. '질환'이란 의사에게는 학문으로 접한 객관적 대상이지만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주관적인 대상이기에 생기는 괴리일 것이다.
그래서 나이 지긋하신 교수님들은 종종 말씀하신다. "의사도 좀 아파봐야 환자의 마음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어 있어."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 자체로 강력해서 실체에 대해서는 종종 베일에 가려 있는 것 같다. 암이냐 혹은 암이 아니냐가 중요했다. 암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암이 어떻게 생기느냐, 암에 걸리면 죽느냐, 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매스컴에서 자주 접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과 답은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는다.
나 역시 의대 시절 암은 어떻게 진단되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다. 암은 과연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일지, 암에서 고약한 냄새 같은 것은 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던 시기도 있었다.
"외과는 손으로 병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과의 자부심을 피력하던 선생님이 있었다. 수술 중 환자의 몸에서 절제해낸 암을 병리 검체로 검사를 맡기기 전 직접 관찰하는 순간이 있다. 암은 특성상 전이를 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절제할 때도 암 덩어리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암 주위 조직을 안전한 범위까지 포함하여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암으로부터 적절한 범위까지 함께 절제가 잘 되었는지 CT나 MRI로 진단한 소견이 실제 육안적 소견과 일치하는지 과정을 거친다. 그럴 때면 암 덩어리를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
다른 정상 조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매끈한 대장의 질감과 다르게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한 궤양처럼 보일 때도 있다. 손으로 만져보면 무척 단단하다.
우리 몸의 세포는 생성과 사멸의 주기를 겪으면서 죽은 세포는 탈락하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하지만 암은 그 정상 주기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과한 증식을 보일 때가 많다. 얼기설기 불규칙하고 밀도 높게 뭉쳐있어 돌같이 딱딱하게 느껴지곤 한다.
외과 수술은 예정된 수술 계획에 앞서 손으로 직접 암을 확인한다. 대장항문외과 선생님들은 암이 실제 항문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정없이 환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
더 나아가 수술 도중에는 암이 이미 복강으로 전이되었거나 다른 장기에 들러붙어 있지는 않은지 손으로 만져보고 진단했다. CT나 MRI는 우리 몸 안을 촬영할 수 있는 일종의 사진 기술이다. 사진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듯 서젼의 눈으로 확인하는 소견과 검사 소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고해상도 CT라도 좁쌀만한 암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수술 중 서젼의 눈과 손이 중요한 이유이다.
외과 의사들의 삶의 질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최악이라고 평한다. 그럼에도 외과에 종사하는 수많은 서젼들에게 지원 이유를 물으면 "외과는 멋있으니까"라고 답한다. 시쳇말로 표현하면 "외과는 간지난다"고 하는 의미이다. 그것이 외과만의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모습이 아닐까.
[43]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지방 파견의 끝…'머리만 큰 말턴' 2016-07-05 05:00:23
- 하루 환자 수 216명, 추석을 하얗게 지새웠어 2016-06-28 05: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