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의사가 정인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최재호
발행날짜: 2021-01-18 05:45:50
-
가
-
최재호 차의전원 학생(본과 3학년)
Medical Mavericks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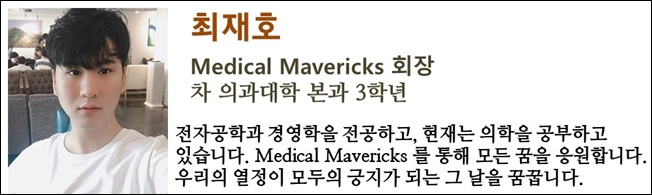
|차의전원 본과3학년 최재호| 의학을 공부하고 두 번째 해였나, PBL이라고 하는 수업의 주제로 처음 접했던 것 같다. PBL 수업은 여러 명이 한 조가 돼 교수님 입회하에 주어진 정보로 환자에게 질문을 하듯이 이야기하면 그에 맞추어 미리 준비돼 있는 환자 세팅을 통해서 그 질환을 맞추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수업이었다.
당시 엑스레이를 보고 부러진걸 아는 것은커녕 나트륨, 칼륨 정상수치조차 모르던 나에게 꽤나 혹독한 주제였지 싶다. 보호자에게 물었을 때에는 분명히 아이가 혼자 놀다가 어느 순간 쳐지기 시작했다고 했고, 어디 부딪힌 곳도 없다고 했다. 수차례 물어보자 잘 생각해보니 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돌고 돌아서 어찌저찌 다발성 골절과 SAH등을 동반한 것을 보고 아 넘어졌겠거니하고 결론을 내려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다. 당시 우리 조의 튜터 교수님이 해당 테마를 직접 갖고 오신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었다. 모든 발표가 마치고 보통의 교수님들과 다르게 강단에 서셔서 마이크를 잡으셨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선생님들은 미래에 의사가 될 거고, 이 말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몰라주면 죽는거에요."
의문이 들었다. 교수님의 말씀이 와 닿지 않았다. 이내 약간은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환아 엑스레이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부러진 다리로 보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뼈 한가운데가 부러진 건 양쪽을 잡고 나뭇가지처럼 부러뜨릴 때나 부러지는거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외상이나 다친 적이 있는지 보호자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의심해봤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몰라서는 안됩니다. 그게 우리 직업이에요."
아, 너무 순진했구나.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
라는 이성적인 생각도 잠시, 아이를? 10개월, 15개월짜리 아이를?
처음으로 '문제'가 아닌 '생명'으로 와 닿는 순간이었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한다. 적어도, 그 부모에게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 무조건적으로 당연한 순리가 깨졌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이 환자는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해당할 수 있다. 성인군자부터 인간의 탈을 쓴 악마까지도. 환자를 신뢰하되, 알아야 하며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배포한 아동학대예방치료 지침서에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을 때에는 병력 청취 시, 여러 사람들을 따로 면접해 그들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보라는 내용이 있다. 마치 용의자를 조사할 때와 같지 않은가. 비 인륜적 범죄행위가 만연하기에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일부 내려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교과서와 지침서에 실린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을 접했다. 그대로였다. 다발성 골절, 망막 출혈, 아니 더 심했다.
더 나아가서 소아과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신고까지 했다고 한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알고도 살리지 못한 선생님들의 좌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인 나는 '아는 것'을 위해 공부한다. 하지만 정인이를 위해서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보다. 최근 기고한 칼럼에 '환자는 코로나로만 죽지 않는다.'고 적었다. 하지만, 달랐나보다. 사람은 병으로만 죽지 않는다. 또, 인간이라고 모두가 사람은 아니다. 살리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해서 공부한다.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교수님, 알아도 못 살리는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부정당하니 환멸감이 든다. 이 땅에 악마가 너무 많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바꿔나가야 한다.
관련기사
- 현실과의 괴리 2021-01-11 05:45:50
- 신축년 새해를 바라보며, do what you like! 2021-01-04 05:45:50
- 과거와 미래의 의료혁명 2020-12-28 05:45:50
- 코로나 블루, 짙은 파란색을 어떻게 연하게 만들 것인가 2020-12-21 05:4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