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방황하는 환자들…경증질환 분류 효과 물음표
|기획| 일부 대형병원 예약 되레 증가…개원가 "글쎄"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11-14 06:44:23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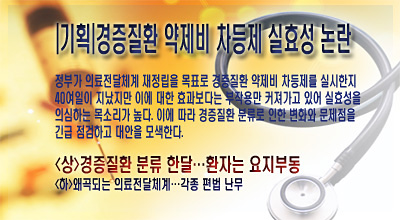
지방대병원과 종합병원 환자들이 이동하는 경향은 감지되고 있지만 1차 의료기관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오히려 환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증질환 분류 40일…일부 상급병원 환자 늘어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이사는 13일 "대학병원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지만 이러한 변화는 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인 A대학병원을 보면 경증질환 재분류가 실시된 10월 당뇨를 주상병으로 한 외래환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0% 가까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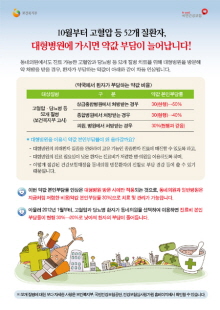
A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아직 경증질환 분류로 인한 환자 추이를 분석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솔직히 신규 환자가 늘고 있어 외부에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사실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약제비 등 비용에 둔감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개원가에서 관리가 가능한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2차병원 환자 감소…개원가는 '글쎄'
물론, 일부 대학병원은 당뇨 예약 환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약제비 차등제의 영향인지는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C대병원이 좋은 사례다. 이 병원은 최근 당뇨로 내원하는 환자가 소폭 줄었다. 하지만 경증질환 분류로 인한 환자 감소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최근 당뇨 적정성 평가 등으로 일부러 환자를 개원가로 내려보내고 있다"며 "예약 환자가 줄어든 것이 이 영향인지 경증질환 분류로 인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D대병원은 최근 한자리수에 머물던 예약 부도율이 두자리수로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환자 이탈에 따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견해다.
그렇다면 일선 1차 의료기관들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대다수 개원의들은 환자수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E내과의원 원장은 "솔직히 아직까지 경증질환 분류로 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경증 당뇨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내과 원장도 "1~2명이나 환자가 늘었는지 모르겠다"며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환자들의 선택이 열쇠…"U턴할 확률 높아"
이에 따라 의료계는 과연 일부 2차병원에서 이탈한 환자들이 과연 어느 곳에 자리를 잡는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만약 개원가로 흡수된다면 그나마 효과가 발휘되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제도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C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예약날짜에 오지 않은 환자들이 정말로 개원가로 흡수됐다면 약제비 차등제의 효과일수도 있다"며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을 찾지 않았다면 환자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실 전에 처방받은 약이 남아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도 많다"며 "조만간 다시 예약을 잡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당뇨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상당한 합병증이 수반되는 질환"이라며 "하루 빨리 제도의 실효성을 재평가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1주일…환자 요지부동 2011-10-11 06:3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