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전문의 따도 갈 곳 없는 후배들 너무 불쌍하다"
|기획| 선배의사가 바라본 의대생 삶 "우린 복받은 세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2-01-06 06:47:25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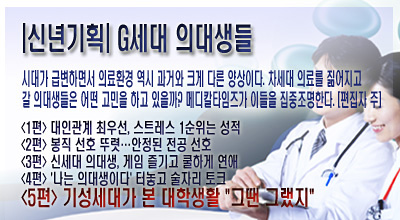
한 대학병원 교수의 말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의대생들. 기성세대 의사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다수 선배 의사들은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후배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학생이 학생의 특권 누리지 못하는 현실 안타깝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호경 교수. 그는 의료계가 점점 더 치열한 경쟁사회로 변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학생이 학생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
전 교수는 "그나마 우리때는 의대를 나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밥 먹고 사는데는 아무런 지정이 없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전문의를 따도 취직자리 알아보러 백방으로 뛰는 시대 아니냐"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중·고등학교때부터 치열하게 공부해 의대에 왔는데 성적에 얽매여 책상에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사실 의대때 성적은 잠시의 지표일 뿐 긴 의사 생활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성적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털어놓은데 대한 안타까움이다.
대다수 선배 의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또한 그들은 성적에 매여 자신이 꿈꿔왔던 목표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물론 학생의 본분은 공부지만 대학생으로 가지는 특권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마음껏 토론하고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사랑내과의원 김용범 원장도 "의대에 들어왔다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기생들을 돌아봐도 1등과 100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살려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전공과목은 복불복…하고 싶은 일을 해라"
특히 기성세대 의사들은 열악한 의료현실로 후배들이 자신이 꿈꿔왔던 의사상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내과에 이어 외과를 전공하고 싶다는 의대생들이 많은 설문결과에 대한 답변이다.
전호경 교수는 "학생들도 사실 하고 싶지만 해도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꿈구고 희망하는 의사의 모습이 있는데 현실에 가로막혀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삼성서울병원 심종섭 교육수련부장은 "의료환경이 너무 척박해지다보니 의대 동기생들도 동업자라는 인식보다는 경쟁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같은 의대를 나와도 성형외과 전공자랑 흉부외과 전공자랑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선배 의사들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며 자신의 선택을 믿고 따르라는 충고를 전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재·영(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진료과목의 흥망성쇄에 너무 연연해서는 올바른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것.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료과목의 편차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전호경 교수는 "우리 때만 해도 외과는 상위권 학생들만 올 수 있는 인기과였지만 불과 몇 십년 만에 기피과로 분류되지 않느냐"며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을 집으려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원장도 "내가 하고 싶은 전공과목이 있는데 다른 과목을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며 "과목을 바꿀 기회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본교에 남겠다며 다른 과목을 가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학생때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펴보고 그 선택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의대 생활은 고3 연장…성적·등록금 스트레스" 2012-01-02 05:3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