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환자·영업사원에게 친구같은 의사가 되라"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관계 모색 "신뢰의 에티켓 필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7-26 07:58:41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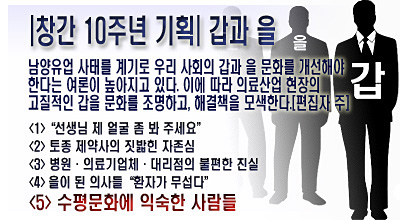
계약직으로 설정된 드라마 속 주인공 미스 김이 일으킨 '을의 반란'은 사실상 "누구든 갑이 될 수도, 을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세지와 같았다.
갑을 문화에 대한 비판이 공감을 얻으면서 관공서와 기업체도 계약서 양식을 수정하는 등 수평적 관계로의 모색이 한창이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의사와 환자, 의사와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에서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수평적 관계로의 '상생'을 추구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환자와 제약사 영업사원에 문턱 낮춘 병의원이 돼야 한다"
"환자와 의사는 같이 질병을 고민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동지와 같습니다."
이명진 원장(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아픔을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될 수 없다"면서 "의사를 갑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는 의사들의 잘못된 '에티켓'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사들에게는 지식공부와 술기에 덧붙여 '의사다움'이 필수적인데 그간 많은 의사들이 그게 뭔지를 잊고 살았다"면서 "늘 의사가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이 원장은 환자와 제약사 직원 모두에게 '친구'를 자처하고 있다.
먼저 인사하기, 눈을 마주하며 진료보기, 존대말을 쓰기, 환자들의 언어로 설명해주기, 진료 외의 부위는 가려주기 등 소소한 에티켓만 지켜도 신뢰를 통한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그는 "환자뿐 아니라 제약사 영업사원들도 마실 나오듯이 이곳을 방문해 고민을 털어놓고 간다"면서 "밥도 서로 똑같이 사고, 경조사도 챙겨주는 등 조카나 친구처럼 대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직원은 신약 소개와 약의 효능, 적응증, 부작용을 누구보다 먼저 알려주고 있어 보다 더 환자를 잘 치료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협력자의 관계라는 소리다.
그는 "에티켓을 통한 신뢰 형성이 결국 의사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나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체도 상생,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길
제약업계에서도 상생을 위한 모색이 한창이다. 경쟁 관계에 놓인 다국적사와 국내사가 손을 맞잡고 윈-윈하는 관계도 적지 않다.

국내 영업보다는 MSD를 통한 해외 진출을 노린 포석이지만 결과적으로 '아모잘탄'은 현재 수십개국에 수출이 됐거나 수출이 임박한 상태다.
업계는 이 사례를 국내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의료기기업체에서도 상생 모델이 나타나고 잇다.
한국GE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피제이전자는 10년 이상 협력를 유지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김영옥 피제이전자 대표는 "GE는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감이 있고, 파트너를 존중한다"면서 "어찌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사에게도 이런 신뢰를 줬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GE의 까다로운 품질이나 납기, 가격 경쟁력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면서 "GE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 교육이나 프로세스 개선 건의 등 지원도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제자리 걸음을 한 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납품액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아저씨, 제대로 진료한 거야?" 당돌해진 을 2013-07-25 06: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