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전공의 감축이요? 대체인력 방안부터 내놓으시죠"
수련병원 의사 추가채용 '나몰라라'…전공의들 불안감 확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0-31 06:00:09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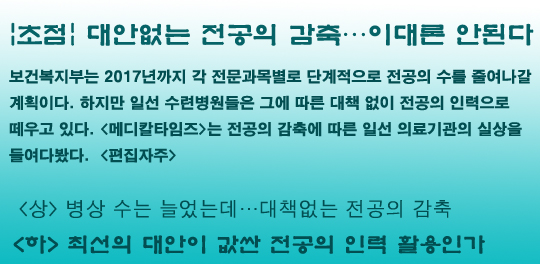
숨돌릴 틈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뒷골이 당긴다. 충혈된 눈은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
하지만 정작 김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지금도 너무 힘들다. 밥도 잠도 거르고 일하다 보면 집중력은 떨어지고 맥이 풀리는데 환자는 계속 밀려온다. 숨이 턱턱 막힌다. 근데 더 힘이 빠지는 것은 이런 생활이 4년차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그는 얼마 전 2017년도까지 계속되는 전공의 감축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레지던트 4년차가 되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공의 수가 감소하면 계속 지금처럼 일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부쩍 긴축경영을 외치며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병원이 의료인력을 충원할리는 없고 결국 모든 업무는 전공의에게 쏟아질 게 뻔했다.
최근 병원신임위원회에서 각 전문과목별 학회 관계자는 물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모여 전공의 감축안을 통과시켰다. 기피과 전공의 수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각 학회도 고통 분담을 함께 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전공의 정원을 효율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전공의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하지만 당장 정해진 수로 병원을 지켜야 하는 전공의 입장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취지가 좋고 장기적으로 제도의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선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에겐 업무만 가중시키는 피하고 싶은 정책일 뿐이다.

지방 수련병원의 응급의학과 2년차 전공의 나정호(가명·31)는 1년차 없어 홀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내년이라도 후배 전공의가 들어오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버텨왔다. 전공의 감축 정책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2017년까지 전공의 수를 줄인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특히 지방의 수련환경이 낙후한 수련병원이 전공의 감축 우선 대상이 된다니 더욱 암담하다."
나씨는 지난해 전공의 정원을 한명도 받지 못했는데 전공의 수까지 줄인다면 후배 전공의를 받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전공의만 동네북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이 나오면 뭐하나 현실은 그대로인데…전공의 감축 효과는 관심없다.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 방안부터 세우고 얘기했으면 할 따름이다."
그에겐 전공의 감축 취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 충원만이 관심사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감축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은 각 수련병원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들의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병원이 전공의를 수련의 대상이 아닌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수련병원은 전공의 감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충원하고 제대로된 수련환경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대안없는 전공의 감축…"이대론 안 된다" 2014-10-30 12:10:57
- "전공의 감축도 버거운데 수련실태까지 공표한다니" 2014-10-24 11:5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