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이슈칼럼
성형외과 레지던트의 응급실 고충
우리가 몰랐던 성형외과의 세계…박성우의 '성형외과노트'[27]

박성우
기사입력: 2018-11-19 12:00:20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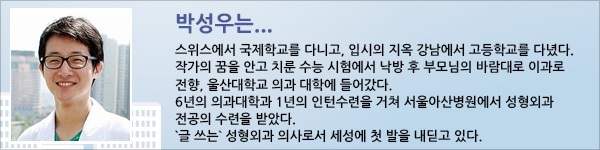
응급실 당직은 복불복이다. 인턴 때는 응급의학과 소속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상주하지만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 소속이 되면 달라진다.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관련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다.
콜이 오면 응급실로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고 오는 것이다. 본원 내과와 영상의학과의 경우 응급실 전담 인원이 배정되어 바로바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과는 늘 콜을 두고 말썽이다.
식사를 하다 가시가 목에 걸린 환자는 이비인후과에 연락이 간다.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되는 환자는 신경과에 연락이 취해진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검사 이후 외과에 연락이 갈 때도 있다.
그리고 안면 외상이라고 부르는, 즉 얼굴이 찢어져서 봉합해야 하거나 얼굴뼈에 골절이 있는 경우 성형외과에 콜이 온다.
응급실 콜은 정말 싫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레지던트들도 마찬가지여서 응급실을 개미지옥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정규로 하는 업무 외에 덤으로 주어지는 것 같았고, 때로는 그 일이 더 큰 부담을 주기도 했다. 얼굴이 찢어져서 봉합이 필요한 환자들은 어김없이 성형외과를 찾았는데 병동에서, 수술장에서, 혹은 당직실에서 불려 내려갈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마찰이 심했던 업무이기도 했다.
특히 수술이 많아서 자정이 될 때까지 업무가 끝나지 않는 날의 응급 실 당직은 형언할 수가 없다. 12시가 넘어 환자 동의서도 받았겠다 싶어 쉬려고 하면 응급실 콜이 야속하게 울린다.
“선생님, 6구역에 라세레이션 laceration* 환자 있어요.”
성형외과 병동은 응급실과 대각선으로 제일 먼 지점에 있기 때문에 가는 길만 10분은 넘게 걸린다. 1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300미터 넘는 커다란 병원 로비를 가로지르면 응급실에 도달한다. 인적 없는 로비에서 띄엄띄엄 보이는 것은 잠 못 이루는 환자나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당직의밖에 없다.
성형외과는 봉합하는 데 간단한 봉합세트만 필요해서 응급실로 직접 가야 했다. 안과나 이비인후과, 치과의 경우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기구나 검사대가 병동에 있어서 응급실로 환자가 와도 병동으로 이송해서 진료했지만 성형외과는 그 반대였다. 즉 환자가 당직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응급실로 환자를 찾아가는 경우였다.
도착하면 차분히 봉합을 해야 한다.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피가 나는 상처를 살피고 소독하고 봉합하는 과정은 당직의 혼자 한다. 누구라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친 상처들은 수술할 때의 봉합과는 다르다. 수술할 때의 봉합은 마취한 상태에서 날카로운 메스를 이용해 절개를 넣기 때문에 나중에 꿰매기도 용이하고 상처면도 깨끗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넘어져서 터지고 걸려서 뜯겨나간 상처들은 경계가 깨끗하지 않다. 그런데도 환자들은 누워서 부탁한다.
“선생님 흉터 안 나게 꿰매주세요.”
봉합하는 당직의의 입장도 당연히 그렇다. 이왕 봉합하는 거 흉터 안 나게 꿰매고 싶다. 하지만 이미 물러터진 상처에서 흉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상처는 무조건 생긴다.
아무리 훌륭한 서젼이 수술을 해도 봉합한 부위에 흉터는 남는 법이다. 흉터란 것이 개인차가 있고, 수술 시 흉터가 잘 안 보이는 주름이나 경계부에 절개선을 넣기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일 뿐이다.
콧등이나 이마, 뺨 등 얼굴에서 도드라지는 부위가 주로 부딪혀서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흉터 없이 완벽하게 꿰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상처 안에 박힌 흙이나 아스팔트 가루는 없는지 다시 확인 하고 기구 3~4개를 동시에 써가면서 봉합하고 드레싱한다.
협조가 잘 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경우는 속에서 열불이 난다. 인격수양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속에 참을 인忍자를 새기며 환자를 어르 고 달래야 한다.
제일 힘든 환자는 술을 마시고 다쳐서 오는 환자들이다.
그런 환자들은 새벽녘에 오기 때문에 자다가 콜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가 협조조차 안 되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선생님,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오늘따라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데 다 도망가고 저만 있잖아요… 근데 다 꿰매셨어요?”
술주정 환자들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술주정은 1년차 당직을 서면서 봤다. 같은 말 반복하기, 안 취했다고 하기, 신세 한탄하면서 울기, 집에 가겠다고 떼쓰기, 온 몸을 뒤틀면서 잠꼬대 하기 등.
응급의학과에 술 취한 환자들은 술이 깨면 연락 달라고 말을 해서 대부분은 협조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다.
봉합 환자가 있다고 새벽에 응급실에서 콜이 오면 환자가 술에 취했는지부터 물어보게 되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술주정 부리는 환자를 빨리 퇴실시키려고 어느 정도 잠잠하다 싶으면 환자 상태가 괜찮다며 성형외과 당직의한테 내려오라고 한다.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새벽 3시에 내려갔더니 술이 다 깼다는 환자가 화장실에 가서 자리에 없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환자는 술주정을 부리고, 봉합하려고 소독한 상처 부위를 더러운 손으로 계속 만진다. 봉합하지 못하면 응급실에 문자를 할 수밖에 없다.
“술주정 환자 보내고 싶어서 노티하지 말고 깨운 다음에 연락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당직 레지던트들은 주로 늦게 온다고 말썽이었는데, 새벽에 쓰러져 자다가 잠결에 콜을 받고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는 환자대로 응급실에서 빨리 처리 안 해준다고 난리지, 당직 의사는 잠 들어서 전화를 안 받지, 응급실의 고충도 많을 것이다.
되도록 응급실과 싸우지 않길 바라지만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는다. 아마도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응급실 열상 봉합을 하는 동안에는 영영 그렇지 않을까.
개미지옥 같은 응급실에서 해방된 날은 무척 행복하다. 동시에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잠 못 이루고 봉합했던 경험 덕에 이룬 것도 있었다. 응급실에서 수행하는 봉합 역시 수술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수술은 인내의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귀찮음과 피곤함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참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훗날 더 복잡한 수술에 어시스트로 참여했을 때도 같았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자세로 봉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정자세로 책을 읽듯 봉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얼굴의 곡면에 따라 턱에 있든 귀 뒤에 있든 상처가 있는 곳에는 몸을 접고 뒤틀어서라도 봉합할 수 있었다. 병원 말로는 하드코어하게 봉합에 익숙해진다고 한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응급실이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상처를 봉합하던 순간만은 잊지 못할 것 같다.
※본문에 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동의를 통해 그의 저서 '성형외과 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성형외과노트| 오더리의 딜레마 2018-11-02 08:38:37
- |성형외과노트| 의국의 일원, 레지던트 2018-10-12 12:00:35
- |성형외과노트| 트라우마와 재건수술의 관계 2018-08-28 11:2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