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30분마다 채혈 콜 화난다" "일부러 오가라 하겠나"
발행날짜: 2014-07-01 06:13:05
-
가
-
[창간기획]견묘지간 인턴과 간호사 "상호 배려가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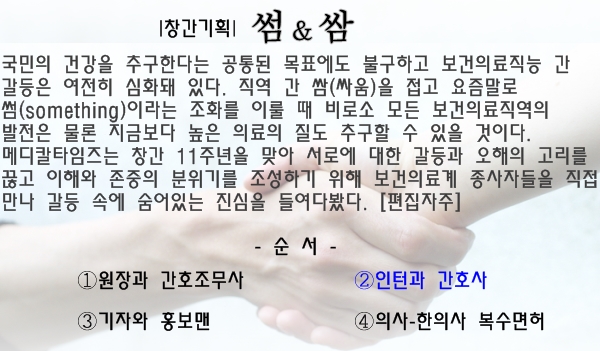
올해 조교수에 임용된 한 전문의의 말이다.
교수 아래 펠로우, 펠로우 아래 치프, 그 아래 주치의의 오더를 받는 두 직종. 언뜻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듯 하지만 엄연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인턴과 간호사.
그렇기에 늘 갈등이 일수 밖에 없고 그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인턴과 간호사들도 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이제 3개월여 인턴 생활을 마친 신입 인턴들과 10년차 이상 간호사들의 얘기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다.
"인턴은 채혈기가 아니다" 신규 인턴들의 한맺힌 하소연
올해 3월 대학병원에 들어온 신규 인턴 A씨. 그는 자신을 채혈기라고 표현했다. 가끔은 자신이 의사인가 의심스러울때도 있다는 것이 그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그 또한 3월부터 4월 말까지 이러한 일에 시달려야 했다. 시도때도 없이 들어오는 채혈 콜에 잠은 커녕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혼자 벽을 때려가며 화를 풀어야 했다.
A씨는 "레지던트 선배들이 그나마 좀 막아주면 숨통이라도 트이지만 이를 묵인하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치의 오더라고 하면 할말이 없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의사 면허를 따고 부푼 마음에 병원에 왔는데 30분마다 채혈만 하고 있으면 내가 의사인지 채혈기인지 의심이 들때도 있다"며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흔들어 대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따라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인턴에 들어온 B씨도 같은 얘기를 꺼냈다. 간호사들이 훨씬 잘하는 일들을 일부터 시키고서 그것도 못하냐며 핀잔을 준다는 토로다.
B씨는 "솔직히 라인 잡는 것도, 샘플링도 수년을 해온 간호사보다 잘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며 "하지만 원래 의사가 하는 일이라며 시켜놓고 옆에서 웃고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처방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 적절한 처방 요령이 없는데도 무조건 이렇게 처방을 내달라고 하면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B씨는 "간호사가 콜을 하고선 '주치의가 이렇게 처방하라 했어요'라고 하면 처방을 안낼 수가 없다"며 "정말 주치의가 그렇게 낸 것인지 내가 제대로 낸 것인지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간호사도 답답하다" 처방권 없는 간호사들의 비애
하지만 이러한 인턴들의 하소연에 간호사들도 할말은 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다.

C씨는 "주치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처방 내세요라고 하고 가는데 우리가 처방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결국 인턴을 불러 처방을 부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왜 인턴을 호출하겠느냐"며 "샘플링 또한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들은 인턴 길들이기는 인턴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간호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인턴들의 푸념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병원의 간호사 D씨는 "주치의가 우리에게 오더를 내리고 가니 우리는 다시 그 오더를 인턴들에게 전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주치의가 인턴에게 직접 오더를 내리면 우리도 일을 많이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 콜을 하는 것이지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공연히 의사를 오라 가라 하겠냐"며 "우리도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도 인턴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곤혹을 겪을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C씨는 "아무리 고년차 간호사라도 의사를 무시하는 간호사는 없다"며 "오히려 몇몇 인턴들이 아직 미숙한 것 같아 도와주려고 해도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인턴들은 다음에 콜을 해도 일부러 늦게 오는 등의 방법으로 간호사를 골탕먹인다"며 "이렇게 되면 서로 다퉈가며 사이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배려와 존중이 실마리 "이름만 불러줘도 관계 개선 도움"
이처럼 견묘지간인 인턴과 간호사지만 갈등을 극복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병동도 많다. 하지만 그 실마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어느날 수간호사가 000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며 말을 꺼내는데 정말 울컥하며 눈물이 나왔어요. 그전까지 제 이름은 '인턴쌤' 혹은 '야 인턴!'이 전부였거든요.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이 이렇게 감동이 될 줄은 몰랐죠."
이후 그의 태도는 180도 변화했다. 언젠가 간호사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접히자 자연스레 말을 할 기회도, 가까워질 기회도 생기기 시작했다.
A씨는 "수간호사가 고마워 마카롱 세트를 선물했더니 간호 스테이션에서 다 나눠 먹었다고 들었다"며 "그 이후 간호사들이 먼저 말도 걸어주고 이름도 불러주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이후 자연스레 밥도 같이 먹게 되고 회식자리에 끼어서 술도 마시다 보니 어느샌가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됐다"며 "이후에는 콜이 와도 짜증없이 가게 되더라"고 전했다.
간호사들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먼저 간호사들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상생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갈등이 생겨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0년차 간호사 C씨는 "물론 인턴들이 힘들고 고되다는 것을 알지만 콜만 하면 오만상 찌푸리며 와서는 '뭔데요' 라고 말하면 정이 가겠느냐"며 "간호사들도 사람인데 이러면 같이 짜증내며 감정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인사 잘하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인턴은 간호사들도 한번 더 배려하고 존중하게 된다"며 "결국 상호 존중이 키워드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내 일처럼 여기는 간호조무사" "의견 존중하는 원장" 2014-06-30 06:15:41
- "병원에 내던져진 인턴 1년은 젊은 의사들의 사춘기" 2014-05-07 06: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