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젊은의사칼럼
안전 불감주의 vs 안전 과민주의
박성우
발행날짜: 2016-03-16 05:05:33
-
가
-
인턴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박성우의 '인턴노트'[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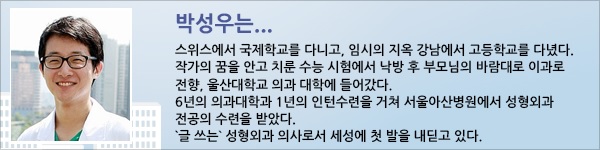
한국 환자들은 의사 말을 안 듣는 것으로 유명한 편이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한국 환자들은 의사 지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도 끊는 것이 다반사다. 다리가 부러지는 외상에 침상 안정하라는 지시에도 목발을 짚고 돌아다니다가 더 심하게 다쳐 다시 병원을 찾기도 한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자신이 의사일 때도 많다.
특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 간에 안전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나도 상이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안전 불감증 환자’와 ‘안전 과민증 환자’로 분류해보았다.
안전 불감증 환자
보령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 나들이 하기 좋다. 산과 호수, 바다가 모두 있어 주말이면 찾는 사람들이 많다. 놀러오면 술 한 잔 걸치는 것이 일례라고 하지만 낮부터 만취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내원한다. 그러고는 아프다고 누워있다가도 괜찮다며 가버리곤 한다.
환자들은 주로 어디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얼굴이 다 까지고 잇몸이 찢어진 환자는 자전거 동호회 모임 중 넘어져 다쳤다고 했다. 첫눈에 보기에도 얼굴이 벌건 것이 술을 거하게 마시고 자전거를 탄 게 확실했고, 동행한 보호자라는 사람도 혀가 꼬인 꼴이 볼성 사나웠다.
흥겨운 분위기에 못 마시는 술을 과하게 마시다가 과호흡 증후군으로 스스로 어찌할지 몰라서 오는 여대생들도 더러 있었다. 안정을 취하게 하고 천천히 심호흡하게 하니 또 다시 금방 돌아가서 놀겠다는 말을 했다.
음주 운전의 위험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할머니들 중에는 구조차를 타고 응급실까지 왔지만 할아버지 밥해주고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며 기어코 입원을 거부하고 나중에 오겠다는 분도 있었다. 입원이 필요한데도 자신의 몸은 튼튼하다며 괜찮다는 아저씨들. 당뇨 환자들이나 간경화 환자들은 금주가 필수지만 과음하고 몸을 함부로 여기는 환자들도 꽤 있었다.
모든 환자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환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음에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결국 치료를 원칙대로 수행하지 않아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더 높였고 사망으로 이어졌다.
안전 과민증 환자
자신의 증상에 대해 너무 과민한 환자들도 힘들다. 일관성 없는 증상에 대해 심각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이다. 정신의학에서는 반복적인 정밀검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 없이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신체화 장애(Somatoform disorder)나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이라는 질환으로 분류한다. 주로 예민한 아주머니들이 그럴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건장한 중년 남성 중에도 건강염려증 환자가 많다.
계속 근육이 저리고 열이 머리 위로 솟구치는 것 같고, 세상이 뒤틀리는 것 같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이상 증상에 대해 토로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만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싶어 검사를 진행해보아도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이었다.
한편 가벼운 질환에 대해 너무 진지하고 죽을 것처럼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특히 소아 환자들의 부모들이 그러하다. 가벼운 편도염이나 감기 때문에 열이 나고 있음에도 아기가 죽는 것은 아닌지,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의료진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부모는 이후 1시간 만에 아기의 상태가 진정되고 열이 떨어지니 집으로 조용히 돌아갔다.
가족 모임 차 보령을 찾은 젊은 부부는 이미 한바탕 싸운 듯 씩씩거리면서 응급실로 왔다. 아픈 아기는 검사 결과 목이 조금 부은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해열제도 먹여보지 않고 응급실로 왔기에 타이레놀 시럽을 먹여보고 열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기가 시럽을 먹는 도중 새벽녘에 먹은 우유를 게워냈다. 해열제도 같이 게워냈을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해열제를 먹이자고 권유했는데 남편은 우리 아기는 한 번도 토한 적이 없다고, 이상한 약을 먹이는 것 아니냐며 고래고래 성을 냈다. 결국 부인과 또 다시 티격태격 하더니 약도 안 받고 귀가를 했다.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며 씩씩대며 퇴실했다.
‘사람의 인체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문구이다. 같은 감기약을 먹어도 하루만에 증상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주일이 넘도록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 같은 병기의 암 환자들 사이에도 항암제에 잘 버텨서 치료 효과가 좋은 환자도 있고, 항암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평균 기대 수명보다 빨리 사망하는 환자들도 있다.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사람마다 달라 같은 양의 국소마취제 투여에도 상처를 봉합할 때마다 아파죽겠다는 환자와 아무렇지 않은 환자가 대비된다.
의사가 되고 난 후 주변 사람으로부터 친절하고 좋은 의사가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환자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수액 주사만 주고 가버린다는 친구의 푸념도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늘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주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여러 부류의 환자들, 소위 진상 환자들에게 시달리면 인간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로컬이라 여의치 않은 환경임에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친절히 진료했는데 환자 입에서 ‘서울 큰 병원’이 나올 때면 서운하다.
서울 본원에서 파견 나온 인턴도 서운한데 보령에서 오래 근무한 토박이 선생님들은 오죽하랴.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인성수양에 정진할 따름이다.
<25편에서 계속>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지네 물린 환자부터 DOA(death on arrival)까지 2016-02-17 05:05:29
- 첫 절개, 그 소소하고 위대한 나만의 '처음' 2016-02-04 11:55:00
- 지방병원 응급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016-01-30 05:05:45
- 충청남도 보령, 바쁜 도시를 벗어나기 2016-01-29 05: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