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경증 상병코드 변경 불가피…국내 질병통계 엉망될라"
발행날짜: 2020-07-20 05:45:55
-
가
-
조양선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두고 의료현장 괴리감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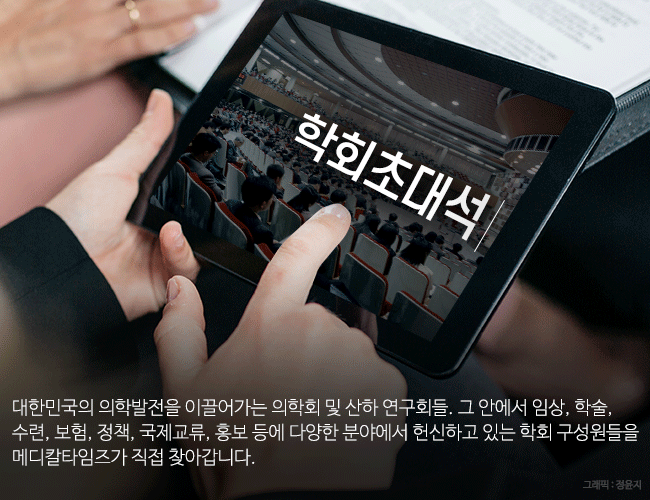
중증도가 높은 전문과목은 평안한 반면 경증환자 비중이 높았던 전문과목 의료진들은 병원 내에서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코로나19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비인후과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을 만나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조 이사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상급종합병원는 중증환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의료현장의 잣대와 다르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류마티스 내과의 경우 개원가에서 처방건수가 희소하다보니 상당수가 중증환자로 인정을 받는 반면 이비인후과는 일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만성중이염 환자가 내원했을 때 개원가에서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항생제를 처방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생제 처방에 대해 삭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 환자가 상급종병에서 수술을 받게되면 경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패널티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는 이어 "중이염 환자 수술은 까다롭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함에도 개원가의 다빈도 상병이라는 이유로 경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상종 경증환자 제외 기준 현실에 안 맞아"
이비인후과학회도 나름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단 경증 처방 코드를 입력하면 경고가 뜨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 중이다.
경증으로 분류되는 진단명이나 상병코드 대신 증상에 따라 대체가능한 상병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조 이사장은 "사실 정부가 고강도 정책을 추진하면 그에 맞춰 대응(상병코드 변경 등)을 하면된다"며 "결국 질병통계가 엉망이 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추진하면 의료현장에서는 회피할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의료왜곡 현상으로 이어지든, 질병통계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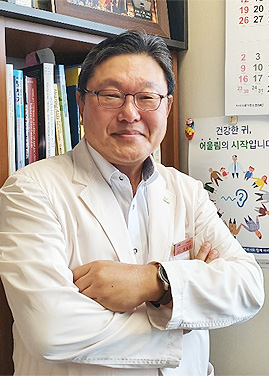
조 이사장은 경증과 중증질환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료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상종 내원 후 1개월(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는 경증질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상종 지정 기준으로 병원 전체의 경증환자 비율을 제한하는 것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경증 비율을 컨트롤 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에만 패널티를 부여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는 "상급병원 의료진이 경증질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환자는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며 "상종 의사들은 진료거부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비인후과학회 "코로나19 백서 마련…대응 시스템화"
이비인후과는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슈 이외에도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어려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학회의 최대 이슈는 국제화로 국제적 교류 활성화로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상태.
조 이사장은 코로나19 이슈와 긴밀한 만큼 학회 차원에서 백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학회가 감염병에 생존하는 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그는 "향후 주기적으로 신종감염병이 반복될 것을 대비하고자 준비에 착수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모으면 어느정도 시스템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상종 경증환자 예외기준 두고 의료계 미묘한 시각차 2020-07-14 05:45:58
- 상종 유치 경쟁 돌입…경증 비율 11%로 낮춰야 합격권 2020-06-29 12:00:00
- "경증도 환자 나름" 문턱 높아진 상종...'복합상병' 적용될까 2020-06-22 05:45:57
-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발표 전격 연기...7월 중 매듭 2020-06-12 05:4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