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외자사
대사증후군 예방 운동, 강도는 높이고 시간은 짧게

김용범 원장
기사입력: 2012-10-10 12:40:48
-
가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운동할 때 시간보다는 강도에 중점을 두는 게 심혈관 위험인자들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는데 더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 비스페베요대학교 에바프레스콧 박사팀은 구체적으로 활기차게 걷는 것은 대사증후군이 10년 동안 빌생할 위험도를 반으로 낮추춘다고 밝혔다(OR 0.51).
이와는 반대로 여유롭게 걷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대사증후군 예방효과는 없었다.(OR 1.22)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학저널 공개판(BMJ Open)'에 실렸다.
대사증후군은 중심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고혈압 및 고혈당 중 적어도 3개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전 횡단적인 연구들에서 신체활동은 비만,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증후군 요소들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질문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집단 성향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종단적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프레스콧 박사팀은 코펜하겐시 심장연구 자료를 이용해 횡단 및 종단분석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횡단분석에는 1991~1994년 1만 135명, 종단분석을 위해서는 2001~2003년 3천 99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시작 전 전체 여성들의 21%, 남자의 27%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
횡단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을 보인 참가자들은 비교적 더 젊은 사람들로서 평균나이가 남성은 48세, 여성은 51세였다.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다 전체적으로 더욱 양호한 측면의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체활동 정도에 따라 대사증후군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앉아서 주로 생활하는 남성은 대사증후군 비율이 37%,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는 사람은 15%를 보이고 있었으며(P<0.001), 여성은 각각 31%, 11%(P<0.001)였다.
이번 분석결과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을 기저위험도는 빠른 보행을 하는 남자(OR 0.48), 여자(OR 0.35)가 모두 더 낮게 나타났다.
조깅을 하는 남자(OR 0.32)와 여자(OR 0.40)에서도 감소됐지만 보행시간의 증가여부를 조정한 후에는 유의한 위험도 감소를 보이지는 못했다.
심장박동수는 운동이 적은 남자군은 76회/분, 왕성한 신체활동을 갖는 남자군은 66회/분으로 줄었다. 여자도 각각 75회/분, 69회/분을 보였다.
연구진은 "심장박동수에서 차이는 심장호흡기 건강상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뒤 연구대상자의 15%가 추가적으로 대사증후군이 생겼다. 특히 운동이 적었던 집단에서 빈도는 19%, 적당한 또는 왕성한 신체활동을 보였던 군에서는 12% 더 발생했다.
종단분석에 따르면 활기찬 보행과 함께 조깅 또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을 보인 군과 같이(OR 0.71) 낮은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OR 0.6)를 보였다.
연구진은 "보행시간이 위험도를 더 낮추지는 못했다"면서도 "좀더 많은 시간을 걷는데 소비하는 것이 비록 더 더딘 보행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건강에는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지금의 결과들이 향후 보행속도를 증가시켜서 심혈관 효과에 유익한 결과를 보여주는 중재연구들로 보강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소의 부작용을 갖는 저렴한 운동 중재요법이면서 유의한 건강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연구결과일 것" 결론지었다.
한편, 이 연구의 제약점으로 ▲신체활동 정도를 개인의 정보제공에 의존했고 ▲그 시간, 강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결여돼 있는 점과 ▲다른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이에 대한 정보 또한 없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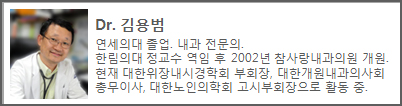
덴마크 코펜하겐 비스페베요대학교 에바프레스콧 박사팀은 구체적으로 활기차게 걷는 것은 대사증후군이 10년 동안 빌생할 위험도를 반으로 낮추춘다고 밝혔다(OR 0.51).
이와는 반대로 여유롭게 걷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대사증후군 예방효과는 없었다.(OR 1.22)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학저널 공개판(BMJ Open)'에 실렸다.
대사증후군은 중심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고혈압 및 고혈당 중 적어도 3개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전 횡단적인 연구들에서 신체활동은 비만,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증후군 요소들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질문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집단 성향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종단적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프레스콧 박사팀은 코펜하겐시 심장연구 자료를 이용해 횡단 및 종단분석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횡단분석에는 1991~1994년 1만 135명, 종단분석을 위해서는 2001~2003년 3천 99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시작 전 전체 여성들의 21%, 남자의 27%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
횡단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을 보인 참가자들은 비교적 더 젊은 사람들로서 평균나이가 남성은 48세, 여성은 51세였다.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다 전체적으로 더욱 양호한 측면의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체활동 정도에 따라 대사증후군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앉아서 주로 생활하는 남성은 대사증후군 비율이 37%,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는 사람은 15%를 보이고 있었으며(P<0.001), 여성은 각각 31%, 11%(P<0.001)였다.
이번 분석결과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을 기저위험도는 빠른 보행을 하는 남자(OR 0.48), 여자(OR 0.35)가 모두 더 낮게 나타났다.
조깅을 하는 남자(OR 0.32)와 여자(OR 0.40)에서도 감소됐지만 보행시간의 증가여부를 조정한 후에는 유의한 위험도 감소를 보이지는 못했다.
심장박동수는 운동이 적은 남자군은 76회/분, 왕성한 신체활동을 갖는 남자군은 66회/분으로 줄었다. 여자도 각각 75회/분, 69회/분을 보였다.
연구진은 "심장박동수에서 차이는 심장호흡기 건강상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뒤 연구대상자의 15%가 추가적으로 대사증후군이 생겼다. 특히 운동이 적었던 집단에서 빈도는 19%, 적당한 또는 왕성한 신체활동을 보였던 군에서는 12% 더 발생했다.
종단분석에 따르면 활기찬 보행과 함께 조깅 또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을 보인 군과 같이(OR 0.71) 낮은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OR 0.6)를 보였다.
연구진은 "보행시간이 위험도를 더 낮추지는 못했다"면서도 "좀더 많은 시간을 걷는데 소비하는 것이 비록 더 더딘 보행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건강에는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지금의 결과들이 향후 보행속도를 증가시켜서 심혈관 효과에 유익한 결과를 보여주는 중재연구들로 보강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소의 부작용을 갖는 저렴한 운동 중재요법이면서 유의한 건강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연구결과일 것" 결론지었다.
한편, 이 연구의 제약점으로 ▲신체활동 정도를 개인의 정보제공에 의존했고 ▲그 시간, 강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결여돼 있는 점과 ▲다른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이에 대한 정보 또한 없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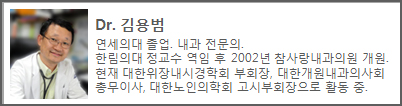

제약·바이오 기사
- 검찰, 국내 대형 제약사 압수수색 2012-10-10 11:24:45
- "요즘 병원에서 유한양행 영업사원 자주 보네요" 2012-10-10 06:49:44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공장에 120억원 투자 2012-10-09 18:17:42
- 숨진 40대 여의사 주변에 프로포폴이… 2012-10-09 15:01:52
- 줄기세포 업적으로 받은 노벨 생리의학상 2012-10-09 10: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