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갈곳 없는 신규 전문의…전임의 폭증세, 무급도 부활
대형병원 채용 늘려 싼값에 악용…"기형적 의료체계 자화상"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1-07 06:35:00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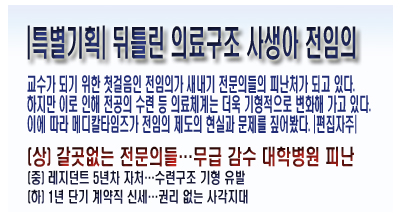
특히 이에 맞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이 전임의 정원을 크게 늘리면서 신규 전문의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전임의 정원 급증세…빅5 정원만 1000명 넘어
서울의 A병원은 최근 채용 공고를 통해 2013년도 전임의 280여명을 모집했다.
이 병원은 당초 250여명을 모집할 계획에 있었지만 지원자가 몰리자 30명 가량 정원을 늘려 채용했다.

B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6일 "예상보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 당황했다"면서 "일부 지원자는 유명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개원을 했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불균형이 가속화되면서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전임의 정원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추세다. 굳이 지원자를 돌려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원을 정해놓는 곳은 나은 편이다. 일부 병원들은 00명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지원자를 사실상 모두 수용하며 인원을 늘려간다.
C병원 전임의 모집 경향을 보면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7년에는 정원이 230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274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300명을 넘겼다.
다른 대형병원들도 마찬가지다. B병원이 올해 250여명을 모집한 것을 비롯, D병원이 240명을 모집하는 등 대다수가 200명이 넘는 전임의를 채용했다.
흔히 말하는 빅5병원의 전임의 정원만 해도 1000명이 넘는 셈이다.
지방 대학병원들도 규모는 작지만 정원을 늘리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의 E대학병원은 2011년 32명의 전임의를 채용했지만 올해는 50명 규모로 정원을 늘렸다.
한해 전문의 배출 인력이 3천명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 대학병원들이 이중 절반을 전임의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저수가 체제 버팀목…무급 전임의도 부활
이처럼 전임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원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또한 봉직의 시장 또한 공급이 몰리면서 연봉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병원경영통계집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전문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6백만원이었다는 점에서 2천만원 가까이 연봉이 하락했다.
하지만 봉직 시장에 의사들이 몰리면서 경력자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지다보니 새내기 전문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전임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B병원 전임의 2년차는 "지난해 마땅한 취업자리를 구하지 못해 병원에 들어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딱히 교수를 할 생각은 없지만 방법이 없으니 이 자리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나쁘지 않다. 교수 인력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로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 김성훈 부회장은 "수가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대학병원들이 전공의와 전임의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전임의들 또한 값싼 전문인력으로 악용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속칭 무급 전임의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병원 공식 채용이 아닌 교실이나 연구단 소속으로 전임의를 채용하는 방식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A대병원은 지난 2007년 44명의 무급 전임의를 뽑은 이래 2008년 61명, 2009년 79명으로 늘려가다 2010년 65명, 2011년 67명으로 증가세가 꺾였지만 올해는 90명 가량을 모집했다.
지방의 F대학병원도 지난해 29명이었던 전임의 정원을 올해 28명으로 한명 줄였지만 그대신 무급 전임의를 4명 선발했다.
하지만 이렇게 선발된 전임의는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타 신분 증명에도 한계가 있다.
병원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C대병원 전임의는 "무급 전임의는 대부분 '스펙'을 채우러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00교수님 제자라는 타이틀이나 00병원 출신이라는 간판이 필요한 경우"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병원 입장에서도 간판을 주는 대신 1~2년 동안 사실상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결국 아이러니하게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셈"이라고 환기시켰다.

병·의원 기사
- 서울대병원 교수들, 국립병원장 싹쓸이 2013-01-07 11:30:08
- "더러워서 개원 못해 먹겠다 싶을 때 중요한 것은…" 2013-01-07 06:34:16
- "어린이집 예산 1/5에 불과한 보건의료…이게 현실" 2013-01-07 06:32:37
- 한솔병원 "소화기대장항문 최고 전문병원 달성" 2013-01-06 18:32:34
- 그린닥터스, '2013 의료대장정' 첫발을 내딛다 2013-01-04 16: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