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새해다짐 프로젝트| "할리 타고 1만km 달리겠다"
고려의대 선경 교수 "모터바이크 타며 마음 비우는 시간 가질 것"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1-06 06:13:17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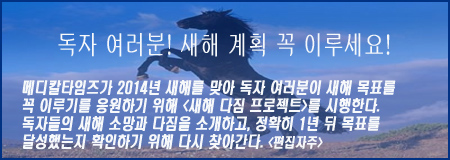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쯤 굉음을 내며 식당 앞에 들어온 할리족 2명이 시원하게 헬맷을 벗는다.
그런데 이럴수가. 은발의 60대 노부부가 아닌가.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는 은발을 휘날리던 노부부의 모습이 생생하다. 그는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불과 마흔을 앞두고 현실의 벽에 부딪쳐 좌절하고 있는 자신과 너무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일까.
헬멧을 벗는 순간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휘날렸던 은발 노부부의 모습은 신선함 그 자체였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할리족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머릿속 깊이 박힌 한 장면은 결국 그를 모터바이크로 이끌었다.
당시 마흔을 앞두고 있던 선경 교수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혼자 지낼 때였다.
수입은 꽤 좋았지만 불안한 자신의 미래 때문에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멀리 떨어진 가족 생각에 외로움이 사무쳤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 생각에 휴가를 내고 차를 타고 동쪽을 향해 무작정 내달렸다. 그의 복잡한 심경 때문일까. 그때 잠시 들린 인디언 식당 앞에서 마주한 노부부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여름 휴가, 명절 연휴 언제든지 시간만 허락한다면 아내와 함께 달린다.
"처음엔 아내가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다. 근데 웬걸 나보다 더 즐긴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요즘엔 간혹 뒷자석에 앉아서 잠깐씩 졸 정도로 익숙해지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2014년에는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1만km을 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집에서 출발해 해안도로를 따라 전국을 돌았을 때 거리가 약 3천km. 다소 무리한 목표라는 느낌이 있지만 아내와 함께 바람을 가르며 내달릴 생각에 벌써부터 들뜬다고.
국내 라이딩은 모터바이크 라이더라면 누구나 안다는 777코스(77번 국도에 이어 통일전망대로 이어지는 7번 국도를 묶어서 칭하는 말)를 따라 달릴 계획이다.
"일단 설, 추석 연휴를 적절히 활용해서 전국을 누빌 계획이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일본 규슈 아일랜드나 미국 데스벨리(Death Valley)쪽으로도 가보고 싶다."
한국 국도에선 100km 이상 속력을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미국에선 모터바이크를 타고 150km로 달리는 게 기본이라고.

그는 '모터바이크'와 '명상'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제 몇 년 후면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 때다. 2014년에는 모터바이크를 타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갖고 싶다. 참선 즉, 명상이 별건가. 머리를 맑은 상태로 유지하면 그게 참선이고 명상 아닌가. 나에겐 모터바이크를 즐기는 바로 그 순간이다."
2014년 청말띠의 해. 모터바이크를 즐기는 선 교수 부부의 모습이라…20년 전, 미국 인디안 식당 앞에서 은발을 휘날리던 60대 노부부의 영상과 오버랩되지 않는가.


병·의원 기사
- "한독은 어미새이자 첫사랑…26년 전 선택 옳았다" 2014-01-02 06:39:49
- "폭력 겁나면 어떻게 의사 하나요" "자해 해서 죄송" 2013-12-31 06:50:50
- 삼성서울 토요진료 순항…병원계 "환자 싹쓸이하나" 2013-12-30 12:20:59
- 공보의 회장 선거 이번에도 단독 출마 2013-12-30 12:01:15
- 리모아, 서울대병원에 기부금 3천만원 전달 2013-12-30 1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