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이슈칼럼
88의 추억? 88의 추악!
Dr. 황진철의 '비오니까'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5-09-16 10:55:15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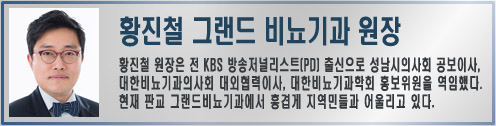
1984년, 국민학교(난 국민학교 세대다. 요즘 말로는 초등학교^^) 2학년 가을. 학교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당연 차전놀이였다. 각 편의 대장이 영기를 흔들며 지휘하고 일동이 함성을 지르며 밀고 싸우고.. 그 웅장함에 아홉살 꼬마였던 나는, 차전놀이가 끝날 때까지 시선조차 흔들리지 않은 채 6학년 형, 누나들의 기개에 매료되었던 순간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렇게 4년을 기다렸다. 비록 대장은 못되더라도 그 웅장한 가을을 기대했던 나는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운동회가 없다. 이유는 바로.. 1988년 88올림픽 때문이다. 역사책에도 나올 그 국민적인 축제에 열세살 아이는 ‘88‘이라는 숫자를 아프게 기억한다. (그 웅장함은 비교할 바도 못되겠지만..)
1995년 가을, 포장부터가 세련됐다. 입맛부터가 다르다. 뭔가 있어 보이는 척, 'Eighty eight' 하는 녀석들도 많았지만 난 88이 입에 딱 맞았다. 젊은 시절 욕망의 해방구, 바로 그 시작은 8cm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로 부터였다. 스무살의 나는 ‘88’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기억한다.
그리고 딱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5년, 그리고 가을.
“88 주세요~” 추억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다. 병원을 찾는 몇몇 환자들의 소리다. 좀 더 남성다움(?)을 찾으려는 환자, 열에 대여섯은 같은 소리다. 특이한건 “발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가 아니다. 주변의 친한 녀석들도 “약 좀 줘~ 그거 있잖아~ ㅋㅋ” 이런 식이다. 대략난감..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발붙일 여지가 없다. 마치 과거 세운상가에서 야한 잡지를 구하듯, 키득키득 웃으며 다 알고 왔다는 듯, 약만 달라고 한다.
호흡을 살짝 가다듬고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설명한다.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모두 다 알고 있다는 듯. ‘우선 8알을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드셔 보시구요.’ 나를 쏘아 본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다.
그냥 30알 달라고 한다. 그동안 먹어 봤단다.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는 90알도 준다고 한다. 일·이주에 한번 성관계를 하는 분이다.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해도 일년치는 족히 넘는 양이다. 믿을 수가 없었다.
오! 마이 갓! 다음 내원 때, 내게 처방전을 흔들며 호기롭게 말한다. 목청껏 외친다.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영업할 때도 필요하다고 한다. 위아래로 쏘아보며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한다. 뒤에 남겨진 나, 멋쩍게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만다. 난 대한민국 비뇨기과 전문의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다.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 아니 완전 잘못됐다!!
대한민국, 비뇨기과 전문의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어떻게 발기부전 치료의 형태가 이토록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를.. 발기부전 치료제의 효능, 안전성 그리고 복용의 편의보다는 이름짓기가 약물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단순히 1원이라도 더 저렴한 약이 착한 약이 되는지를.. 그리고.. 더 노골적인 글을 이어가고 싶지만.. 이어갈 용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88의 ‘추억’이 ‘추악’으로 다가온 마흔살의 내게,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크게 목소리를 내라는 가슴 속 함성이 솟구쳐 오른다. 자존감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건만..
마침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우리도 힘을 합치면 우리의 자존감을 되찾고 또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한다. 한명, 한명 그 소중한 힘을!!
(비뇨기과는 각 진료과 중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처음은 미약하겠지만, 기대한다. 창대한 미래를!)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

오피니언 기사
- 두번째 K-HOSPITAL FAIR가 남긴 것은 2015-09-15 05:23:24
- 국감에서 드러난 의협 대관업무 아쉬움 2015-09-14 05:23:13
- 사무장병원 칼 빼든 공단, 공염불 안 되길 2015-09-09 05:28:38
- |칼럼|개인정보 보호교육보다 진료가 우선이다 2015-09-08 05:36:59
- 간호등급제 늪에 빠진 중소병원, 공허한 외침만 2015-09-05 05:3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