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오른손 모르게 일하는 홍보맨들 "다시 태어난다면.."
발행날짜: 2014-07-02 06:13:01
-
가
-
[창간기획]365일 사생활 반납…"무색무취 소금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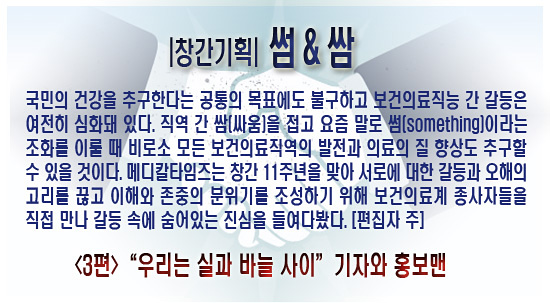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시처럼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에 '섬'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걸 잊고 지냈다.
기자와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언제나 기사 뒷편으로 한 걸음 물러서 있었던 그들. 한번 쯤 이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리라.
이번 이야기는 홍보맨들이 주연을 맡았다.
"365일 사생활 반납" 기사 뒤에 숨겨진 이들
태양 빛이 따겁다 싶은 6월. 아침 일찍 양재시민의숲으로 모였다. 기자 넷, 홍보맨 셋. 모이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언론에 노출되면 '큰 일'이나 날 것처럼 극구 사양하던 터라 일면식도 없는 홍보 담당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들이기는 취재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명함 교환이 끝나고 이름과 얼굴을 익혔다. 의협 홍보실 오윤수 국장과 강북삼성병원 나형준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그리고 홍일점인 오혜민 화이자제약 대외협력부 과장까지. 오늘의 주인공들과 공원 입구 쪽으로 어색한 발걸음을 옮겼다.
사실 그랬다. 홍보라는 것은 자신을 감추고 취재원을 부각시키는 일, 그렇다 보니 언론 노출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다. 홍보맨의 취재도 처음이지만 그들 역시 취재원으로 기자 앞에 선 것도 처음이다.
기자의 펜 끝을 '막느냐' '못 막느냐'로 역량이 판가름 나는 홍보 담당자들은 기자들과 표현의 수위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가 만났으니 어색한 것은 당연한 일.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건 홍보 일을 왜 선택했냐는 질문이었다.

"처음 의협 신문국에 들어가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홍보를 하라고 하니 황당했죠. 뒤에서 일해야 하는 홍보 일의 특성상 제 역량을 펼칠 수 없다는 생각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홍보 담당자들이 밥상을 얼마나 잘 차리냐에 따라서 기사의 질이나 방향도 많이 바뀌는 것을 보고 보람도 얻습니다."
조직을 알리는 데 기자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홍보 담당자가 얼마나 보도자료라는 밥상을 잘 차리냐에 따라 기사의 방향까지 좌지우지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한다는, 나름의 보람을 찾았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정부 정책에 비판의 가해도 마냥 '밥그릇 싸움'으로만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때면 속상했다는 게 그의 말. 팩트가 아닌 걸 팩트로 포장해서 나갈 때 화도 나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용해야한다는 게 그가 가진 홍보 철학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것이 홍보 담당자의 숙명이라는 말에 나형준 대리와 오혜민 과장도 거들었다.
오혜민 과장은 "홍보라는 것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면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종종 이슈가 터졌을 때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해서 혼자 진땀을 흘렸던 적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홍보의 역할이요? 간장보다는 소금에 가까워요"
뒤에서 기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시키는 일만 열심히해야 하는 것이 홍보의 숙명이자 과제로 남았다는 소리다.
"소금과 간장이 있습니다. 간을 맞추는 역할은 비슷하지만 홍보는 결코 소금의 역할에 머물러야지 간장이 되선 안 됩니다. 간장은 색깔이 있어 티가 나지만 소금은 무색 무취로 먹어봐야만 그 맛을 알 수 있죠"라는게 그의 말.
이 대목에서 기자들도 무릎을 쳤다. 좋은 기사의 90%는 좋은 취재원이 만든다는 말이 있다. 좋은 기사를 썼을 땐 내 역량이겠거니 어깨를 으쓱거렸지만 생각해보면 취재원과 인터뷰를 잡아 준 홍보맨들의 노고에 머리를 수그린 적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겪는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 했다.
나 대리는 "사람들을 만나 좋은 대안을 찾는 부분에서 재미와 흥미를 많이 느끼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면서 "하지만 연차가 쌓여도 즉각적인 취재요청을 다 받아들여줄 수 없는 안타까움은 늘 있다"고 전했다.
결코 티가 나지 않는 일, 잘해야 본전인 업무의 특성 때문에 좌절한 적이 있다는 데 세 사람의 목소리는 같았다.
"365일 사생활을 반납하고 전화 취재에 응대하고 술자리에도 불려다니지만 누가 이런 걸 알겠어요. 그저 기자들이랑 어울려 술마시는 게 일이라는 편견만 없어도 감사할 따름이죠."
자리를 옮겨 칼국수 집을 찾았다. 시원한 맥주 한잔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속에 담아뒀던 좀 더 진솔한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부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다.)
모 홍보 담당자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홍보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강변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기자들과 코스 요리를 먹더라도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집에서 물에 밥을 말아먹더라도 편한게 더 낫다는 말.
다른 담당자들도 기자들이 부르는 술자리에 안 나갈 수가 없다며 "좀 살려달라"고 농을 건넸다. 폭탄주와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다시 태어나더라도 홍보 일 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애절한 눈빛을 보내니 기자로서 얼굴이 뜨거워질 수밖에.
최근 다른 매체 기자와 언성을 높여 싸웠던 모 담당자는 이날 바로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저번에 싸운 것 미안했고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술 한잔하자"는 게 그의 마지막 멘트.
365일 사생활을 반납했지만 정작 누구도 그들이 하고 있는 '왼손의 일'을 모르진 않을까.
관련기사
- "30분마다 채혈 콜 화난다" "일부러 오가라 하겠나" 2014-07-01 06:13:05
- "내 일처럼 여기는 간호조무사" "의견 존중하는 원장" 2014-06-30 06: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