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이슈칼럼
"개원의들의 일상? 패밀리스(familess)족"
Dr. 황진철의 '비오니까'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5-04-29 05:32:44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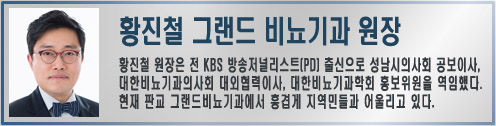
"I’m familess"
깜깜하다. 감각적으로 스위치를 찾는다. 거실이 환해진다. 방문을 열어 물끄러미 아가들과 아내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한다. '잘있구나…' 안도의 한숨과 함께 거실에서 몇분간을 멍하게 앉아 있다. 휴…
가족을 위해 진료의 현장으로 돌아 왔고, 가족을 위해 병원을 개업했고, 가족을 위해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도 나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생활 속에 가족은 없다. 나는 철저한 패밀리스다. family 그리고 less… (이건 제가 만든 합성어입니다. 이런 단어도 있었나?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고의 1분. 내 옆구리를 파고 든다. 곧이어 배위에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린다. 내 머리를 밀어 내며 징징 대는 소리도 들린다. 아침이다. 해가 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다. 아가들이 내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신기한 듯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얼굴을 부비고 뽀뽀도 하고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침을 맞이한다. 멀리서 아내가 흐뭇하게 미소 짓는 모습도 보인다.
얼마나 지났을까? 난 바로 욕실로 향한다. 목마를 태워 달라며, 자기가 세수를 시켜 주겠다며 또 안아 달라며 욕실 문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아가들의 눈물, 콧물 섞인 울음과 아내의 달래는 소리가, 한쪽에서는 무심한 듯 샤워 물소리가 가득하다. 좀 더 오래 안아 주지 못하고 살갑게 놀아 주지 못해 아쉽다. 때론 슬프기도 하다. 안타까운 1분, 하루 중 가장…
이 한마디가 딱 어울릴 듯하다. '후다닥'. 시간에 쫓겨 일렬로 서서 손을 흔드는 아가들과 아내를 뒤로 하고… "아빠, 출근한다."
오늘 내가 아내와 통화를 했었나 궁금할 무렵이면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온 거다. 오늘 저녁은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 회의가 있는 날이다. 일주일에 5번은 저녁 회의, 2~3번은 조찬회의, 이번 달은 매주말 학회 또는 워크숍이다. 아가들이 커가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섭섭함을 참고 또 견디다 아내가 한 말이 떠오른다. 그날은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 갔는데(그렇다고 해도 KBS 9시 뉴스가 시작할 무렵이다.) 바로 옷 갈아 입고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자 "여보, 아가들 데리고 같이 갈까? 여보 조문할 동안 우린 로비에서 놀고 있고." 멍… 늦은 저녁, 장례식장 로비, 아빠를 기다리며 뛰어 노는 아가들…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내의 푸념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깜깜하다. 역시 난 감각이 있다. 거실이 환해진다. 방문을 연다. 물끄러미 아가들과 아내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한다. '오늘도 잘 자고 있구나…' 안도의 한숨과 함께 거실에서 앉았다. 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진료 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며, 난 가족을 위해 학회나 의사회도 나간다. 휴…
I’m real familess.
[추신] 아래 영상과 저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고 흘러 나오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으며, 패밀리스를 청산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혹 어떠신가요? 패밀리스는 아닌지요?
| 프롤로그 |
| 비가 지독히도 내리던 여름 어느 날, 정확한 시기는 가물가물하다. 올림픽대로 조그마한 소형차 안에 덩치 큰 남자 둘이 앉았다. 내 좋은 친구 현수 그리고 나. 당시 레지던트였던 나는 수술방 포비아가 있었다. 그날도 과장님께 무참히 블레임 (당시 과장님은 블레임 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셨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최고 경멸스런 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블레임 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셨다. 마치 대화를 이어가는 접속사처럼. 전공의 시절, 덕분에 난 포비아로 인해 맘껏(?) 괴로웠다. 아! 웃픈 시절...) 당한 후 좌절 모드로 괴로워하다, 진료가 끝나자마자 친구를 찾았다. 그리고 30분 만에 소주 2병을 들이키고는 드라이브를 부탁했다. 내 속내를 눈치로 알아 챈 친구는 특별한 말도 없이 운전을 시작했다. 20분 쯤 지났을까?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라며 오디오 볼륨을 올렸다. ‘비뇨기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비뇨기과~ 그러니까~ ...’ 엉? 분명 오디오에서 ‘비뇨기과’라는 가사가 들렸다. 무척이나 의아했다. 그런데 난 술기운과 피로를 이길 수 없었다. 며칠 전처럼 난 친구한테 업혀서 병원 당직실로 들어 갈 것이다. 레드 썬!! 정신없이 또 며칠이 흘렀다. 워낙 바삐 돌아가는 병원 시스템에 외로움도 낭만도 찾을 여유가 없다. 그리고 또 다시 찾아 온 황금의 오프 데이! 주저 없이 그 날도 현수라는 친구를 찾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고마운 친구다. 내 술주정을 말없이 옆에서 들어준, 그리고 힘들다는 한마디면 언제나 내 곁에서 같이 소주잔을 채워줬다. 사실 현수가 여자 친구가 생겨 내게 소홀(?)할 때 질투심에 불탔던 시절도 있었다. 이 또한 웃프다.)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을 물었다. 지금은 월드스타인 가수 싸이의 ‘비오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의 정확한 가사는 “비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다. 사실 지금도 난 비뇨기과로 들린다. 아니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한다. 내 애창곡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급격한 체력 저하로 지금은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지만 혹 회식 후 한잔 그리고 노래방을 간다면, 난 망설임 없이 이 곡을 부른다. 그것도 분위기가 클라이막스라고 느낄 무렵이면 언제나. 이 칼럼의 제목을 ‘비오니까’로 정한 데에는 큰 의미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 듯, 그리고 내 편에서 편하게 생각하고 들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바를 글로 담백하게 담아 보고자 한다. 물론 보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며... 그리고 요즘 비뇨기과 참 슬프다. 전공의 지원도, 사회적인 인식도,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로서 자존감까지... 비뇨기과에 비가 온다. 그래서 ‘비오니까’ |

오피니언 기사
- 아내와 함께 가는 해외여행[37] 2015-04-28 08:42:29
- 의료계의 '성완종 리스트' 2015-04-25 05:54:01
- 밥상은 제약업계가, 생색은 정부가? 2015-04-24 05:30:56
- 아내와 함께 가는 해외여행[36] 2015-04-24 05:28:41
- 달빛어린이병원, 상생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2015-04-23 05:3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