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이슈칼럼
"언발에 오줌누기식 의사 확충 정책"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이재호
기사입력: 2012-09-10 05:50:19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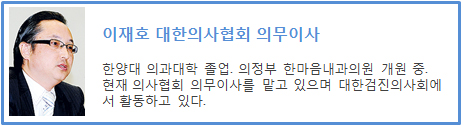
최근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정부와 보건의료학자 등의 입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늘 인용하는 OECD 데이터는 인구 천명당 의사수다. OECD 평균치인 인구 1천명당 의사수 3.1명에 비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수는 2.25명(보건복지부 통계연보)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마의 10만 벽을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 정원은 6.4명(한의사 포함시 7.9명)으로 미국(6.5명), 캐나다(6.2명), 일본(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사수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5배나 높다.
또 하나 땅 덩어리 대비 의사수(의사밀도)를 살펴보면 1㎢당 0.95명으로 벨기에(1.0명)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만큼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반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연령이 매우 젊다. 향후 발생될 의사수 부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55세 이상 의료진의 비율인데 2009년 OECD 국가의 55세 이상 의사 비율은 30% 이상인데 반해 우리는 20% 미만이다.
그 이유는 의과대학이 1980년대 17개, 1990년대 10개를 포함하여 총 27개의 의과대학이 80,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의사인력 배출은 평균 6년에서 최장 16년(의대6년+군대 3년+전공의 수련 5년+펠로우 2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즉, 정책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수요과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의료인력 수급 적정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지역별 불균형(대도시 쏠림현상), 진료과목별 불균형(진료기피과 몰락), 종별 불균형(동네의원 붕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들은 의사수 총량의 문제가 아닌 효율적 의료이용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최근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이 문제의 내막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인력 배치 기준의 문제이지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배출 숫자는 2012년 기준 대비 4,054명(의과 2,538명)이다.
이중 필수 공공인력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 배치된 숫자는 약 1,600명(전체 63%)으로 37%가 필수 배치와는 무관한 국공립의료원, 민간기관, 검진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고 있어 배치기준에 대한 논란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들어서 있는 의료취약지구 반경 5㎞ 이내에 의원이 79.5%, 병원이 58.4% 분포하고 있어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가 재정립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보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돈이 시중에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이 안돌고 있으니 조폐공사에서 마구 돈을 찍어 내겠다는 대안 없는 정책으로서 마치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의대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논하기 보다는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공의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체계 확보와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기사
- '의사 심기 건들지 말라'는 특명 2012-09-10 06:00:44
- 이중개설 금지 첫 유권해석 촌극 2012-09-06 06:00:46
- 외상센터, 10년후가 우려되는 이유 2012-09-03 06:00:47
- 왜 의사 수 늘리는데만 집착하나 2012-09-03 06:00:38
- 가계대출은 항상 핵폭탄.. 2012-08-31 13:4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