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이슈칼럼
2000년 의약분업 추억과 의사파업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허대석 교수
기사입력: 2014-01-16 07:00:51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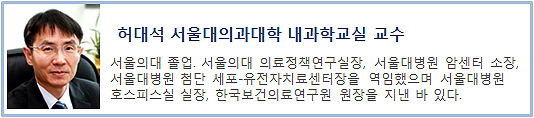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의사가 사회적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2000년을 되돌아보면, 의약분업이라는 쟁점에서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2014년, 이번 파업 예고의 배경도 속사정을 살펴보면 2000년과 달라진 것은 없다.
파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전문직종인 의사의 파업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그리스, 뉴질랜드, 브라질 등 사회보장 형태로 국가가 의료를 관리하는 나라에서는 의사파업이 반복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과 비슷한 의료제도를 가진 이스라엘에서 의사들이 5개월 동안이나 파업을 계속해 정부로부터 새로운 협약을 받아내기도 했다.
왜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을 하는 것일까?
히포크라테스가 의료윤리지침을 기록한 2300여 년전,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양자관계였다.
전문직종으로 자율성을 보장받아온 의사와 환자의 전통적인 양자관계가 보험이라는 제삼자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된 것은 1883년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복지를 명분으로 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였다.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종은 자율권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확장되는 수준과 비례해 의사들이 가지는 자율권의 폭은 줄어들었다.
어느새 안보나 교육만큼 의료도 사회안전망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는 시대에서 일하게 된 의사들도 공동선을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의료혜택의 확대가 정치적 선심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자율권의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의 욕망을 자신의 표로 바꾸고 싶은 정치인들은 의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로 모는 일도 서슴지 않고 반복했다.
이제 의료의 본질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1977년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필수의료일수록 수가를 원가 이하로 묶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는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제도를 40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저수가정책으로 인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나 영리사업에 의료기관들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의사의 기술료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검사나 투약 위주의 비정상적인 의료가 만연한 것이 의료현실이다.
2000년도 의료사태 때 전공의들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미봉책으로 끝나고 지금 진료현장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지금도 정부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의 문제를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등 또 다른 편법으로 미봉하려 하고 있다.
"건보 수가가 원가 이하인 것은 인정하지만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비보험진료를 줄일 지는 의문"이라는 최근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의료제도 정책입안자의 기본 관점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직한 의사가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의사는 알아서 생존할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정직한 의사의 설 자리가 없는 곳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직한 의사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불행한 의사와 불만족한 환자가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의료복지는 존재할 수 없다. 환자-의사-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기사
- 불경기 위기 극복, 업계에 달렸다 2014-01-13 06:06:00
- 의사 총파업 여론 호도 말라 2014-01-13 06:02:30
- 실패한 의약분업과 갑오년의 역사 2014-01-13 06:00:56
- 대통령만 모르는 '정상화' 2014-01-09 06:03:10
- 새해에도 슬프기만 한 '정액수가' 2014-01-09 05:2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