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고가장비 없어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던 게 그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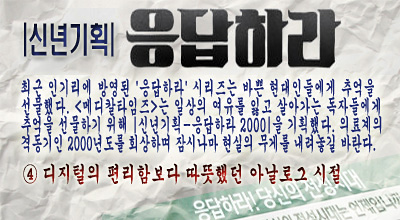
안재홍 원장은 첫 개원을 한 이곳에서 28년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환자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안 원장은 개원 당시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 주례를 부탁하고, 지역주민들의 애경사를 챙길 때마다 세월의 흐름을 깨닫는다.
오랜 재개발로 빼곡했던 주택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지금, 안 원장이 추억하는 2000년 진료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전자차트가 상용화되지 않은 시절 일일이 수기로 종이차트를 작성하고, 다시 286컴퓨터에 환자 인적사항과 처방내역을 입력해 도트 프린터로 출력 후 요양급여 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편보다는 주로 아내에게 부탁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종이차트와 관련된 추억도 많다.
한 달에 한번 심평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던 시절, 안 원장은 진료가 끝난 후 도트 프린터에 출력을 걸어놓고 퇴근했다가 여러 번 곤욕을 치렀다.
다음날 한꺼번에 엉켜 버린 출력물들을 다시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
과거 도트 프린터를 써봤던 의원에서는 충분히 공감할만한 에피소드다.
안 원장은 "한번은 지하철에 청구서 뭉치를 놓고 내려 한 달 치 전부를 재출력한 적도 있었다"며 "지금이야 EDI 청구를 하니깐 큰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하늘이 노랬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금은 투박하고 불편했던 그때가 가끔은 그립기도 하다.
그는 "종이차트를 수기로 작성했을 때는 환자와 눈을 맞추면서 대화할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가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추억했다.
재개발로 경기도 평택ㆍ일산ㆍ남양주로 이사 간 환자들이 인근 의원을 가지 않고 안 원장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 원장은 "요즘 환자들은 젊은 의사들이 컴퓨터 모니터에 뭔가 입력하느라 바빠서 정작 환자 얼굴은 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후배 의사들이 이해는 되지만 전자차트 때문에 의사와 환자가 기계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카드 결제 미안해하던 환자들 '격세지감'
이제는 피부과ㆍ성형외과는 물론 소아과ㆍ산부인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피부레이저치료기기.
2000년 그 시절에 피부레이저장비는 대학병원 피부과에서나 볼 수 있었다.
과거 의원에서는 도입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필요성조차 크지 않았다.
그는 "2000년도에는 내과ㆍ외과 급여환자만 봐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지금처럼 미용성형 붐이 없었기 때문에 고가의 피부레이저장비를 도입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주위에 새로 개원한 의원들은 환자를 확보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고가 의료기기를 많이 도입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환자들이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으러 왔던 과거와 달리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원 선택의 기준이 된 현실에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의료기기와 더불어 카드 결제 또한 의원의 달라진 풍경 중 하나.
2000년도 당시 카드 결제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낯설었다.
안 원장은 "그 시절에는 카드 결제 자체가 없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환자들은 몇 천원의 진료비를 카드 결제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해 했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지금은 나이를 불문하고 환자 대부분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며 "의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환자가 줄어 걱정인데 은행에 카드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현실이 고달플 뿐"이라고 허탈해했다.
어쩌면 의사들은 전자차트ㆍ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 스마트함은 없지만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던 2000년도 그 시절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