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성형외과의 세계…박성우의 '성형외과노트'[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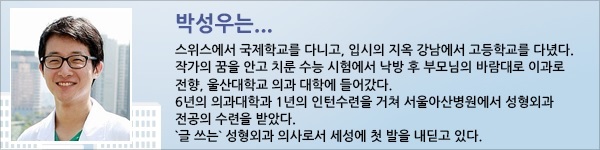
종합병원 레지던트 1년차는 시키는 일만 해도 하루가 부족하다.
새벽부터 드레싱, 회진 준비, 아침 수술 환자 확인, 이어서 수술 스크럽, 수술 환자 챙기기, 저녁 회진, 그날 수술 환자 설명, 다음 날 수술 환자 동의서 및 준비, 수술 기록지 작성, 경과 기록지 작성, 다음 날 처방,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응급실 가서 상처 봉합하기까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더군다나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몰리는 탓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루가 끝나는 날들도 많았다. 연차가 높아져도 하루 한 끼조차 못 먹는 날이 있었다.
레지던트라고 권한이 있어도 쥐꼬리만큼이라 수술 시에도 리차드슨 이나 디버 같은 수술 기구를 당기거나 봉합사 컷만 하는 게 1년차다. 처 음에는 날고 기는 말턴이라 해도 레지던트 1년차가 되면 백지장 같은 하얀 바보나 다름없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닦이면서 시작했고 일이 기계적으로 익숙해질 때엔 이런 일갈이 터진다.
"너가 오더리냐?" 대형 종합병원은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어서 루틴(routine)이라 불리는 정해진 과정의 일이 많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깨우치면서 해야 되어 속도가 매우 더디다. 무엇 하나 빠트렸을까 봐 계속 되새김질 하고 선배나 교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으면서 몇 달을 보낸다.
소위 '일 빵꾸낸다' 라고 표현하는 누락이 발생하면 뒤처리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더군다나 성형수술은 수술마다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의 변화가 심해서 이런 세부사항을 빼먹는 것은 빈번했다.
그래도 습관이 되면 전 과정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굳이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환자들이 어느 순간 일처럼 느껴진다. 일을 빨리 처리해야 밥 먹을 짬도, 쉴 틈도, 잠도 자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환자를 대할 때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나를 발견한다. 수술에 필요한 사항이나 일이 정리되면 '환자'는 일단 '정리된 일'과 같아서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함이나 관찰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보지 못하고 다음 '환자 = 업무'로 넘어가는 것이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환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병원과 일에 대한 애착도 무미건조하게 변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처리를 잘하는 전공의가 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다.
오더 혹은 오더리
1년차 때 받았던 꾸지람 중 하나가 "오더리처럼 일하지 마라"는 것이었다.
오더리는 '의사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을 의미한다. 의사의 처방을 뜻하는 '오더'(order)에 접미사가 붙은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회 이슈와 더불어 '의사의 지시에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비의료인'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집도의 없이 수술을 수행하는 남자 간호조무사나 의료면허가 없는 정형외과 기구상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고연차가 되니 선배나 교수님들이 왜 그런 꾸지람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스스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환자들에게 마음의 차폐막을 씌우고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가서 자라고 하면 자면 된다" 고 하지만 로봇과 같은 삶을 살다보면 비참해진다. 나름 의사고 성형외과 전공의인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존재 이유가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많은 레지던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지도 모른다.
"너가 오더리냐? 전공의고 주치의면 환자가 무엇이 불편한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환자 얼굴도 보고 그래야지. 시키는 일만 하고 처방 넣고 경과 기록지만 잘 쓰면 의사냐고. 디테일이 중요한 거야. 저 환자는 왜 같은 수술받고 더 통증이 심한지, 드레싱이 꽉 조이지 않는지, 그런 거 하나 하나 유심히 볼 수 있어야지. 네 환자고 네가 주치의지. 안 그래? 수술 기록지도 마찬가지야. 힘들어서 수술 도중 깜빡깜빡 졸더라도 나중에 수술 기록지 쓸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윗연차한테 물어보거나 교수님한테 물어봐야지. 귀찮다고 대충 쓰면 그게 기록지냐고. 수술 기록지 쓰는 것도 훌륭한 공부다. 바둑 둘 때 복기하듯이 수술 참여했던 것도 복기해야 네 것이 돼. 나중에 시간 날 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 오더리처럼 일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너 말고 의과대학 학생 시켜도 그 정도는 해. 전공의고, 성형외과 주치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종합병원 응급실 옆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나 보호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당직을 서는 레지던트들도 많이 애용한다. 저녁을 못 먹고 밤 12시가 넘어서 응급실 환자 한 명 상처 꿰매고 컵라면을 앞에 두고 우두커니 병원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지탱하기 위해 시계태엽처럼 돌아가고 있을까. 마음 여린 젊은 의사들이 수련기간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나는 우울하지 않았다. 우울할 틈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대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의사의 길 자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일 빵꾸내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하면 되지, 그렇게 버티다 수련을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오더리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희한하게도 텅 비어버린 시간을 극복하는 데에는 환자들이 도움되었다. 나는 특별히 잘해준 것이 없고 기계적으로 수술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고맙다는 말과 편지를 받으면 죄책감마저 들었다.
허울뿐이라 생각했던 명의들의 '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나를 지탱하는 힘' 이라는 말을 더 이상 냉소하지 않게 되었다.
※본문에 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동의를 통해 그의 저서 '성형외과 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