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의대 본과 3학년
투비닥터 편집장 박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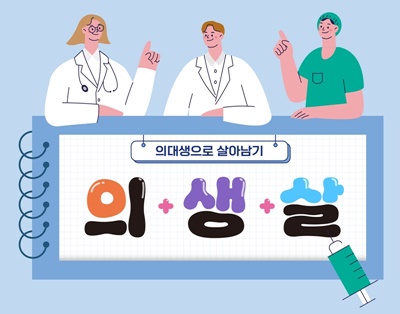
휴학 나흘 전까지만 해도 나는 3일간 7개의 시험이 잡힌 살인적인 일정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다. 마지막 소아과학 시험을 치른 컴퓨터실을 빠져나와 내내 목에 걸려있던 숨을 삼켰다. 익숙한 대로라면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은 다음 경주 전 짧은 휴식과 성적표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낯선 종류의 팽팽한 긴장감이 시험장을 나온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무거운 결정들이 빠르게 이뤄진 며칠 새에, 나의 역할도 실습을 기다리던 본3에서 의대생 단체 투비닥터의 TF 콘텐츠 공동 총괄로 바뀌어 있었다.
TF에서는 급변하는 상황을 정리하고 사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했다. 팀원들과 밤낮 구분 없이 매달려 매일 두 편 이상의 카드뉴스와 인터뷰 영상을 발행했다.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다량의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험은 매체의 극명한 한계를 눈앞에 펼쳐 보여줬다.
제한된 분량 내에 깊이와 연속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 너무 분명한 이 약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 TF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정보의 조각들을 손에 쥐었지만, 이를 연결하지 못하고 헤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문제가 펼쳐진 지형의 일부만을 더듬고 있는 듯해 답답하던 차였다.
해결책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책이 곧장 떠올랐다. 책은 다루는 주제의 흐름과 깊이를 친절하게 제공하고, 마지막 장을 덮으면 독자의 머릿속에 그 줄기가 이식되어 있다. 또한 시기적절한 아날로그로의 회귀는 종종 사회에 큰 임팩트를 만들었고, 지금이 그 '때'라고 직감하며 기획 및 편집 총괄로서 <코드블루> 제작에 전념한 한 달 반의 여정을 시작했다.
무지가 용기를 심는다고, 기획 단계에 착수하자마자 내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용맹한 척 가르릉거리는 아기호랑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심과 실행의 문턱을 넘자마자 문제들이 계속 날아왔다. 투비닥터 편집장으로서 세 권의 매거진을 만든 경력이 있지만, 같은 텍스트 매체임에도 책과 매거진의 무게는 엄연히 달랐다.
첫 발짝인 내용 구성 기획부터 발목이 붙들렸다. 오랜 세월 누적된 문제들은 마치 얽힌 덩이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자 같았다. 책에 담을 주제를 하나 잡으면 다른 문제들까지 전부 딸려나왔다. 무엇을, 어느 깊이로 다룰지 결정하는 것부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 고심해 목차를 정하고 팀원들에게 원고를 청탁했다. 거기까지가 얕은 언덕이었다.
그 뒤의 시간들은 까마득한 산봉우리로 기억한다. 낮에는 400쪽 원고의 사실관계와 형식 오류를 뜯어보고 마감을 독촉하는 악덕 편집자 됐다가, 밤과 아침에는 낮시간의 내가 친히 씌운 마감의 쟁기를 이고 글을 쓰는 집필자가 되었다. 지킬 박사가 느꼈을 피로에 지극히 공감했다.
그렇게 함께 고생해 완성한 책은 <코드블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전달됐다. 주변 이들의 찬평과 감사 인사가 탈진한 마음을 다시 부풀리는 얼떨떨한 감각을 경험하며 학교 밖, 전혀 새로운 트랙에서의 첫 번째 경주가 마무리됐다.
이 사태는 마치 많은 사람이 아침마다 이용하는 도로 한복판에 통행 중단 표지판이 세워진 것과 같은 모습이다. 사람들은 등교하거나 출근할 수 없게 됐고, 이어지는 일상이 깨진 것은 물론이다. 갑작스런 상황에 누군가는 통행이 재개되길 기다리고, 우회로를 찾아 떠난 이도 있으며, 몇몇은 핸들의 커브를 돌려 본인조차 예상치 못한 경로를 탐색한다.
나는 그 중 마지막 부류에 속해있다. 활자를 사랑하고 읽고 쓰는 일을 즐기지만 '2024년 4월, 책 발간'은 확실히 인생과 내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일이었다. 어리둥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새로운 경로는 감정의 요동에 보상하듯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했다.
이 경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의학과 의료의 구분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며, 정책, 제도, 사회 시스템 수립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못한 채로 학교를 졸업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이 논제들을 마주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또 새로운 경로는 운전 규칙이 독특하다. 마음에 가치를 담을 것을 요구한다. 지난 이 년간 내 마음은 성적 따위의 숫자, 알파벳, 단기적 목표를 삼켜왔다. 하지만 책을 만드는 일은 다르다. 당위와 신념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명히 추구해야 지속할 수 있었다.
'내가 왜 책을 만들겠다고 했더라', 금세 증발해버리는 가치를 마음에 다시 가둬두기 위해 같은 질문을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의사의 사회적 역할, 미래의 의료 체계, 옳은 것과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했고 나를 생각하게 했으며 더 풍성한 가치를 마음에 심게 했다.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일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건전한 사회를 고민한 노력 자체가 분명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 나아가 성숙하고 주체적인 사회인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으며 나는 오늘도 새로운 경로를 탐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