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박성우의 '인턴노트'[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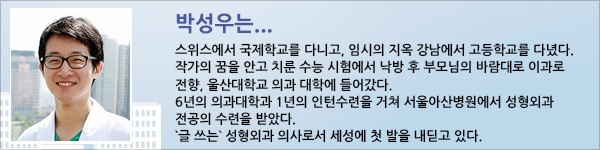
"아아! 나는 명절이 싫다."
명절이라 더욱 붐비는 응급실 한복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외쳤다. 전공의 선생님의 외침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도착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2011년 추석은 월요일이었기에 금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긴 명절이었다. 동시에 휴진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라 아픈 이들은 모두 이곳 응급실로 왔다. 더군다나 영동지방에서 큰 병원이라고는 강릉밖에 없다 보니 평상시보다 몇 배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다.
평일 24시간 동안 강릉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는 100여 명 남짓이다. 적은 날은 80명 많은 날은 120여 명 정도였다. 하루 내원 환자가 150명에 육박하는 주말은 앉아있을 시간 없이 서서 돌아다니며 10시간을 일했다.
2011년 최고 기록은 8월 주말에 기록한 260명이라고 했다. 올 추석 당일에 온 환자는 216명, 최고 기록은 경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턴들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들도 질리기에 충분한 숫자였다. 응급의학과 교수님도 새벽 2시까지 진료실을 떠나지 못했으니 응급실로 올 수 있는 환자들의 끝과 끝을 볼 수 있는 날이었다.
소아과 선생님께 노티하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소아과 환자들이 많았다. 가을 환절기였기 때문에 목이 붓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응급실에 왔다. 설사하고 배 아픈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내원했다. 나중에는 소아과 선생님이 노티하지 말라고, 오면 직접 보겠다고 하시고는 응급실 한구석을 차지했다.
추석 연휴에 고향으로 돌아온 어른들은 기름진 음식과 회를 거하게 드셨는지 배탈이 나서 속이 울렁거린다고 식은땀을 흘리며 찾아왔다. 술에 취해서는 싸움이 나거나 넘어져서 얼굴이나 손, 발 등이 찢어진 채 찾아오는 환자들은 여전히 인사불성인 채로 응급실 침대에서 자기도 했다.
의료진이 제일 싫어하는 진상 환자들이다. 뉴스나 신문에서만 명절 증후군을 듣는 것이 아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 준비하느라 힘들었는지 머리가 아프다고 온 어머니들도 여럿 있었는데 명절의 위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중한 환자들, 응급 상황은 연휴라고 쉬는 것이 아니다. 추석 당일에도 한켠에서는 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을 하고 심장마사지를 했다.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들도 응급실에서 추석을 보냈다.
추석 연휴 전, 낮 근무에서 밤 근무로 옮겨왔다. 저녁 7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근무였다. 덕분에 추석 연휴 내내 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밤에는 보통 낮에 비해 환자들이 오지 않는 편인데도 새벽 3시까지 응급실이 정리되지 않았다. 관찰 병실까지 환자들이 누워있었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한산해졌다. 하지만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새벽 6시만 되어도 밤새 통증을 참다 온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았다.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
5개월 된 어린 아기가 포도를 먹다가 기도에 걸려 급박하게 응급실로 들어왔다. 응급의학과와 소아과 선생님이 10시간 넘게 온갖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나지 못했다. 추석에 어린 자식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찌하랴.
정신없이 지새운 밤이 네 차례. 일하다 시계를 보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아침 8시에 퇴근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면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고 시체마냥 자다 일어나면 다시 출근할 시간이 되었다. 열심히 일한 방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어느덧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이르렀고 의료진 모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운 마지막 날은 모두 함께 바다를 보러 나갔다. 강릉이 좋은 것은 퇴근 후에도 동해 바다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포대 주변에는 카페들이 꽤 있는데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해변가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들고 해변에 앉았다.
불과 10시간 전만 해도 피를 토한 환자의 위세척을 하고 심정지가 온 환자의 심장을 열심히 마사지하고 있었는데, 가을 아침 해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으려니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대로 모래사장에 누워 잠을 자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또한 추억이 아닐까. 정신없던 연휴 동안 환자들에게 딱 잘라 말하지는 않았는지, 환자의 불만은 집중해서 들었는지 모든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41]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