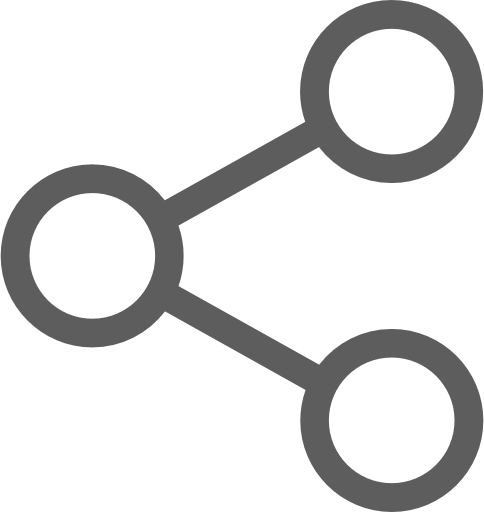메디칼타임즈, 식약청 대외비 용역 보고서 입수

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윤병우 교수(서울의대 신경과)의 ‘페닐프로판올아민 복합제 사용과 출혈성 뇌졸중 발생간 관련성 규명을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감기약에 함유된 PPA 복용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공통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윤 교수는 밝혔다.
윤 교수의 이번 모니터링 연구는 지난 2002년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전국 10개 센터, 32개 병원에서 940명의 출혈성 뇌졸중 환자와 1880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4일 이내 PPA 복용시 보정한 대응위험도가 전체 대상자 2.14(95% 신뢰구간 0.94-4.84)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1.36(95% 신뢰구간 0.45-4.15),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3.86(95% 신뢰구간 1.08-13.80)으로 나타났다.
또한 3일 이내 PPA 복용시 보정한 대응위험도는 전체 5.36(95% 신뢰구간 1.40-20.46), 남성 4.21(95% 신뢰구간 0.78-22.77), 여성 9.15(95% 신뢰구간 0.95-87.89)로 조사됐다.
출혈성 뇌졸중 종류별 위험도를 살펴봤을 때 지주막하출혈 위험도는 3.96(95% 신뢰구간 0.97), 뇌실질내출혈 위험도는 1.68(95% 신뢰구간 0.58-4.89)로 드러났다.
윤 교수는 위와 같이 도출된 위험도와 관련해 95%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는 경우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팀은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미 예일대학팀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여성에서 PPA와 출혈성 뇌졸중의 관련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남성에게서 PPA와 출혈성 뇌졸중의 관련성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PPA 함유 감기약 파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보고서는 서울대 의대 윤병우 교수가 책임연구자를 맡고 전남대 신경과 조기현 교수 등 12명의 교수들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