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성형외과의 세계…박성우의 '성형외과노트'[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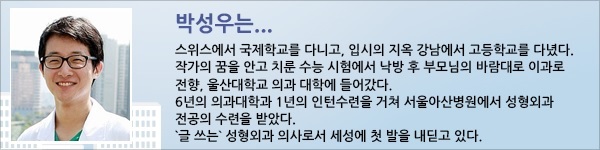
1년의 인턴 수련을 마치면 평생 전공을 택한다. 전문의가 되는 길, 그 4년의 수련 과정을 밟는 이들을 '레지던트' 혹은 '전공의'라고 부른다.
대다수의 과(2015년 기준)는 전통대로 수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올라가는 동안 각 연차마다 맡겨지는 업무와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일종의 접근 권한 가능 범위와도 같아서 연차가 올라가는 것은 신분이 상승하는 것과 같고 위계질서도 엄격하다.
물론 인턴과 레지던트 모두 수련 의사의 범주에 속한다. 인턴이 일반적인 의사 수련을 밟는다면 레지던트는 세분화된 전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과정상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소속감이다. 레지던트가 된다는 것은 곧 그 분야의 일원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 가운 앞에 소속 과가 새겨진다. '의사 ○○○'에서 '외과 ○○○' 혹은 '병리과 ○○○'처럼 말이다. 전문과는 행정상 분류한 부서 같을지 모르지만 의사 입장에서 전문과는 하나의 개별적인 학문 분야나 다름없다. 개별 학계에 학자로서 인정받는 과정의 초입에 선 것이 레지던트인 것이다.
소속감 외에 인턴과 레지던트의 차이는 스스로의 의료 행위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인턴은 교육수련부 소속의 초짜 의사나 다름없어 간단한 술기 외에는 지도 의사가 함께한다.
지도 의사는 보통 레지던트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혹여 병동에서 채혈검사를 하거나 동의서를 받는 도중, 보호자들이 "여기 좀 도와주세요!'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얼떨결에 간호사와 함께 환자에게 가지만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진다.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겁부터 나는 찰나에 레지던트가 나타나면 등장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인턴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조언이 있다.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레지던트부터 찾아라."
레지던트부터는 자신의 담당 환자와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1년차 수련은 혹독하다. 책임을 진다는 것, 특히 막 1년차 레지던트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언제 개입하고 언제 보고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레지던트라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단계마다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처치가 있고 즉시 보고해서 선배 레지던트, 종합병원에서는 교수님으로 불리는 전문의 선생님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
1년차 때 주어졌던 지령은 "모든 것을 윗연차에게 보고하라'였다. 모든 상황에 대해 본인이 판단하기 전에 선배와 상의하는 것이 조언이자 명령이었다.
성형외과 1년차는 단순 업무만 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도 월등한 수술 건수를 자랑했고 이는 업무 양과 비례했다. 6시간이 넘는 미세수술들을 포함하여 한 달 평균 300건, 일 년 평균 4,000건에 육박하는 성형수술을 4년 내내 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성취감도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건 단연 서러웠던 1년차 때다.
레지던트의 업무
처음으로 응급실에서 환자 얼굴을 봉합했을 때의 보람과 환희는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고된 몸을 뉘여 단잠에 빠질 때마다 오는 응급실 콜 때문에 1년차 때엔 응급실에서 해방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성형외과는 진료 기록 중 디지털 사진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과는 대개 진료 기록이 의사의 진찰 소견과 혈액검사, X선이나 CT, MRI 등으로 이뤄진다.
성형외과의 경우 얼굴이나 가슴, 복부 등의 외상이나 기형, 혹은 미용의 대상이 표면에 있어서 사진이 매우 중요하다.
'의학 사진 찍는 법'이 교과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더러 성형외과 레지던트로서 사진 잘 찍는 것, 그리고 사진기에 정통하는 것이 수련의 일부였다. 자칫 알아보기 힘든 사진을 찍거나 환자 사진을 누락하고 분실했을 때는 수술실이 떠나갈 정도로 혼나기도 했다.
수술 일정을 정리하는 것과 환자에게 전화하는 것도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건수술이라 해도 환자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리된 수술 스케쥴에 응급 수술이 끼어 들어오면 환자들에게 전화해서 정리해야 했는데, 그럴 땐 내가 의사인지 비서인지 헷갈리기도 했다.
길어진 수술을 끝내고 내일 수술 일정이 잡힌 환자에 게 밤 10시에 전화했다가 핀잔을 들었던 서러움은 나만의 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선생님 전화 기다리느라고 전화기 붙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라는 자상한 환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상처받은 마음이 이내 치유되기도 했다.
병원 업무가 끝나갈 듯하면 공부에 발표 준비 를 했고, 발표를 하고 나면 업무가 이어졌다. 아침 7시에 시작하는 교육 미팅 때문에 새벽 5시, 6시부터 드레싱과 회진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래서 레지던트들은 이 일상을 비시어스 사이클(vicious cycle), 즉 악순환의 연속이라 부른다.
의사들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한다. 전문의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개원가 상황도 있고 막상 일반 의사만으로는 무언가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이다.
4년이면 총 3만 5040시간이다. 그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만큼 수련 기간은 값지다.
최근에는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개별 레지던트가 수련에 자부심을 느끼고 애정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본문에 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동의를 통해 그의 저서 '성형외과 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