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Medical Mavericks 기획이사(경희의대 본과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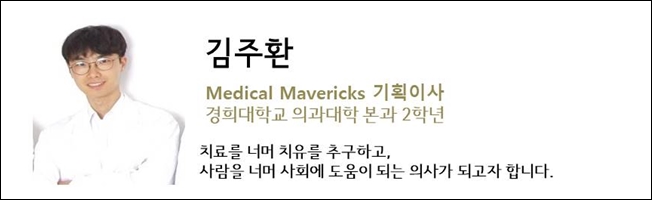
벌써 8년 전 일이다. 공학도가 꿈이라던 친구가 의대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평소보다 성적이 잘나왔다는 이유로 의대에 진학해버린 것이었다.
필자는 당시 '의사는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업' 혹은 '대의보다는 성적으로 가는 곳'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보편적일 수 있는 이러한 편견들로 필자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인생의 궁극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진학에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필자는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 나에게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가장 큰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수술인 것 같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증상으로 3시간 후 필자는 응급실에 누워있게 됐다. 그리고 담당 교수님을 만났다. "괜찮다"는 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안정됨을 느끼고 있는 환자인 '나'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교수님의 단 한 마디에 필자뿐 아니라 걱정하던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한 명의 의사가 한 사람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이 사회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의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사실이다. 의료사고의 증가로 환자가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는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는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심심찮게 올라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필자는 의료계를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일로, 일부 의사들은 수고에 비해 연봉이 적다고 하는 반면 언론에서는 의사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이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프레임 씌우기는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는 전체를 대변할 수 없으며 또 개인적인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의대 진학을 단순히 '대의보다는 성적' 혹은 '돈을 쫓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같이 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은 입체적이다. 10년 전 의료계 밖에서 필자가 생각했던 이 집단에 대한 모습과 현재 의료계 안에서 바라본 이 집단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다. 의대 진학 후 필자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언론을 통해 생긴 이미지와는 달리 병원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의료진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고마워하는 환자들을 볼 수 있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들로 보이는 의료집단 내에는 누구보다 환자를 걱정하고 쾌유를 바라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있다. 이것이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내부의 모습인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10년 전 수술을 해주셨던 교수님께 감사편지를 전해드리고 왔다. 나에게는 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하고 함께 할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한 명의 환자로서, 한 명의 의학도로서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머지않아 오리라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품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