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속 1천명까지 확산…"서둘러 대책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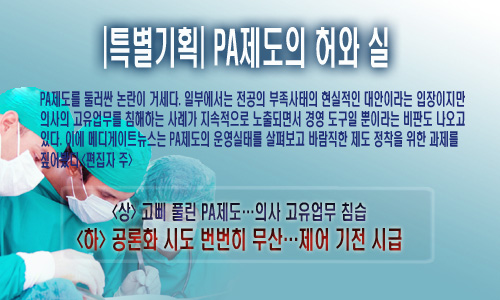
그러나 일각에서는 PA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할 경우 전문의 채용난이 가속화되는 등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공론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PA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은 역시 대한전공의협의회다.
특히 최근 일부 병원에서 PA가 전공의에게 오더를 내리는 등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공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대병원 전공의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PA가 전공의에게 오더를 내리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하루 빨리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대병원 전공의는 "우리 병원도 그렇지만 PA제도가 잘 정착된 병원도 많다"며 "공연히 공론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향후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전공의들만의 것이 아니다. 일선 학회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진료과목들은 PA제도에 찬성표를 던지는 경향이 강하다. 우선 급한 불은 꺼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최근 학회 차원에서 PA 연수교육을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전공의가 부족하니 PA라도 교육시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흉부외과학회 성시찬 교육위원장(부산의대)은 "당장 수술방에 인력이 없으니 PA를 선발해 교육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 PA에 대한 교육과정과 권한 등이 마련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역할을 명확히 명시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미 PA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공론화해 제도속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외과학회 김종석 이사장(고려의대)은 "이미 PA는 의사의 보조 인력으로 사실상 제도화 되고 있다"며 "이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섣불리 PA를 제도화 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많다. 심지어 같은 진료과목 내에서도 대립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대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사실 학회가 나서 PA제도를 공론화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이라며 "결국 후배들 앞길을 직접 나서서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국 당장 사람이 없으니 싼값에 대체 인력을 뽑겠다는 생각 아니냐"며 "PA가 제도화되면 흉부외과 의사들의 일자리가 반은 날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흉부외과 수가가 가산된 1999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전국 수련병원 중 전문의를 채용한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채용한 인원도 15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담간호사(PA)를 충원한 수련병원은 총 20곳에 달했다. 선발한 인원도 모두 39명으로 전문의 채용 숫자에 2배가 넘는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흉부외과에 PA가 늘어나면 날수록 전문의가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든다"며 "결국 일자리가 없으니 전공의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고, 그럴수록 PA는 점점 더 늘어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PA제도를 두고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PA가 전국적으로 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2010년 병원간호사회 조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의료계 내부 다툼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많은 이상 섣불리 제도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PA제도에 대한 TFT를 구성해 이를 면밀히 논의할 계획에 있다"며 "대한의학회에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해 놓은 만큼 이 결과를 보고 제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