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급 불균형 주범…"병원 중심 수급정책 버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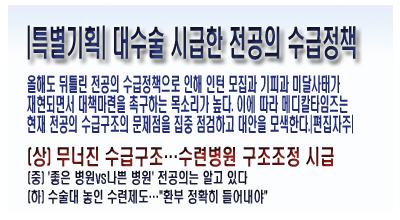
장기적인 전문의 수급 방안이 아닌 병원의 수요에 맞춘 정책으로 기형적 수련제도가 점점 더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인 것.
이로 인해 엄격한 질관리를 통해 수련병원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시합격자-인턴-레지던트 이어지는 수급 불균형 가속화
메디칼타임즈가 2012년도 인턴 모집을 마치고 전국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도 병원별로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졌다.
올해 1.2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세브란스병원을 비롯,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권 대형병원들은 무난히 정원을 채웠다.
하지만 지방 수련병원들은 경북대병원이 0.6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것은 물론, 전북대병원 등 거점 국립대병원 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다.

이러한 심각한 양극화에 대해 대다수는 예고된 재앙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시합격자와 인턴 정원간 괴리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국시합격자와 인턴 정원과 괴리는 점점 더 벌어져만 가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3887명의 새내기 의사가 배출돼 사실상 모든 수련병원들이 정원을 채웠다. 하지만 2009년에는 국시 합격자가 3510명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3224명만이 배출됐다.
반면 인턴 정원은 2010년 3853명에서 2011년 387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정책에 따라 3802명으로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시합격자와는 594명이나 차이가 난다.
사실상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어도 대규모 미달사태는 피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인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턴 정원의 증가에 맞춰 레지던트 정원까지 지속적으로 늘면서 기피과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역시 2002년 3430명에서 2005년 3471명, 2010년 4065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중심 수요 정책 한계…"퇴출 기전 마련해야"
그렇다면 왜 이같은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대다수는 병원 중심의 수급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학회 왕규창 수련이사는 "사실 지금까지 전공의 수급정책이 병원들의 수요에 맞춰 마련된 측면이 크다"며 "비교적 낮은 임금에 고급인력을 활용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만 해도 수련병원 수는 238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274개로 크게 늘었고 2010년에는 281개로 증가했다.
2011년도에는 276개로 다소 줄었지만 이 또한 4곳이 자진해서 수련병원 자격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타의가 아닌 병원의 사정에 따른 임의적인 조치였다는 뜻이다.
이처럼 수련병원과 전공의 정원이 늘어만 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번 수련병원에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각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규모 확장에 나서면서 인턴, 전공의 정원은 사실상 통제를 넘어선지 오래다.
심지어 일부 대학병원은 병원을 짓기도 전에 전공의를 배정받기도 한다. 대학병원의 명성에 기댄 사실상의 특권이다.
A병원이 대표적인 경우. 이 병원은 지난 2008년, 익년도 2월 개원에 맞춰 전공의를 배정받았다.
병원을 짓기도 전에 수련병원 자격을 획득하고 전공의를 미리 뽑아놓은 것이다. 올바른 수련보다는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B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사실 심각한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수련병원 자격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엄격한 자격을 정하고 이에 미달되는 수련병원을 과감히 퇴출키는 철저한 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물론 수련병원 자격을 회수당하는 병원도 더러 있다. 전공의 불법파견으로 물의를 빚었던 C병원이 그랬고 D병원 또한 전공의 정원이 '0'명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수련병원 퇴출이 아닌 일시적인 정원 조정에 그쳤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왕규창 수련이사는 "사실 수련병원 평가가 병원협회와 학회에 맡겨져 있는 것도 한계점"이라며 "전공의들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임채민 장관이 직접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고민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론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공의 정원은 너무나 많은 역학적 관계가 얽혀 있어 함부로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사실 수련병원 자격 기준을 높이면 해결될 일 같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 수련병원들이 무더기로 퇴출될 위험이 있다"며 "관련 단체들과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