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개업 인사는 기본, 비기도 전수…"우리가 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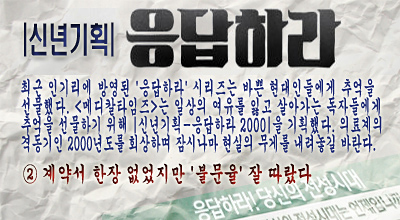
새 천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설레였다. 종말을 가져올 것만 같았던 밀레니엄 버그도 조용히 수그러들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뉴 밀레이엄이라는 새로운 흥분이었다.
삐삐 대신 핸드폰이, PC통신 대신 인터넷이 세상의 풍경을 바꾼 2000년. 의약분업의 파도도 그렇게 지나가는 홍역인줄만 알았다. 한번 거치고 나면 면역력이 강화되는.
사람들이 새 천년의 흥분감에 휩쓸리는 사이 의사들도 밀레니엄의 파도에서 휩쓸렸다. 아니, 정확히는 의약분업의 파도에 허우적 거렸다. 무언가 서서히 풍경이 바뀌었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언지는 몰랐다. 단순히 세상이 빨라지는 줄만 알았다.
그때쯤인 것 같다. 개업 인사가 사라지고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같은 과목으로 개업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문율들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마포 26년 터줏대감 나현 원장 "그땐 그랬다"
신기하다. 벌써 26년간 이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지역의 터줏대감이 됐다. 패기 어린 33살의 젊은이는 사라지고 요즘은 종종 할아버지 소리도 듣는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말, 이제 이해가 간다.
개원 당시의 설레임은 아직도 생생하다. 안과 자리를 알아보느라 고생을 했다. 누가 가르쳐 준적도 없건만, 반경 10Km 안에 동일 과목으로 개원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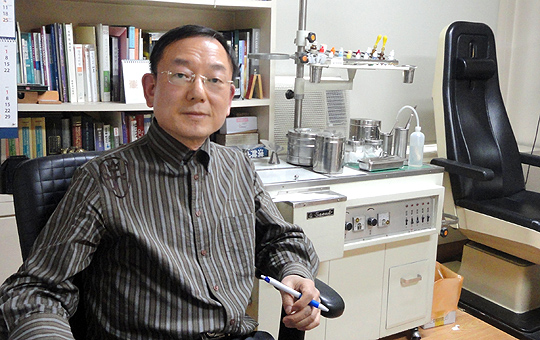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인근 선배들을 찾았다. 웬걸. 이렇게 반겨줄 수가. 대뜸 밥부터 같이 먹자는 선배부터 경영 필살비기를 슬쩍 알려주는 분까지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
52년도에 졸업한 대선배는 "이제 나와서 개원을 하면 쫄딱 망하기 십상"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곁들였다. 당시가 1987년도. 지금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랬다.
선배들은 일절 돈을 쓰지 못하게 했다. 밥을 살 때도 술을 살 때도 "네가 무슨 돈이 있냐"며 언제나 계산은 선배들의 몫이었다. 척박한 국내 의료 현실에 뛰어들어 의사의 삶을 선택한 후배들에 대한 일종의 '예우'였다.
의사와 의사간 동료 의식도 끈끈했다. 안면이 있는 인근 의사뿐 아니라 그의 가족, 지인들이 찾아와도 안부 인사가 진료비를 대신했다.
바로 옆에 개원했던 이비인후과 원장과는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냈다. 계약서 한 장 없던 당시였지만 '가든 안과'와 '가든 이비인후과'라는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랄까.
지금 돌이켜 보면 꿈만 같다. 개원을 했다고 인사를 오는 후배들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후배들이 영악해진 탓이 아니다. 오히려 열악한 저수가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선배들 책임이 크다.
의대는 늘어나고 의약분업으로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졌다. 2000년을 전후로 의사들의 전성기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
15년간 노원구 지킨 어홍선 원장 "그땐 그랬지"
어비뇨기과. 간판을 내걸고 나니 마음이 가볍다. IMF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못해낼 것이 또 뭔가. 성을 내건 의원이 하나 생겼다.
요즘은 후일담처럼 당시를 회상하는 시간이 잦다. 최근 지인들의 부부동반 모임에서도 '응답하라' 드라마가 화제에 올랐다.
고속도로 위에서 삐삐가 울리자 공중전화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일화가 이제는 우스갯 소리가 됐다. 그때는 그렇게 환자에 대한 애착이 넘치는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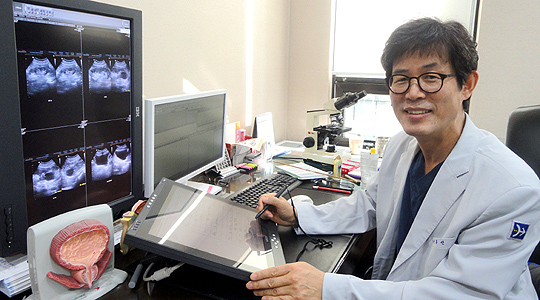
개원을 앞둔 후배들은 견습생을 자처했다. 진료실 옆에서 2~3주간 귀동냥 눈동냥을 하며 비기를 받아 적기 바빴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터득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줬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 역시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아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쓸만한 경영 아이템은 학회에서 특강을 했다.
생면부지의 인근 의사가 포경수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적도 있다. 경쟁자라고 생각했다면 당장에 내쫓았을 테지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일종의 동료 의식이다.
후배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가슴 훈훈한 이야기도 가슴 먹먹한 이야기도 있다.
자리를 못잡던 한 후배는 1년간 견습생 생활을 거치고 미국의 유명한 전립선 로봇수술의 대가의 스텝으로 '성공'해 떠나갔다. 잘된 후배를 보면 나름 흐뭇해 진다.
반면 술기를 다 배워간 한 후배가 다른 후학 양성에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씁쓸했다. 선후배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의사가 서로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요즘은 인근에 누가 개원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 의약분업 이후 간간히 명백을 유지하던 개원 인사도 6~7년 전부터는 아예 명맥이 끊겼다. 의사회에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잡은 것도 이쯤부터다.
생존 경쟁의 시대.
어쩌면 개원 인사나 동료간 친목은 사치일지 모른다. 의사들의 전성기는 언제 오는 걸까. 아니 언제였을까? 2000년을 전후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의사들의 전성기가 이따금씩 그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