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의생 수익에 목매고 논문에 몰리는 삶…정년을 꿈꾼다

수술방에 들어온지가 5분이 다 되어 가는데 펠로우가 보이지를 않는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 펠로우가 교수보다 늦게 수술방에 들어오다니.
전화받고 한다는 얘기가 더 가관이다. 수술복이 없어 가지러 갔다고? 아까 수술복 쌓여있는걸 보고 왔구만. 교수한지 10년이 넘었는데 펠로우 거짓말에 넘어갈까.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교수님 본의 아니게 늦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헐레벌떡 뛰어온 연기는 일품이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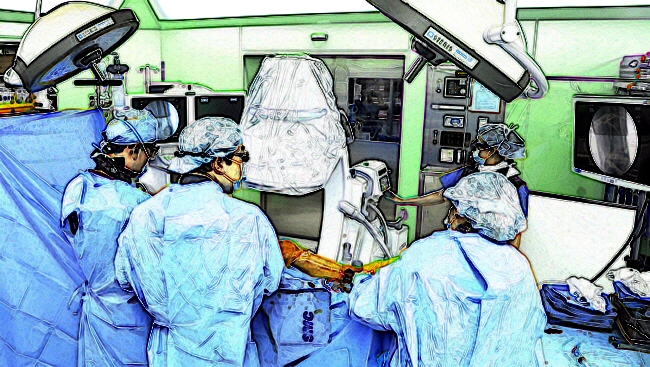
안다. 이 놈이 그래도 나한테 배운 것만 근 10년이다. 이제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성실한 놈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병원은 보는 눈이 많다. 그리고 나는 아직 부교수다.
공연히 내 라인이네 말이 돌면 이 놈한테도 좋을 것이 없다. 요즘 나도 과장 눈 밖에 나서 고생인데 썩은 동아줄 매달리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작은 잘못이라도 호되게 깨야 한다. 그래야 동정표라도 얻는다.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교수 명패만 바라보며 앞뒤 없이 뛰던 시절이. 교수만 되면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다.
동기들 모두 조교수 명패 달고 축하연을 할때 나는 펠로우를 6년이나 해야 했다. 그랬다. 나는 정치를 몰랐다.
모두가 앞다퉈 좋은 논문 거리를 교수들에게 안겨줄때도, 수술 보조를 도맡겠다 자원할때도 나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내 할일만 잘하면 되는 줄만 알았다.
"김 선생은 말이야. 늘 한결같아서 참 친해지기가 어려워."
당시 주임 교수의 말을 나는 칭찬으로 들었다. 그 말의 뜻을 나는 교수가 된 다음에야 깨달았다.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었는지.
내가 생각하는 교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최선의 치료법을 연구하고 고난이도 수술을 전파하는 의학자. 또 그 학문과 술기를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선생님.
그러나 교수 10년차에 접어드는 지금.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는지를 절실하게 알아간다. 교육? 연구? 당장 다른 교수들만큼 환자를 확보하기도 힘든 일상이다.
'띠리링' 때 마침 모니터에 메시지가 도착한다.
'김명민 교수님. 5일 오전 외래 환자 38명 진료. 초진 9명. 재진 29명. 오후 수술 3건.'

수술방에 들어가지도 않고서 집도의를 내 이름으로 올리는 것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것이 정직한 것 아니냐고 자위하기에는 요령이 없다는 자괴감이 앞선다.
그렇다고 환자들이 좋아하는 명의도 아니다. 나는 환자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다른 교수들은 싹싹하게 잘도 설명하더만 나는 단답형 대화가 전부다.
더러워서 그냥 개원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내 접는 이유다. 교수로서도 인기가 없는데 개원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나.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로 의대 오지 말고 교사를 할 것을 그랬다. 다들 공무원이 딱 적성에 맞는다고 했는데 왜 흘려들었을까.
교사보다는 교수가 낫지 않느냐는 말에 택한 진로. 하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스트레스의 연속일줄 몰랐다.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교수인줄 알았건만. 매일매일 날아오는 이 문자는 무엇이고 승진 논문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SCI에 논문만 실려도 칭찬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1년에 한편씩 논문을 쏟아내야 한다. 하나만 모자라도 승진 누락이니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김명민 선생. 1회의장으로 오세요."
올 것이 왔다. 진료과장의 호출이다. 아 그러고보니 지난 4분기 실적표가 나왔나보다. 예고도 없이 바로 오라는걸 보면 화가 많이 났나보다. 또 20분은 잡혀 있겠네.
"아 이제 다 모이신 건가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헉. 병원장이다. 센터장부터 진료과장, 교수들에 펠로우들까지 회의장을 꽉 채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센터 실적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병원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센터 이대로 운영 못합니다. 우선 개선안 마련해 보고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안 마련해주세요."

"소신과 신념도 좋지만 다들 어려울때 아니겠습니까. 힘을 모아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얼마나 죄송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원장의 시선이 나에게 꽂힌다. 왠지 나를 보며 말을 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고 다그치는 것 같다. 죄인이 된 느낌이다.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성적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교수 발령이 물 건너 가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또 동기들보다 부교수를 몇년 더 해야 하나보다.
그나마 다른 병원은 연봉 디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한다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어디인가. 그것으로나마 위안을 삼아보지만 그것도 잠시다. 지금은 교수 트랙만 올라서면 무난하게 정년을 채우던 시대가 아니다.
갑자기 만년 부장의 설움이 얼마나 큰지 아냐던 동창의 얼굴이 떠오른다. 오늘은 그 놈과 술이나 한 잔 해야겠다. 그래. 만년 부장과 만년 부교수가 한 잔 기울여 보자. 그것이 월급쟁이 인생 아니더냐.
*이 기사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을 에피소드로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병원이나 인물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