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훈 학생(울산의대 예과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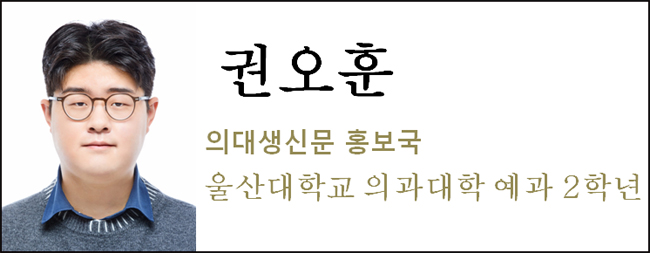
새해가 되며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참 정신이 없는 한 해였다. 이제 2학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 학기와 지난 해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 과정을 해냈나 싶은 의문이 든다. 특히 1학기 초에 과정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인문사회의학 블록의 존재를 보고 크게 놀랐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번 학년에 새로 생화학, 해부학, 약리학, 병리학 말고도 다양한 과학 과목을 들어야 해서 정신이 없는 마당에 인문사회를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는지 의문스러웠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 인문사회 때문에 기초의학 과목을 배울 시간이 짧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더 빡빡한 시간표와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은 맞았던 것 같다. 그래서 사실 학기 중에는 불만이 많았다. 기초의학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오래 배워야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임에도 그러지 못해 답답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기초의학을 익혀야 했기에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인문사회 관련 과정을 깊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당시에는 교육과정에 많은 의구심을 품었었다.
하지만 과연 의대생에게는 지식만이 중요한 것일까?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인문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과 좋은 의사가 되는 것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당시 배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지난 해에 인문사회로 배운 내용을 잠시 소개해보자면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 중 하나로 죽음학 수업을 꼽을 수 있다. 의사가 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르친다는 발상이 어찌 보면 좀 황당할 수 있겠지만 죽음학을 배우면서 나는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죽음은 더 이상 일상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은 환자들을 살리는 역할도 맡아야 하지만 환자들의 죽음을 준비해주는 역할 역시 맡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배워야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과 환자들의 상황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환자와 의사가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이라고 여러 번 배웠다. 하지만 기초의학이나 과학을 아주 잘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잘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인문사회의학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이 학교에서 부각된 것 같다. 특히나 죽음학 강의를 통해 삶의 가치를 느끼고,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말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직접 의료현장에 나서기 전에 배워 볼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컸다.
흔히 의대생의 공부량은 이미 많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수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만 해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 다른 것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의사, 나아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역시도 올해 초에만 해도 이런 과정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학기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문사회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의과대학에서 절대평가 도입 역시 이런 경험을 더 쌓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충분히 유의미하고 학생들의 인격적, 인성적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의대생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것에 그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새해를 맞아 의대생이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문학적 소양 개발에 시간을 투자해보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러운 권유를 던지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