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손상호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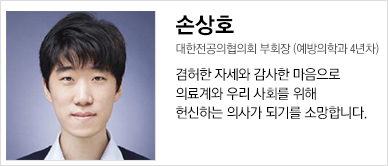
올해로 시행된지 두 번째 해에 접어든 전공의법은 일선 수련기관의 근로와 수련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전공의들은 이제 스스로의 근로환경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수련기관들은 적어도 양심의 가책정도는 느끼지 않나 싶다.
심지어 의료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전공의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
바뀔 수 없을 것 같던 근로와 수련환경의 기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많은 이들의 헌신과 과도기의 혼란을 묵묵히 인내해준 선배 전공의들의 희생 덕분이리라.
그럼에도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는 전공의법은 고사하고 2019년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심심찮다.
이러한 회원들을 위해 대전협은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전공의 교육수련에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하시도록 안내하곤 하는데, 문제는 수평위가 익명이나 당사자 본인 이외의 대리 민원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감정적 대응이나 찔러나 보자는 식의 음해성 민원이 난무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에 공감하지만, 잃을 것이 많은 전공의에게 실명접수는 민원창구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대전협이 민원인에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은 전공의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는 언론인들의 협조를 받아 '크게 터트리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런 접근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지만 장담컨대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언론화의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해본 전공의들은 12명의 위원 가운데 전공의가 고작 2명뿐인 수평위의 사실상 답이 정해진 논의 과정에 점점 더 회의적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수평위와 동질체인 병원협회나 수련병원협의회 등을 대표하는 교수위원들 역시 대전협을 소위 노조보다 더 독한 녀석들로 여긴다.
서로를 믿지 못하다 보니 대화와 타협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로 법조문만 내세우는 안타까운 광경이 연출된다.
법은 만능이 아니다. 처음 이 법을 제정하는 데 깊게 관여한 이들이나 수년간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일선 현장에서는 나름의 아쉬움이나 불만이 있겠지만 이를 이유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결국에는 당사자 모두의 손발이 묶여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맹목적인 구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법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최소한의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면 족하며 전공의법은 적어도 '근로'의 관점에서는 당해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본다.
이제는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전공의법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때이다. 전공의들의 근로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이들이 교육생으로서 충분한 배움 가운데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교육수련병원으로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가 진료과정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만, 수련기관이나 주관부처 누구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의사가 아닌게 들통날까봐 명찰을 가려야 하는 의대·의전원 실습학생, 남학생은 내보내라는 환자들의 요구, 분만개조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한 인턴, 몇 년차에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워야하는지 모르는 레지던트는 우리 의학교육의 현 주소이다.
엄밀히 말해 혹독한 근로환경은 개인이 몇 년 참으면 끝날 일이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는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우리가 교육에 무지한 동안 의학 선진국은 아카데믹메디슨(academic medicine)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교육수련환경을 조성하고 의학의 저변을 넓히며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조금 더 욕심을 내어본다면, 이번에는 서로가 법조문을 들이밀고 기자를 찾아다니며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이 공동선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다짐에서의 출발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