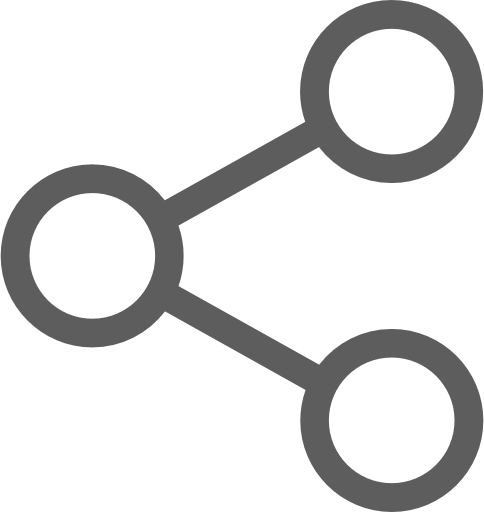KDDW 2024에서 새 용어 적용 국내 코호트 결과 공개
MASLD·MetALD·ALD 하위 분류별 암종 위험 변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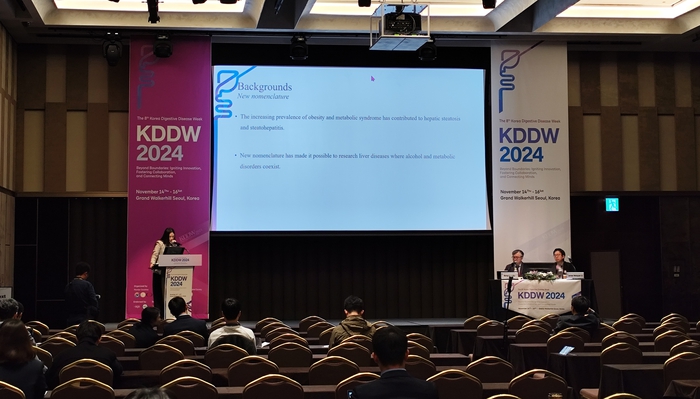
국제적으로 간 질환의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가 세분/구체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새 기준에 맞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각종 연구에서 간 질환 하위 분류형에 따른 예후 위험도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이같은 새 명명법에 따른 연구가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8개 소화기 연관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KDDW 2024가 그랜드워커힐 호텔에게 개최됐다.
간 조직 검사를 통해 알콜 섭취 없이도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환자들을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으로 명명하면서 NAFLD 및 비알콜 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은 간장학 분야에서 40년 넘게 통용돼 왔다.
문제는 음주량을 기준으로 한 질병명이 오히려 질환에 대한 이해를 저해하고, 대사기능 장애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
지난 6월 대한간학회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반영, '비알콜성 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용어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etabolic dysftunc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MASLD)로, 지방간질환의 하위 분류인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도 대사이상관련간염(MASH)으로 대체키로 했다.
해외에서 이런 흐름은 더 앞서 나타났다.
대사적 요인과 알코올 소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간 질환의 특성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대사알코올성 지방간질환(Metabolic-Alcoholic Liver Disease, MetALD) 용어가 2020년대 초반부터 언급되기 시작해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연구들이 대거 등장했다.
대사 기능 장애 관련 지방간 질환과 식도, 위암 사이의 연관성 코호트를 발표한 노희윤 동아대병원 교수는 "비만과 대사 증후군이 증가하는 것은 간 지방변성과 지방간염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새로운 명명법 덕분에 알코올과 대사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간 질환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 건강보험 데이터인 NHIS-HealS 및 NHSP를 기반으로 지방간질환이 없는 사람들 대비 MASLD와 MetALD, ALD(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들의 식도암, 위암 발병 위험도의 변화를 살피는 것으로 연구를 기획했다.
24만 4415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분석 결과 MASLD 환자의 위암 위험도는 9% 상승(aHR 1.09)했고, MetALD는 31% 상승(1.31), ALD는 40% 상승(1.40)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도암은 오히려 MASLD 환자에서 19% 위험도가 하락(0.81)한 반면 MetALD에선 68% 상승, ALD에선 218% 상승해 알코올 섭취와 암 발병과의 강력한 연관성을 시사했다.
노 교수는 "암 발병 위험성에 BMI나 허리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수치도 영향을 미쳤다"며 "분석 결과 식도암과 ALD는 큰 상관성이 나타났고, MASLD, MetALD, ALD는 상승된 위암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승균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지방간질환과 위장관 악성 종양의 위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 교수는 "최근 지방성 간질환(SLD)의 하위 분류가 NAFLD에서 MASLD로 업데이트가 됐다"며 "이에 MASLD, MetALD와 같은 질환과 위장관암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 217만 5385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방간질환이 없는 사람 대비 간 질환 하위 분류별 위장관암 위험도의 변화가 관찰됐다.
임 교수는 "분석 결과 간질환 하위 분류에 따라 암 발현 위험이 달라졌다"며 "식도암은 ALD 환자에서 229%, MetALD에서 178% 상승했지만 특이하게 MASLD에서만 위험이 12%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음주자 대비 음주량이 많아질수록 위장관암 위험도가 비례해 상승했다"며 "식도암은 과음자에서 359%, 알코홀릭에서 703% 상승하고, 위암은 20%, 37%, 대장암은 43%, 5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음주자 또는 가벼운 음주자의 경우 간 지방증 가능성이 위장관암 위험의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며 "MASLD에 의한 식도암 위험 감소와 FLI 점수(간 지방증 가능성)와 식도암 위험의 역상관관계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새로운 용어를 활용한 '한국의 지방간 질환 하위 유형과 대장암 위험과의 연관성: 전국적인 인구 기반 연구', '한국 성인의 당뇨병 및 위장암 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영양조사 통합 데이터 결과' 등이 발표됐다.